-

-
이방인 (양장) - 개정판 ㅣ 새움 세계문학
알베르 카뮈 지음, 이정서 옮김 / 새움 / 2020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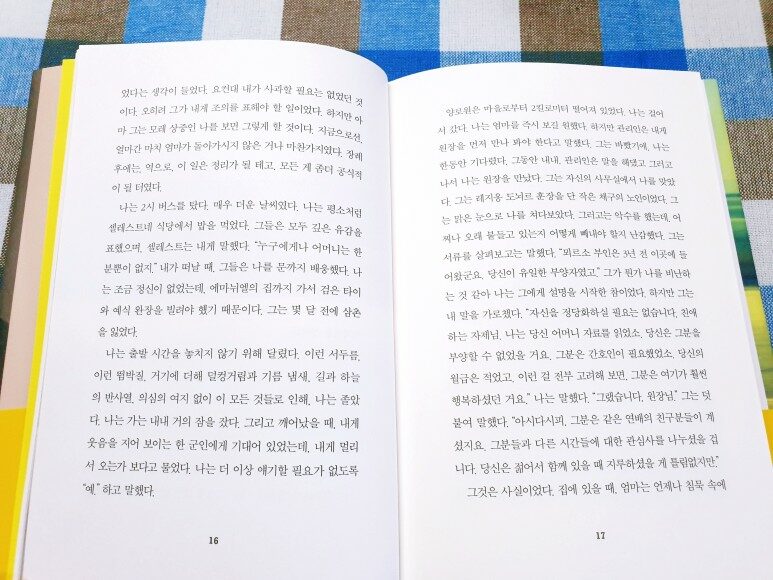


번역은 정말 묘한 것이다. 다시 재번역을 하면서 이전 번역을 보고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이게 그때는 이렇게 보였던가 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그게 곧 번역일 테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번역애 대해 왈가불가한다는 것조차 대단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니 그래서 더욱, 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일 테다. (p.8)
시빨간 폭발은 그대로였다. 모래 위로, 바다는 아주 빠르게 부딪치며 헐떡였고 잔파도들이 숨 가쁘게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바위를 향해 걸었는데 햇빛에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열기 전체가 나를 짓누르며 내 걸음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얼굴을 때리는 뜨거운 숨결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지 주머니 속에 주먹을 움켜쥐며, 태양과 태양이 쏟아붓는 그 영문 모를 취기를 이겨 내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흰조개껍데기나 깨진 유리 조각, 모래에서 발하는 모든 빛의 칼날로 내 뺨은 긴장했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p.84)
소설은 사물에 대한 표현 하나로도 읽는 맛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것이 문학의 힘이고 문장의 힘이다. 그저 단순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굳이 작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p.175)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대부분 읽어 봤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오늘은 책의 번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14년 번역 논쟁과 함께 출간되었던 이정서 번역의 <이방인>이 2020년 새롭게 다시 출간되었다.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린 소설. 1957년 저자인 알베르 카뮈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긴 소설 <이방인>. 당시 이 원고를 검열했던 수석고문은 이렇게 말을 전한다. “그날 오후 원고를 받은 즉시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 손에서 뗄 수 없었다. 문학에 일대 진보를 가져올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재미있다.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힐 만큼 하지만 뭐랄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쉽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번역, 번역 때문이다. 하나의 문장을 두고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뜻은 천차만별. 그렇기에 번역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번역은 자기와 끝없이 싸움"이라는 이정서. 직역이냐, 의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