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세 번 죽었습니다 - 8세, 18세, 22세에 찾아온 암과의 동거
손혜진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0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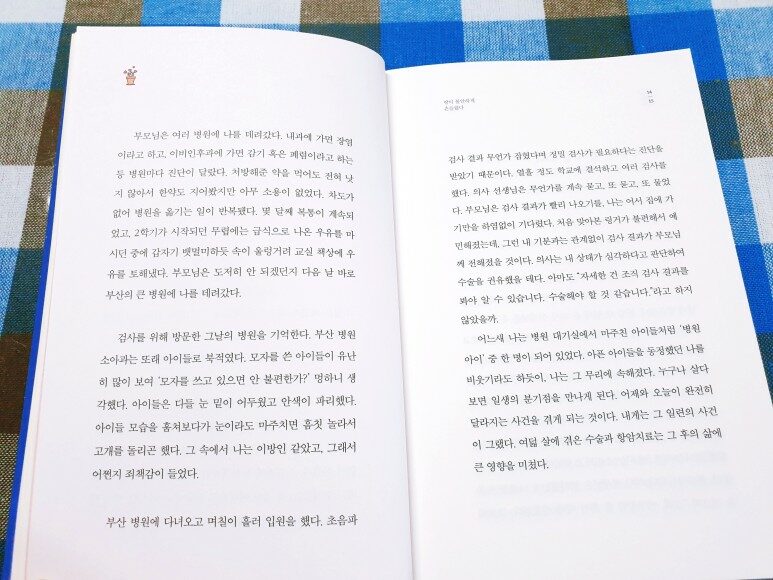


어느새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아이들처럼 ‘병원 아이’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아픈 아이들을 동정했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는 그 무리에 속해졌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일생의 분기점을 만나게 된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내게는 그 일련의 사건이 그랬다. 여덟 살에 겪은 수술과 항암치료는 그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p.15)
며칠이 흐른 후 내가 진짜 평범한 아이로 돌아왔음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한동안 부모님처럼 나도 날마다 기분이 좋았다.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말하고 싶었다. “나 이제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대요!” 실제로는 친한 친구들에게만 말했다. “나 이제 병원 안 가. 다 나았대.”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인식하게 됐다. 나는 아픈 아이는 평생 병원에 다니는 줄 알았다. 아니면 죽어서 더 갈 수 없게 되거나. 그래서 병원 방문이 끝나는 때는 죽음이 닥쳐왔을 때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안 갈 수 있다니! 안 가도 되는 거였다니! 감기처럼 ‘병’이란 게 낫는 거였다니! (p.87)
죽음을 각오했기에 수술대에 오르는 날에도 평온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다들 무너질까 두려웠고, 내 입으로 ‘죽음’이란 단어를 뱉으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동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만 한 결심, 혼자서만 해본 조심스러운 이별이었다. (p.109)
세 번의 암, 세 번의 수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스물여섯 해의 기록 <나는 세 번 죽었습니다>. 저자의 투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개월 동안 계속된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후 '축구공만 한' 혹이 있어 떼어내야 한다는 진단을 듣는다. 소아암, 병명은 신경아세포종이었다. 수년간의 항암치료 후 뒤늦게 학교에 적응할 무렵, 이번에는 희귀암인 GIST가 찾아온다. 한창 취업 준비에 여념 없던 스물두 살, 희귀암이 재발하면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나는 암 환자, 그러나 나 역시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8세, 18세, 22세에 찾아온 암과의 동거. 그리고 시작하는 네 번째 삶. 평범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다. 일생에서 암과 싸운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았으니까. 가끔은 남은 날들이 아주 먼 미래까지 이어질 것 같고, 또 가끔은 몇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혼란 속에서 지내왔다. 그래도 오늘 살아 참 다행이라고, 사는 동안 불행한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오늘도 있는 힘껏 웃는다. 만약에 나라면, 아니 내가 아닌 그 누구라도 그 삶을 온전히 버텨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저자는 병이야말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며 자신의 삶에 감사해한다. 그러면서 두렵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에게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 놓으며 위로의 손길을 건넨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찾아오는 법, 위기를 모면할 길은 반드시 있다. 살아보자, 지금 살아있기에 행복한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