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눈 깜짝할 사이 서른셋
하유지 지음 / 다산책방 / 2019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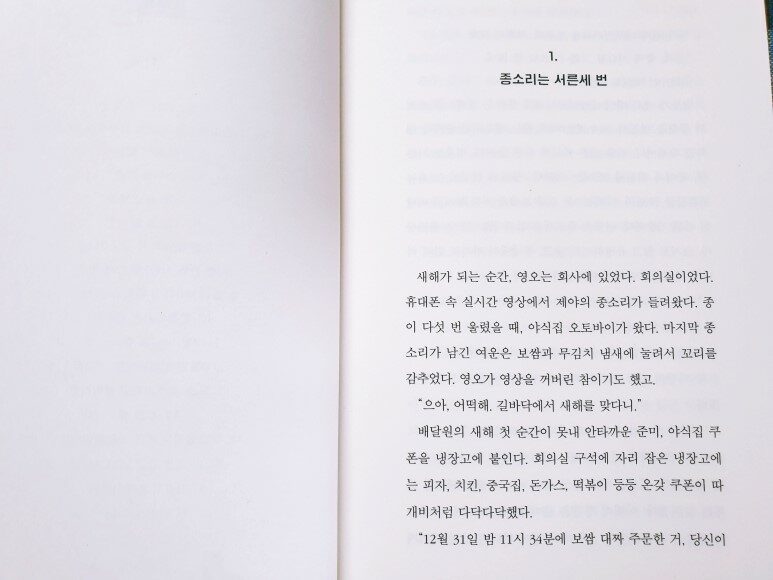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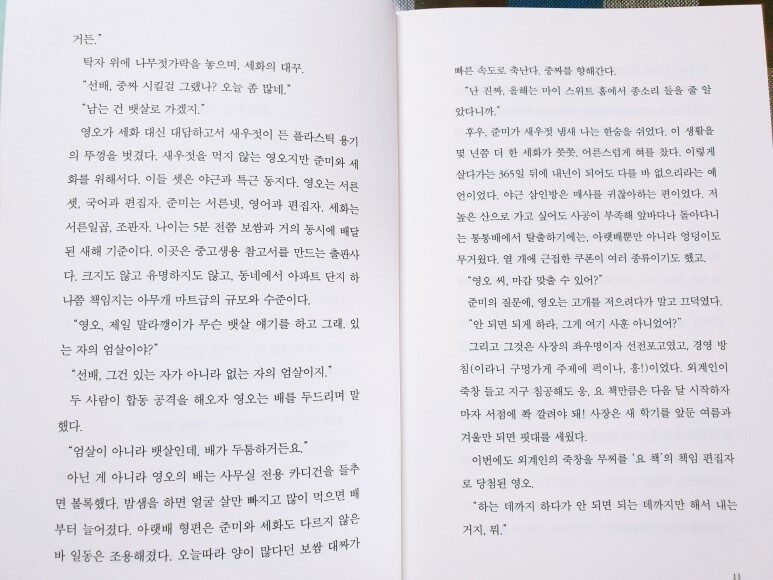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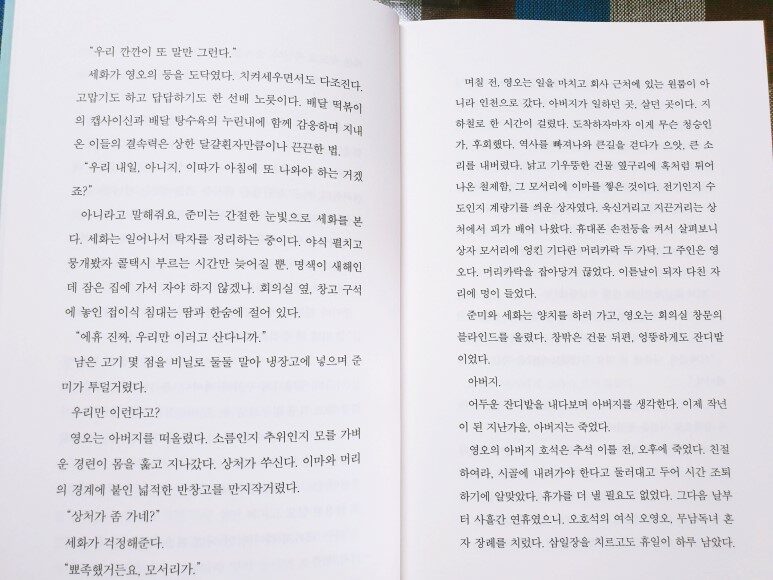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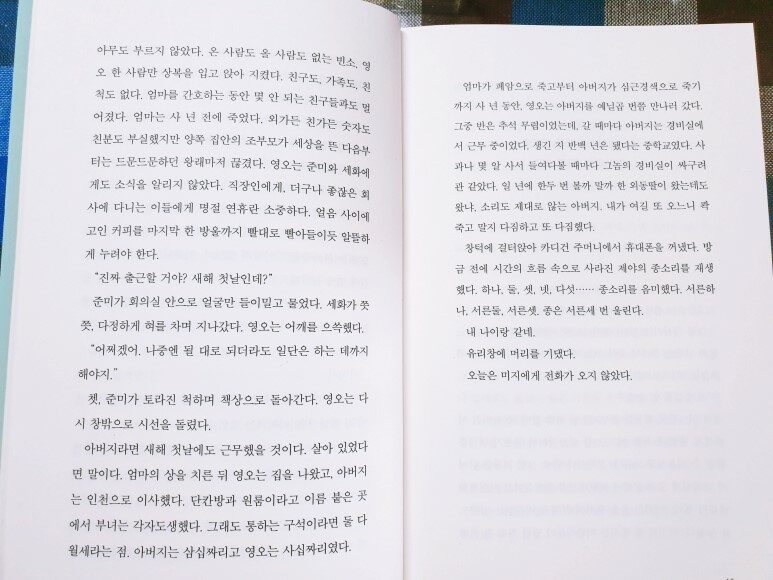
엄마가 폐암으로 죽고부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죽기까지 사 년 동안, 영오는 아버지를 예닐곱 번쯤 만나러 갔다. 그중 반은 추석 무렵이었는데, 갈 때마다 아버지는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생긴 지 반백 년은 됐다는 중학교였다. 사과나 몇 알 사서 들여다볼 때마다 그놈의 경비실이 싸구려관 같았다.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외동딸이 왔는데도 왔냐, 소리도 제대로 않는 아버지. 내가 여길 또 오느니 콱 죽고 말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창턱에 걸터앉아 카디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 전에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진 제야의 종소리를 재생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소리를 음미했다.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종은 서른세 번 울린다.
내 나이랑 같네.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다.
오늘은 미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 (p.15)
미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구긴 종이가 되고 흔들리는 땅이 되었다. 손이 떨린다. 이 거품으로 머릿속을 씻을 수 있다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진다. 미지는 세제 거품이 이는 분홍색 수세미를 손에 꼭 쥔 채 가만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이 떠오르려 했다······ 그 얼굴이······. 머리를 저었다. 다른 생각을 하자, 다른 생각을 하자, 다른 생각을 하자. 주문처럼 되뇌자 오샘이 떠올랐다. 아, 오쌤!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전화 걸기에는 늦었다. 물론 8시에도, 9시에도 오쌤은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지는 고달픈 직장인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았다. 오쌤을 생각하니 기분이 나아졌다. 수세미를 물에 헹궜다. 대답을 기다리던 아빠는 화장실로 돌아간 다음이다. 오쌤과는 만난 적이 없다. 서로 얼굴은 모르고 목소리만 안다. 오쌤의 이름은 오영오, 직급은 대리. 국어 문제집을 만든다. (p.23)
오영오. 난 너라는 문제집을 서른세 해째 풀고 있어. 넌 정말 개떡 같은 책이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 삶의 길목마다, 일상의 고비마다, 지뢰처럼 포진한 질문이 당장 답하라며 날 다그쳐. 엄마가 아플 때, 넌 나에게 물었어.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엄마를 언제쯤 포기해야 할까? 그 시절 어떤 남자가 다가왔을 때, 넌 나에게 물었어. 지금 나에게 연애란 비싸기만 한 케이크처럼 불필요하다고 어떻게 설명하지? 엄마가 떠났을 때, 넌 나에게 물었어. 이제 엄마가 돌아올 리 없는 집에서 나가고 싶겠지. 그럼 아버지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될 텐데 상관없니? 아버지의 생일이 왔을 때, 넌 나에게 물었어. 영혼 없는 문자라도 보낼래, 아니면 가식은 집어치울래? 나는 더듬더듬 답하지. 내가 진땀을 흘리며 내놓은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넌 알려주지 않아.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만 변명하지. 그래, 너는 출제자가 아니야. 답도 없는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문제집일 뿐이야. 이해한다. 너도 오영오, 나도 오영오, 우리는 오영오니까. (p.40)
“시간이 많을 거 같지? 안 많더라.”
영오의 손가락이 이마 귀퉁이에서 서성거렸다.
옥봉은 만년필로 눌러가며 디귿을 거쳐 리을로 나아갔다. 저렇게 힘을 주면 촉이 망가지겠지만 영오는 말리지 않았다. 망가지도록 마음껏 쓰시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쓰다가는 촉이 무뎌지기도 전에 다들 숨이 넘어갈 것이다. 인생은 시간 그 자체이자 시간을 태우며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불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금속 촉마저.
“상처 없는 사람 없어. 여기 다치고, 저기 파이고, 죽을 때까지 죄다 흉터야. 같은 데 다쳤다고 한 곡절에 한마음이냐, 그건 또 아닌지만서도 같은 자리 아파본 사람끼리는 아 하면 아 하지 어 하진 않아.” (p.170)
영오는 수첩을 들어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본다.
영오에게
홍강주
문옥봉
명보라
공미지
몇 달 동안 영오의 인생에 새겨진 이 이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할까. 홍강주부터 명보라까지? 아니면 영오부터 공미지까지? 이 다섯 사람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동그라미. 이들은 점으로 시작해 선으로 이어졌다. 점은 선이 된다. 선은 점을 포함한다. (p.302)
참고서 편집자 영오는 새해가 되는 순간까지 야근한다. 어머니가 사 년 전 폐암으로 죽은 뒤로 예닐곱 번쯤 만난 아버지마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월세 보증금과 밥솥 하나. 그 안에 담긴 수첩이 전부다. 수첩에는 앞뒤 맥락도 없이 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다. ‘홍강주’ ‘문옥봉’ ‘명보라’. 영오는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학교의 교사인 홍강주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나머지 두 명을 찾아 나선다.
미지는 영오가 편집한 ‘튼튼국어’를 풀다가 문제가 재밌다는 이유로 매일 전화를 거는 열일곱 소녀다. 홍강주가 교사로 일하는, 영오의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던 새별중학교 학생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다. 치킨 가게를 열어 큰 성공을 거둔 미지의 엄마 신 여사는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는 미지와 12월 31일 회사에서 기막히게 잘린 미지의 아빠를 귀양 보내듯 예전에 살던 집, 개나리아파트로 쫓아냈다. 치킨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세 식구가 충분히 먹고살지만 백수 남편이든 백수 딸이든 안 된단다.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그게 백수지 뭐냐면서.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정신을 차리든가 속을 차리든가 뭐라도 하란다. 그렇게 해서 아빠와 딸은 쫓겨났다. 새 집에서 헌 집으로. 그들의 옆집에는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두출이 산다. 미지는 발코니 칸막이 벽을 사이에 두고 옆집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버찌’라는 고양이를 통해 그 할어버지와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아간다.
제 모습의 절반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나머지 절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200그램쯤의 무게만 겨우 버티는 조금만 플라스틱 고리” 같고 “사는 게 너무 바빠, 숨과 숨 사이가 서울과 부산 사이보다 먼” 서른세 살 여성 오영오의 고단한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법 웃기게 생기고 의외로 괜찮은 커다란 금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죽은 아버지가 남긴 이름들을 찾아 나서기로 한 영오와 그런 그녀의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절반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을까. 책은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나머지 절반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서른세 살과 열일곱 살, 사는 게 나름 심상치가 않을 나이. 서른세 살 영오와 열일곱 살 미지가 사는 모습 또한 그리 녹록하지는 않다. 어딘가 절반쯤 비어 있는 것 같은 삶. 그런데 돌이켜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멀리 와 있고, 돌아갈 수는 없다. 영오와 미지, 세상과의 관계가 서툴렀던 두 사람은 어김없이 관계가 서투른 사람들을 만나며 어쩔 수 없이 세상 밖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감동.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삶에 한방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더 큰 한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