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매일 좋은 날
모리시타 노리코 지음, 이유라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9년 1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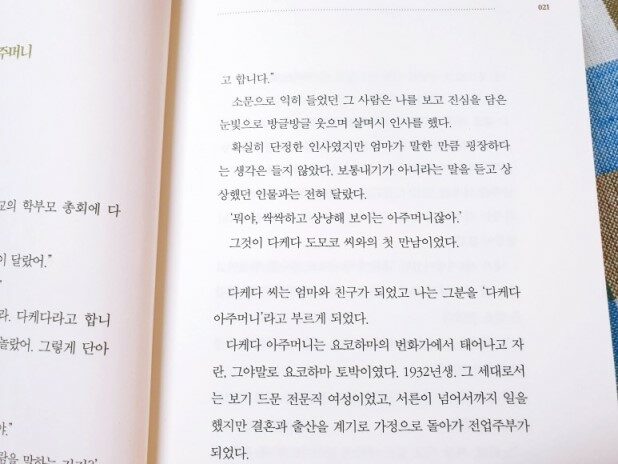



다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배우는 거야.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상태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진 채 이 자리에 있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이 정도쯤이야’, ‘난 잘할 수 있어’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였는지. 시시한 자존심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지나지 않는다. 짐을 버리고 텅 빈 상태가 되어야 했다.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p.54)
‘역시 오길 잘했어.’ 다도 수업에 가면 꼭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데마에를 반복하면서 화과자를 먹고, 도구를 만지고, 꽃을 바라보고, 족자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물을 느꼈다. 지금이라는 계절을 시각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오감 전부를 통해 맛보고 상상으로 체험했다. 매주, 그저 한결같이. 이윽고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p.142)
다실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린다. 그 주기가 호흡하듯 되풀이된다. 세상은 밝고 긍정적인 것만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애초에 반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밝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빛과 어둠이 모두 존재할 때 비로소 ‘깊이’가 태어난다.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저마다 좋은 것이다. 인간에게는 그 양쪽이 모두 필요한 법이다. (p.236)
10년, 15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대답은 자연히 찾아왔다. 다도란 계절의 순환 주기에 따른 삶의 미학과 철학을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며 깨닫는 일이었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은 나의 피와 살이 된다. 만약 선생님이 처음부터 전부 설명해 주었다면, 기나긴 과정 끝에 마침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여백’을 남겨 주었던 것이다. (p.265)
세상에는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바로 알 수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바로 알 수 없는 것은
몇 번을 오간 뒤에야 서서히 이해하게 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간다. 그리고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자에게 ‘차’라는 건 바로 그런 존재다. 처음 차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하나 짚이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그것이 단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를 잃었을 때, 차는 가르쳐 준다. “긴 안목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라.” 솔직히
처음엔 어려웠다. 다도를 배우는데 있어서 생소한 단어와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 차에 조금씩 천천히 녹아들기 시작했다. 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케다 아주머니에게는 특별함이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단정한 몸가짐이나 쉽게 동요하지 않는 인품이 바로 그것이었다.
저자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과 다름없는 다케다 아주머니를 알게 된 건 열네 살 때였다. 학부모 총회에서 그녀를 처음 본 엄마에게서 보통내기라 아니라는 말을 듣고
무서운 사람을 상상했었는데 실제 저자의 눈에 비친 그녀는 싹싹하고 상냥해 보이는 아주머니에 불과했다. 그것이 다케다 도모코 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다도를 배워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해왔다. 다도라니? 저자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다도를
배우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다도 같은 건 딴 세상 이야기였으니까. 그런 그녀가 엄마의 권유로 사촌인 미치코와 함께 다인
다케다 아주머니에게 다도를 배워 보기로 한다. 스무 살의 봄이었다. 그저 차를 타서 마시면 될 것을, 다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동작과
엄격한 규칙들로 가득하다. 다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왼발부터, 문지방과 다다미 가장자리 선은 절대 밟지 않을 것, 다다미 한 장은 여섯
걸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물음에는 의미 같은 건 몰라도 되니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한다. 취업도 연애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남들과 달리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아 불안한 그녀에게 다도는 그저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차’는 그녀에게 조금씩 깨달음의 순간을 선물하기
시작한다. 물을 끓이고, 다완을 준비하고, 선명한 암녹색 가루에 물을 더해 잘 젓는다. 차를 만드는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진공 같은 상태가 찾아온다. 수 초간의 침묵.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은 모두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노리코를 다실로 발걸음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앙증맞은 화과자와 맛있는 차가 전부가 아니다. 모든 계절을, 모든 날을,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다도의 방식에 눈을 뜬 것이다. 결국 노리코가 스승인 다케다에게 배운 것은 차만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균형이었다.
다도는 마치 인생과 같다. 정답이 있는 문제처럼 모든 걸 공부해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다. 그저 익숙해지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