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가 함께 듣던 밤 - 너의 이야기에 기대어 잠들다
허윤희 지음 / 놀 / 2018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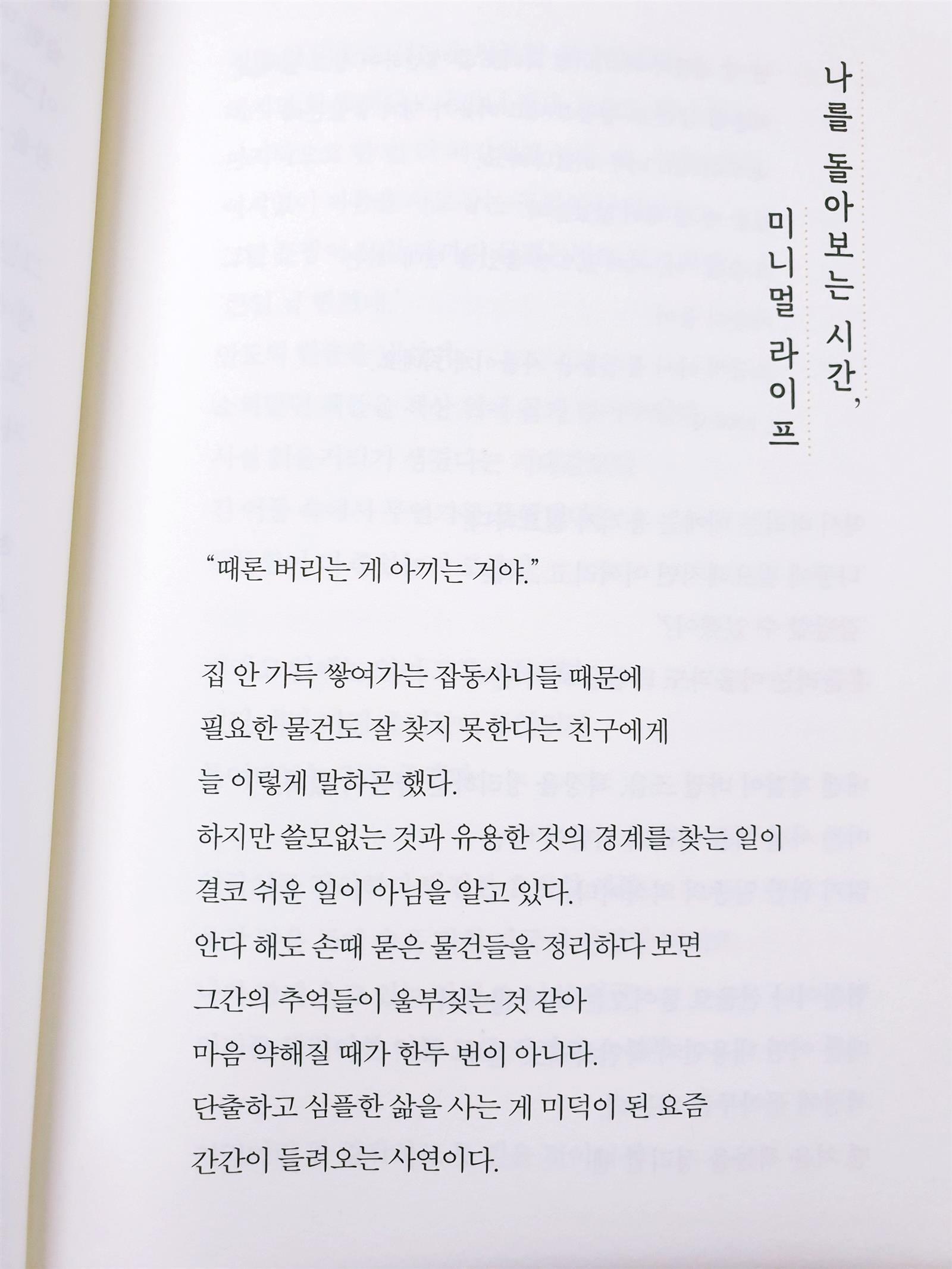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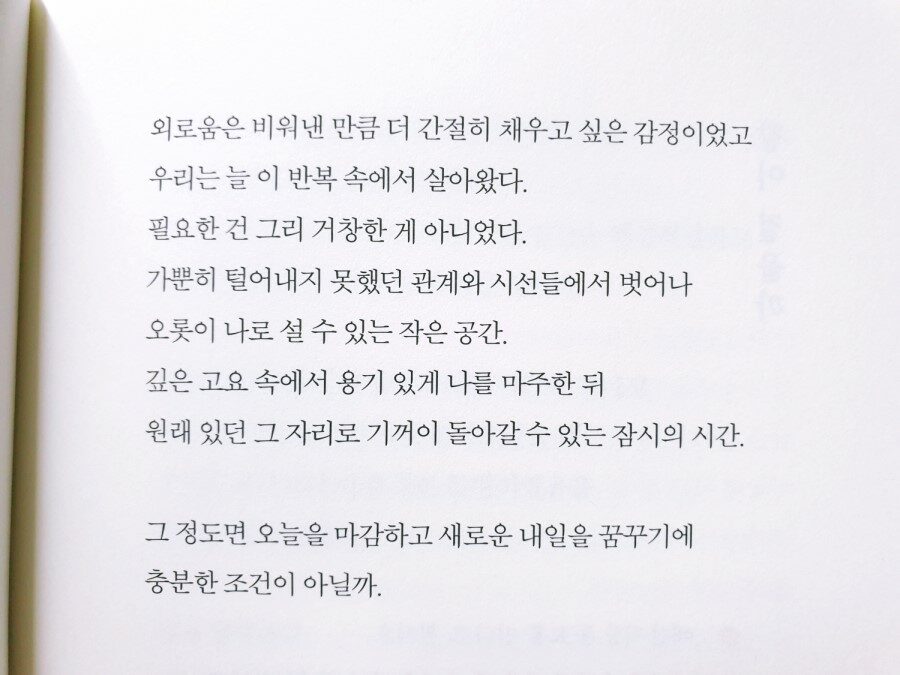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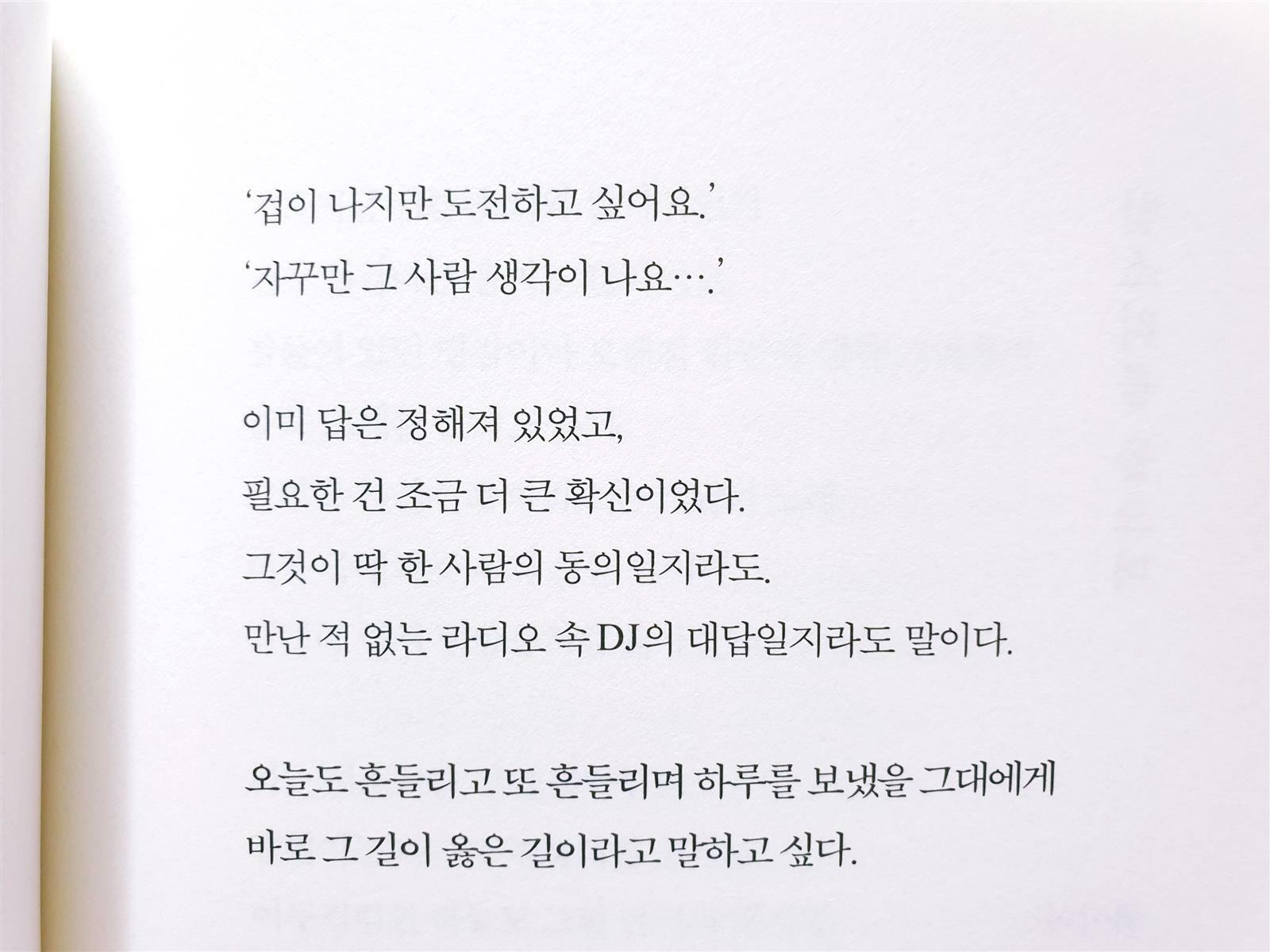
“이건 윤희 씨한테만 얘기할게요.”
정말 나만 알고 있어야 하나··· 왜 굳이 나에게···.
익명으로라도 소개를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일기장이 아닌 라디오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알리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히 털어내고 싶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올 이들. 그들이 조금씩 파놓은 이 깊고도 얕은 구덩이에 시름 하나, 한숨 한 모금씩 던져 넣고 잠들 수 있길 바라본다. 이제는 당신만의 짐이 아니니 걱정말고 편히 쉬기를. (p.20)
밤새 기막힌 여행을 하고도
눈을 뜨는 순간 날아가버리는
꿈의 조각들을 붙잡아두고 싶다.
언젠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지겨워질 때,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그 한 조각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지 못해 괴로운 어느 밤에 머리맡에 두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p.69)
외로움은 비워낸 만큼 더 간절히 채우고 싶은 감정이었고
우리는 늘 이 반복 속에서 살아왔다.
필요한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가뿐히 털어내지 못했던 관계와 시선들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설 수 있는 작은 공간.
깊은 고요 속에서 용기 있게 나를 마주한 뒤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잠시의 시간.
그정도면 오늘을 마감하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까. (p.93)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보폭으로 걷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드디어 도착한 긴 터널의 끝에서
웃으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면 된다.
그로 인해
그가 건넨 작은 위로로
우린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다. (p.98)
힘내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내 하루의 수고를
이해해주고
흐르는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는 사람이면 되었다.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겨있는 온기는
금세 깊숙하게
스며들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내리게 했다.
그건 내 존재를, 내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며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p.178)
매일 밤 10시, 열두 해 동안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꿈과 음악 사이에> 허윤희의 첫 번째 에세이 <우리가 함께 듣던 밤>. 책을 펼치자 눈앞으로 갖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쏟아져 내린다. 직접 사연을 고르고, 대본을 만지고, 음악도 선곡하며, 그렇게 매일 찾아오는 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대로 책 속으로 옮겨다 놓았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고민이나 걱정 거리에 조언을 하기보다는 힘겹게 하루를 보낸 그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응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여기 든든한 당신 편이 있어요.’라며 속삭이는 듯한 그녀의 이야기에 추웠던 마음에 이내 따스한 온기가 맴돈다.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책은 이야깃거리가 제법 풍성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사연에 재미있어 웃기도 하고 같은 고민을 나누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연에 함께 공감하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든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기에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진다.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따뜻함으로 물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