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도 일기 (리커버 에디션)
롤랑 바르트 지음, 김진영 옮김 / 걷는나무 / 2018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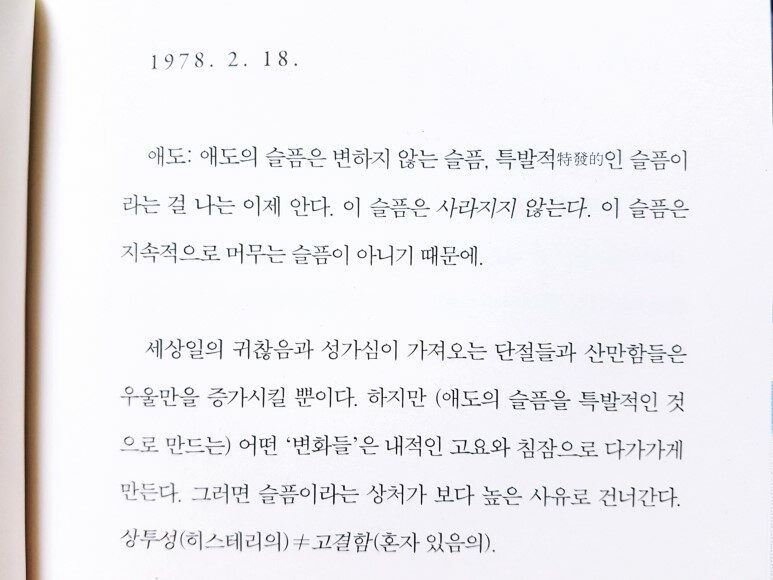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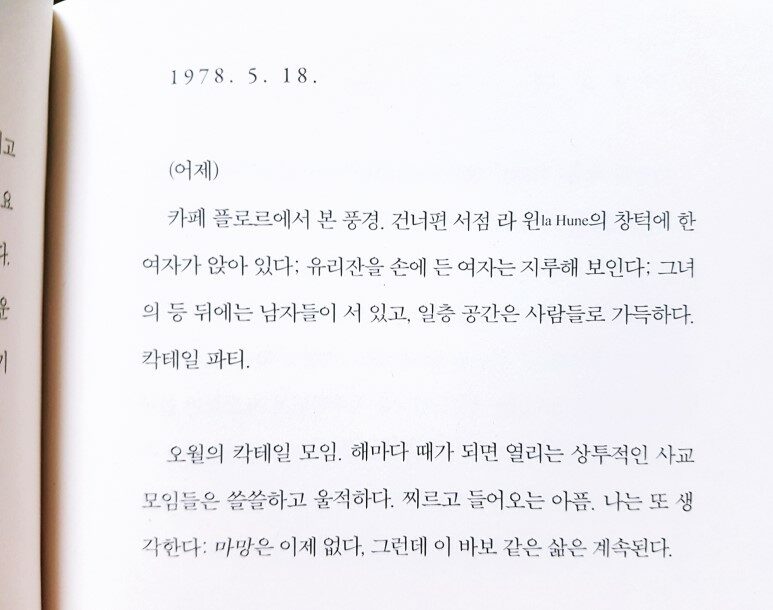
10. 29.
이상한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목소리, 기억을 불러들이는 그녀만의 씨앗(‘그 사랑스러운 울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나는 더는 듣지 못한다. 마치 청각 어딘가가 마비된 것처럼······. (p.24)
10. 30.
······ 그녀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채로 살아 있다. 이 사실은 무얼 말하는 걸까. 그건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미친 것처럼, 정신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건, 그 불안으로부터 한 발짝도 비켜날 수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이라라. (p.31)
11. 10.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만 용기를 가져야 했던 시간은 다른 때였다. 그녀가 아프던 때, 간호하면서 그녀의 고통과 슬픔들을 보아야 했던 때, 내 눈물을 감추어야 했던 때.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얼굴을 꾸며야 했던 때. 그때 나는 용기가 있었다. - 지금 용기는 내게 다른 걸 의미한다: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런데 그러자면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p.51)
11. 21.
한편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일에 관여를 하고, 그런 내 모습을 관찰하면서 전처럼 살아가는 나.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아프게 찌르고 들어오는 슬픔. 이 둘 사이의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서 더 고통스러운) 파열 속에 나는 늘 머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또 하나의 괴로움이 있다: 나는 아직도 ‘더 많이 망가져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괴로움. 나의 괴로움은 그러니까 이 편견에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p.70)
1978. 5. 18.
사랑이 그런 것처럼 애도의 슬픔에게도 세상은 비현실적이고 귀찮은 것일 뿐이다. 나는 세상을 거부하면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삭막함을, 나의 무너진 마음을, 나의 날카로운 신경을 세상은 자꾸만 심해지게 만든다. 세상이 나를 점점 더 기운 빠지게 만든다. (p.136)
1978. 8. 21.
내가 너무도 사랑했었고 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 내가 죽고 또 그들보다 오래 살았던 이들마저 죽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죽어서도 계속 기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망에 대한 기억이 나와 그녀를 알았던 이들이 죽은 뒤에도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내가 죽은 뒤에도 기억되어 차갑고도 위선적인 역사의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남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나 혼자서만 ‘기념비’가 되고 싶지는 않다. (p.204)
1977년 10월 25일, 바르트의 어머니 앙리에트 벵제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르트는 애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반 노트를 사등분해서 만든 쪽지 위에 바르트는 주로 잉크로, 그러나 때로는 연필로 일기를 써나갔다. 책상 위에는 이 쪽지들을 담은 케이스가 항상 놓여 있었다. 일기를 써나가는 동안에 바르트는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와 강연을 하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 많은 글을 발표했다. <밝은 방>을 집필했으며, 몇 장의 종이 위에 비타 노바의 스케치를 남기기도 하고, 강의를 계획하기도 했는데 이 작업들은 사실상 모두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호로 지니는 것들이며, 그 출발점에는 다름 아닌 <애도 일기>의 쪽지들이 존재한다. 그 쪽지들이 세상에 나온 건 30년이 지난 2009년. 원래 현대저작물 기록 보존소에 간직되어 있던 <애도 일기>의 원고는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분리된 쪽지들의 모습 그대로, 생략되는 내용 없이 온전하게 다시 편집되었다.
책은 프랑스가 사랑한 현대 사상가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를 잃은 이후 어머니를 애도하며 2년간 써내려간 일기형식의 에세이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슬픔을 지독하리만치 집요하게 그려낸다. 그가 어머니를 돌본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니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자신이 글을 써왔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그는 오직 어머니만을 위해 존재했다. 그런 어머니의 부재 앞에서 어느 누가 온전히 견뎌낼 수 있을까. 책에는 그런 상실의 마음이 두서없이 쏟아진다. 사무치는 그리움, 상실감, 슬픔, 고독, 외로움, 쓸쓸함 등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르트의 인생은 어머니의 죽음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어머니에 대한 그의 애착은 특별했다. 생의 즐거움을 노래하던 그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의 주인공인 그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도 아닌 슬픔 그 자체이다. 삶과 죽음 앞에서 영원함이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슬픔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공허하다. 모든 것을 잊어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