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멀리 갈 수 있는 배
무라타 사야카 지음, 김윤희 옮김 / 살림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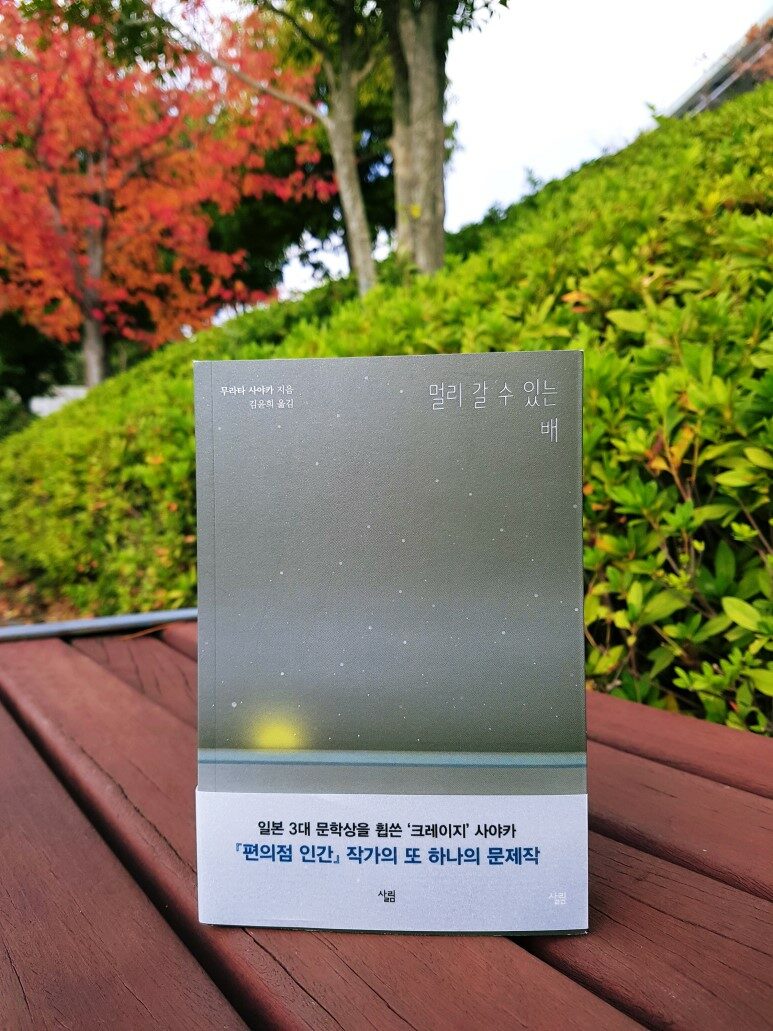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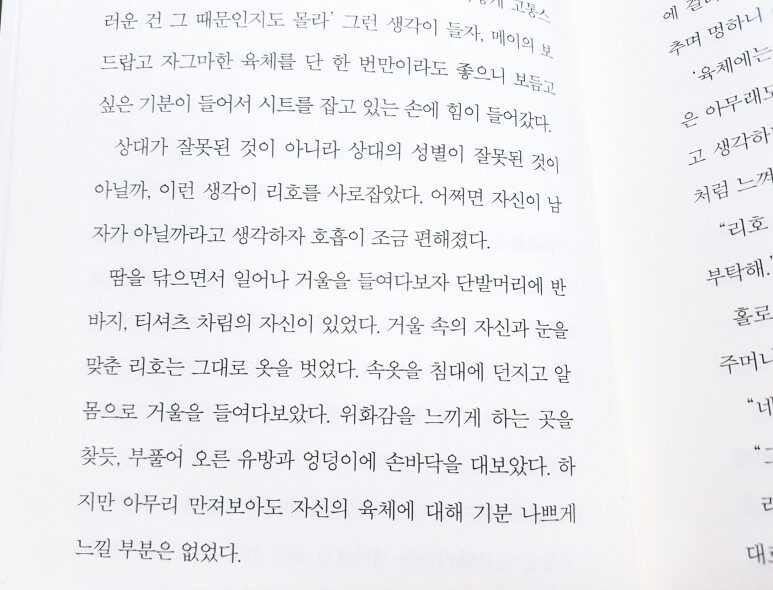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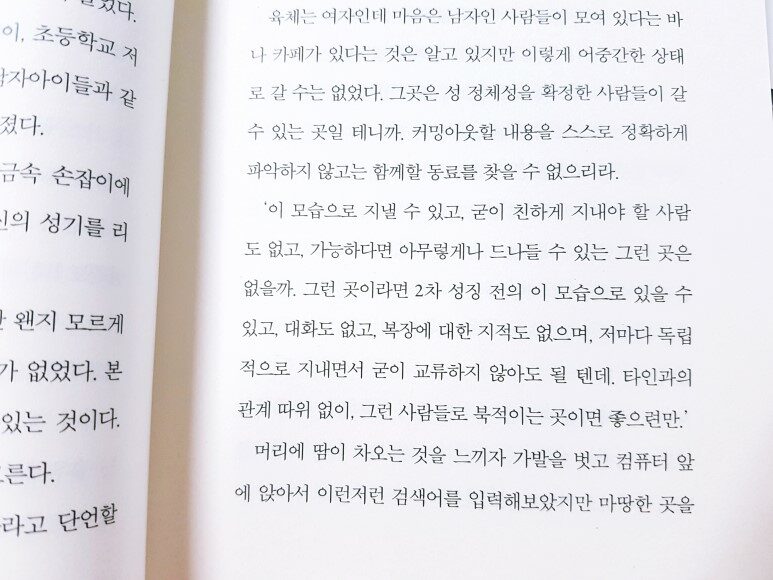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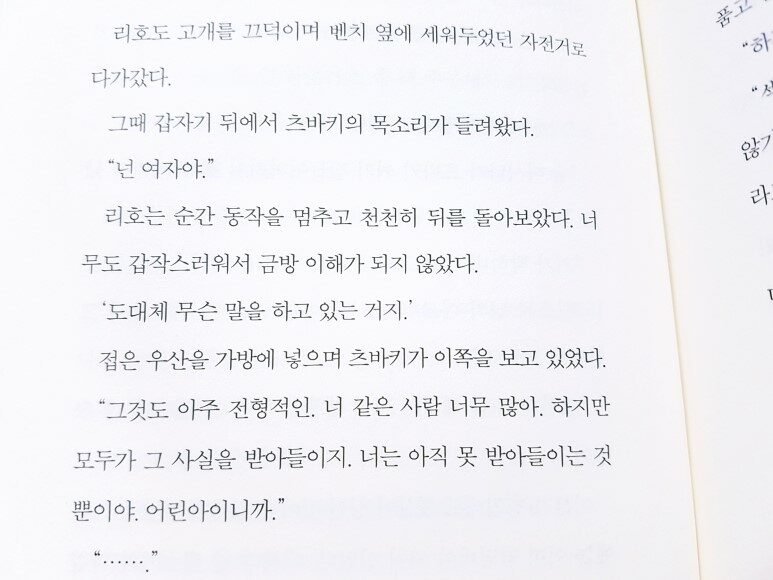
잠시 넋을 놓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던 리호는 왠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와 여자가 피부 위에서 뒤섞여 있는 지금 이 상태라면 2차 성징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신체발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2차 성징을 찾아서 좋아하는 성별을 골라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남녀가 뒤섞여 있는 거울 속 자신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직 성별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남자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던 모습과 겹쳐졌다. (p.26)
치카코는 솔을 지구에서 가까운 별 하나쯤으로밖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별빛을 기준으로 ‘하루’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보다 훨씬 영원으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감각이 더 강하다. 이렇게 회사에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하루라는 구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다. 혼자 있으면 다시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버린다. 다른 사람들처럼 혼자서 아침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우주를 떠도는 별과 별 사이에 영원히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익사해버릴 것 같았다. (p.67)
여자라는 가면을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여자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은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 내장에 성별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 했던 섹스에서 피부 안쪽 구석구석까지 리호는 그냥 여자였다. 그것은 샘물처럼 리호에게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움켜쥔 주먹에 이마를 기대었다. 독서실 바닥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독서실이 배처럼 느껴졌다. 어딘가로 배를 띄우듯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p.165)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주인공 리호는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가 고통스럽다. 그런데다 아르바이트 중인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는 메이에게 연정을 느끼기까지 하자 그녀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다. 어쩌면 자신은 남자가 아닐까, 아니면 성별 없는 섹스를 할 순 없을까, 상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별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자신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남자를 좋아하는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고민한 끝에 자신에게 맞는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남장을 시도한다. 옷을 갈아 입고 가슴에 압박 붕대를 두르고 긴 머리를 숨긴 채 그녀가 찾아간 곳은 다름아닌 독서실. 하지만 그곳에서 레스토랑 단골 손님과 마주친다. 그들은 자신보다 열 살 많은 치카코와 그녀의 단짝 친구 츠바키. 어두운 밤에도 선크림을 발라가며 자신의 몸을 정성스럽게 케어하는 츠바키는 그런 리호의 모호한 태도를 비난하고, 물체 감각으로 살아가는 치카코는 그 어느 쪽도 공감하지 못하고 남자와 자도 인간으로서 육체적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이들의 성은 어디로 다다르게 될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남장을 하는 리호, 여성성에 집착하며 밤에 외출시에도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츠바키, 물체 감각으로 살아가는 치카코까지, 책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세 여자의 이야기로 각자 고민을 떠안은 세 명의 여자가 독서실 옥상에서 나누는 밤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이야기 말이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 세 여자는 뭐랄까 좀 거북하고 상당히 낯설게 느껴진다. 성적인 시선을 받고, 얼굴이나 몸매로 가치를 평가 받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성스러움을 강요당하는 등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누가 그러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듯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누가 그러기를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언제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어도 되었것만 그러질 못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서 자신을 더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말이다. 그저 스스로에게 당당하면 될 껄.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땐 솔직히 불편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진 그녀들이라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조금씩 읽어 나갈수록 그녀들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한다.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점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혼자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본인들에겐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서 혼자서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싶다. 세상이 정해둔 잣대에서 어긋난 자신을 들여다보며 참 많이 힘들었겠다. 마치 미운오리 새끼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모두가 똑같아야만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다수의 의견에 소수의 의견이 묻혀버렸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모두가 다 같은 필요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