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아 있는 시체의 죽음
야마구치 마사야 지음, 김선영 옮김 / 시공사 / 2009년 11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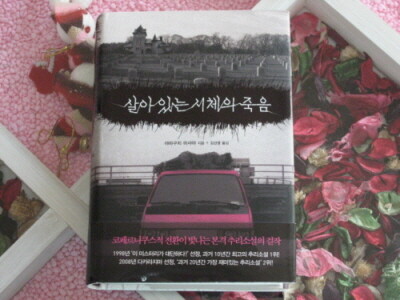
어찌보면 소설이나 영화 속 좀비의 등장은 이제 식상해질법도 한데 매번 새로운 좀비의 출현은 더욱 커다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다가온다. 끔찍한 표정과 행동으로 멀쩡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란 이유만으로도 그 공포가 극에 달하고, 그런 이유로 호러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살아있는 시체란 말만으로도 좀비에 대한 공포가 더욱 극에 달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솔직히 스릴러를 많이 접해보질 않았지만 제목부터가 섬뜩한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을 읽기 전에 나는 좀비의 정확한 유래를 찾아보고 싶었다. 좀비란, 어떤 물체나 힘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후, 자발적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죽은 몸인 채로 다시 태어난 인간을 말한다.
좀비와 죽음을 다룬 추리소설이란 이유와 섬뜩한 분위기의 제목만으로도 이미 책을 읽기 전부터 어느정도 긴장할 수 밖에 없었고, 야마구치 마사야의 작품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는지 모른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이었고, 때문에 좀비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지 손에 땀을 쥐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임종이 가까워진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발리콘가의 손자인 그린은 미국, 뉴잉글랜드의 툼스빌(묘지마을)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그 지역은 모든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괴한 현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린 역시 만찬회를 보낸 후 살인을 당하게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은 책의 주인공이자, 사건을 풀어가는 역할의 그린이 죽은 후 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읽으며 자연스레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편, 거대한 장의업을 운영하는 발리콘가에서는 계속해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시체들은 죽은 몸으로 다시 되살아나는데...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탐정 역시 좀비란 사실에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체셔와 허스 박사, 그리고 트레이시 경감 등 각각의 독특한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사건의 전개는 그 어떤 추리물보다 완벽한 플롯을 이루고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의 몸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또한 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벌어지는 스토리는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 현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들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을 읽다보면 산 자도, 죽은 자도 어떤 구분을 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떠올랐던 생각 한 가지는 과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였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커다란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철학적 의미의 죽음과 마주할 수 있었고, 온통 죽은 자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스토리는 당연히 어둡고, 심각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시체의 죽음은 상상 이상의 유쾌함을 선물하고 있다. 사람은 결국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미스터리를 읽고 죽음에 대한 심오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좀 낯선 경험이지만 이 책은 그저 재미로만 읽고 넘겨버리기엔 뭔가 깊이감이 느껴지는 소설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