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 박찬일의 이딸리아 맛보기
박찬일 지음 / 창비 / 2009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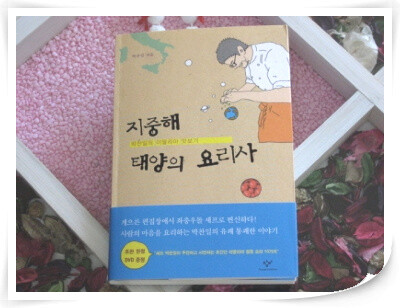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의 첫느낌은 뭐랄까 아직 책의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무작정 유쾌하고, 즐거워 보였던.. 흥미로운 책이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책이겠다 싶어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재미있는 일러스트가 한 몫을 했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책을 읽은 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저자의 감칠맛나는 글이야말로 이 책이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빠스타와 스빠게티를 유독 좋아하는 내가 이제서야 이딸리아의 요리에 관한 책을 접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을지 몰라도 처음 읽게 된 책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느껴진다.

저자의 이력을 보면 요리와는 거리가 좀 먼 인생이었다. 느닷없이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배우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이딸리아로 건너가 요리뿐 아니라, 와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일이었다. 같은 30대가 보기에 솔직히 너무 과감한 결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숨겨진 열정은 이딸리아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듯 보이고, 저자는 이딸리아와 어떤 필연적 운명을 타고 난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이든, 이딸리아든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 신참의 생활은 많이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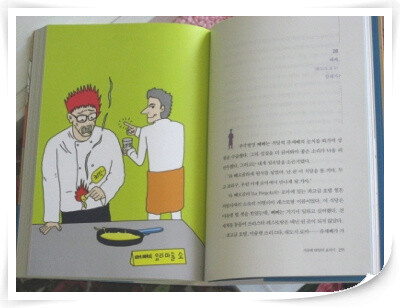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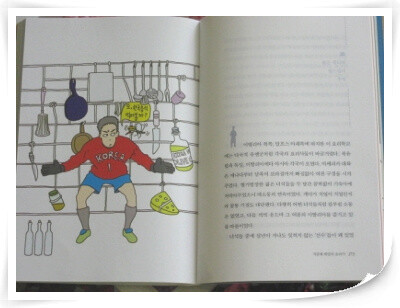
하루에도 수 백번씩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밀가루 포대를 뒤집어 쓰고, 빠스타 하나를 제대로 삶기에도 역부족이었던 신참은 그의 말대로 피자 곤죽이 되어 처참한 몰골로 숙소로 돌아오는 반복된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간혹 너무 심한 언어폭력과 가혹한 대우를 보면서 주방장 쥬제뻬와 부주방장 뻬뻬가 얄미워 보이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모두 로베르또가 이딸리아 음식의 달인, 그랑 셰프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겪은 것이란 생각에 신참은 어디서도 참 가엾은 존재들이란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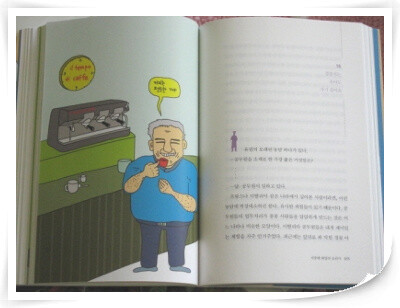
요리 한 번 배워보겠다고 동양에서 씨칠리아로 건너간 보조 요리사.
지중해의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듯한 날씨와 낯선 환경, 잠시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아홉 개의 빠스타 솥단지와 뒤엉켜 삼류요리사도 될 수 없을것만 같았던 저자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다. 씨칠리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배웠고, 특히나 가장 큰 가르침으로 기억되는 것은 요리사는 아이들의 어머니처럼 먹이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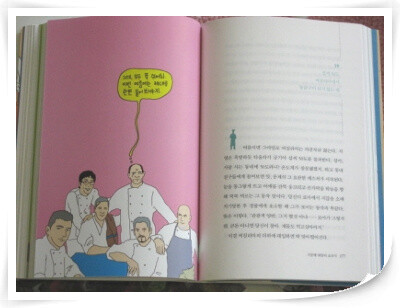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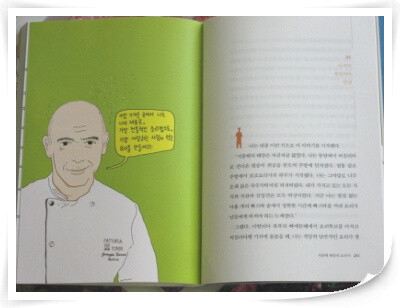
요리사란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그릇의 요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통제하고 감시하는 관찰자여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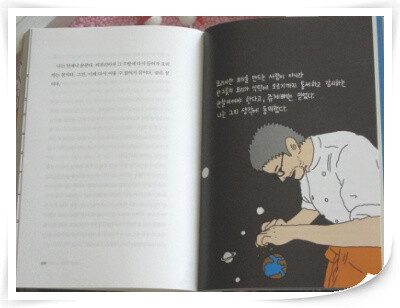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는 읽을수록 재미있는 책이었고, 정말 유쾌한 책이었다. 시칠리아 현지의 모습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진솔하게 다가왔고, 요리의 화려함이나 이딸리아의 멋진 낭만보다는 꿈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건강한 30대 남자가 낯선 이국땅에서 요리에 대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펼쳐진다. 요리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요리에 관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책을 권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 문화와 요리, 실생활의 다양한 모습등을 담은 책이지만 왠지 한 편의 멋진 소설을 읽은것 같은 기분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