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 여백(여백미디어)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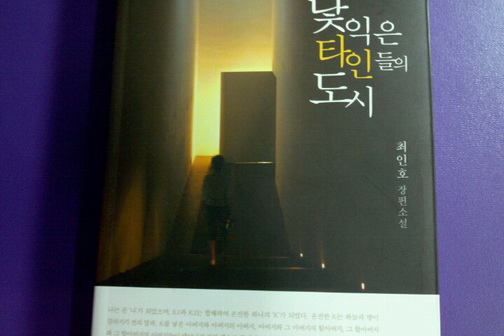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 모두가 모두에게 타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출구 없는 고독에 빠져든다. 스스로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삶을 질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면 고독에 따라잡히고 말테니까.. 역설적인 제목은 책을 읽기도 전에 불안함을 드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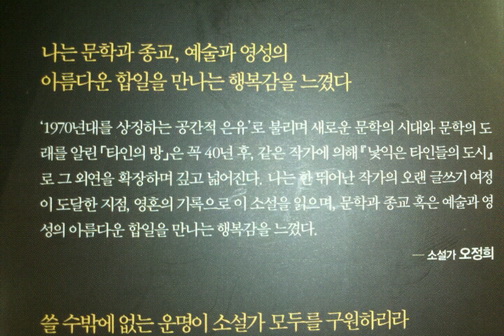
70년대 최인호를 널리 알렸던 [타인의 방]을 바탕에 깔고 작가는 새로운 책을 써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는 변화했고 작가도 성장했을 터... [타인의 방]이 던졌던 화두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을지 기대하게 된다. 오정희 님의 소개대로 깊고 넓어진 작가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을까? 특히나 오랫동안 역사소설을 써왔고 [잃어버린 왕국], [상도], [유림] 등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현대소설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이 투병 중에 쓴 책이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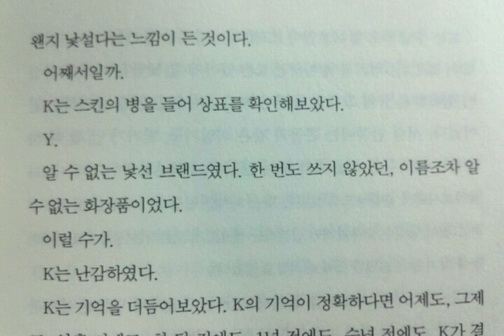
토요일 아침, 잠에서 깬 것은 무언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울리지 않았어야할 자명종이 울려 잠에서 깼고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벗겨져 있으며 늘 사용하던 스킨이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가 낯설고 낯설어 섬뜩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은 현실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우연히 발견한 흰머리 한가닥처럼, 낯설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감이 존재하는 것. 변질된 것은 사회인가, 혹은 나 자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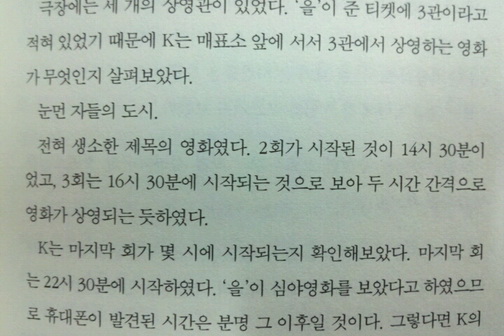
이질감에서 출발하는 이 소설은 제목부터 '눈먼 자들의 도시'를 연상시키며, 갑작스런 세계의 변모라는 소재 역시 동 영화를 상기시킨다. 아니나다를까, 작가는 소설 속에 영화를 등장시킨다. 그가 이질감을 느낀 출발점에 이 영화가 하나의 실마리로 놓여있다.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서 작가는 천변풍경 속의 인물처럼 여러 인물을 만나고 여러 장소를 떠돌며 답변을 찾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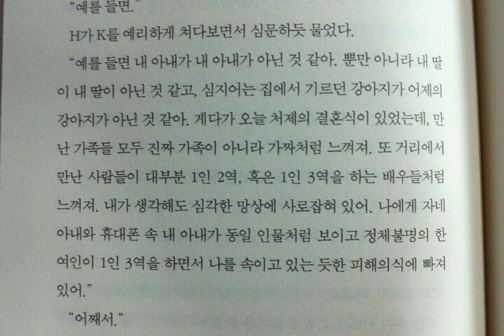
바뀐 것은 세계인가, 자신인가... 그 답변이 희미하게나마 제시되는 시점부터 소설은 현실에서 벗어나며 강력하게 관념적인 색채를 띈다. 철학적, 종교적인 사유가 차가운 냉동육과 같은 어조로 전개되고 그는 세계의 이치에 대해 눈을 뜬다. 그 이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정말 끝인지, 아니면 순환의 한 부분인지 답변은 독자가 내릴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읽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소설의 힘은 여러 역사소설을 통해 보여주었던 작가의 서술능력이 한껏 발휘된 결과인 듯하다. 마지막 부분의 꼬임은 왠지모를 작위적 느낌도 안겨주지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게 하는데 성공한다. 섬뜩함과 흥분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독특한 책이 아니었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