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에 선 과학 -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
실라 재서너프 지음, 박상준 옮김 / 동아시아 / 2011년 4월
평점 :

품절


과학과 법의 긴장은 역사상 여기저기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본질적으로 법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만 과학은 진보적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다보니 과학이 법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법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양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할텐데요, 특히 과학발전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는 현대에 와서는 그런 갈등 양상이 더 자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양상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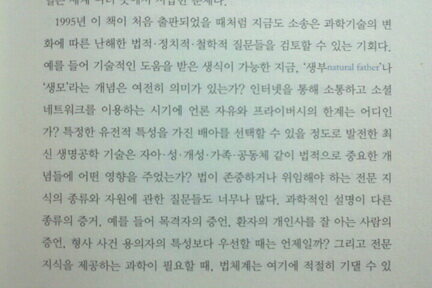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생각보다 제법 예전이더군요. 1985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상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발전속도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고, 본질적인 문제는 쉽사리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전반부에는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예컨대 과학이 법적 판결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끼치도록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실제로 과학에 대하여 취해온 태도의 변화를 기술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 사건을 들어 구체적인 갈등 양상을 그려냅니다. 소송과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의 법문화가 잘 드러나는데요, 예컨대 유독물질로 인한 인과관계의 파악 문제라던가, 유전공학의 도입 과정, 가족의 범위의 변화의 주제를 놓고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는가를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결코 읽기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구성부터가 법학전공서적을 연상시키는 구조인데요, 무엇보다도 문체가 극히 건조하고 규정적입니다. 보다 보면 법철학서를 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니만치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볍게 교양서를 읽는다는 기분으로 읽으려고 하기에는 벽이 높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행간에서 묻어나는 미국 법체계의 성격이 우리의 그것과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는 미국문화의 특성이 법문화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더군요.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인데 어째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름의 균형을 이루기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역자 후기를 보면 이 책을 소개하는 의의가 잘 요약되어 있더군요. 실제로 우리가 겪은 과학과 법의 갈등 양상은 이 책에 소개된 미국의 그것과 비견하여 궁리해볼 바가 많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왠지 교양서스러운 디자인의 책이지만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가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두께도 상당하지만 하루에 한 단원 이상 읽으면 머리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법대생이나 법 관련자를 대상 독자로 삼은 책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물론 내용 자체의 충실함이나 번역의 정확성은 인정할만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