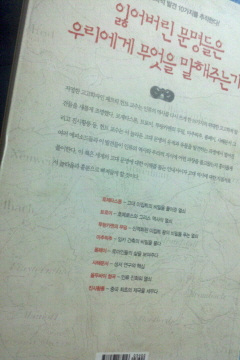-

-
역사를 다시 쓴 10가지 발견 -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들
패트릭 헌트 지음, 김형근 옮김 / 오늘의책 / 2011년 3월
평점 :




대학시절 교양과목으로 고고학을 들었더랜다. 어릴 때 투탕카멘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나 슐리만의 기적과 같은 트로이 발굴에 매혹된 후, 남몰래 고고학에 대한 동경을 키워왔던 터였다. 수업이 재밌으리라 기대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교양과목을 배우는 정도만으로도 고고학자에게 얼마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역시 겉보기와 실상은 다른 법이라는 점을 절감하곤 그 후 고고학 일반에 대한 관심은 접고, 고고학적 발굴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었더랬다.
지리하고 답답한 고고학적 발굴에서 역사에 남는 발견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 할만할 것이다.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고 항상 유한한 시간에 목말라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백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와 만나는 일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일지! 이 책은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라고 칭해질만큼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 10편을 모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도 트로이나 투탕카멘의 무덤, 진시황릉처럼 유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시리아 도서관이나 티라, 올두바이 협곡 등 낯선 것들도 적지 않았다. 서술 방식은 우선 발견의 순간을 중심으로 전후 배경과 탐사 과정을 묘사한 후, 유적이 살아있던 당시의 시대상을 그려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견의 어떻게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의외랄 정도로 흥미 위주의 이야기는 덜어내고 사료적 가치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마치 대학교 교재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달까? 딱딱하다는 인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충실하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반갑기도 했다.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마추픽추의 발견에 대한 글이었다. 평소 언젠가 꼭 한번 가보겠다고 맘먹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겠지만, 그보다 이 글에서 예외적으로 저자의 특이한 체험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추픽추를 조사하던 저자는 우연히 협곡으로 만들어진 천연 원형극장에 다다르게 된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끌려 저자는 리코더를 꺼내 연주를 시작한다. 덤덤하게 연주를 시작했던 그였지만 잠시 후 협곡에 돌아온 완벽한 메아리가 그를 경이로운 흥분상태로 끌어들인다. 우연이었을까, 연주에 몰입하여 시간과 공간을 잊고 있던 그는 곧이어 태양이 안개를 뚫고 나와 3중의 무지개를 빚어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틈에 그의 곁에 다가와있던 원주민들 중 한명이 그를 '현자'라 부른다. 글의 말미에 그는 이 '현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유혹적인 길이 얼마나 우리를 멀리 이끄는가에 상관없이 고대 역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은 현자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충실히 풀어낸 내용에 만족하면서도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책은 근래 본 책중에서 가장 성의없이 번역이 이루어진 책이었다.
'성벽을 깨는 해머 치면서 커다란 방패로 엄페하면서'
'...물건들이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마인 것처럼 불태워졌다'
'...기억은 겨우 성서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돼버렸다'
79쪽 한면에서만 이렇게 세 문장의 비문을 찾을 수 있었다. 어색한 문투를 제외하고서도 말이다. 영어를 직역한 문투는 단점 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더라도, 오타나 비문이 이 정도로 많은 것은 무성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편집자가 인쇄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걸러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요새 출간되는 번역서의 질을 생각해보면, 읽기 답답할 정도로 이상한 번역은 치명적인 단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판에서는 반드시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