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베아트리스와 버질
얀 마텔 지음, 강주헌 옮김 / 작가정신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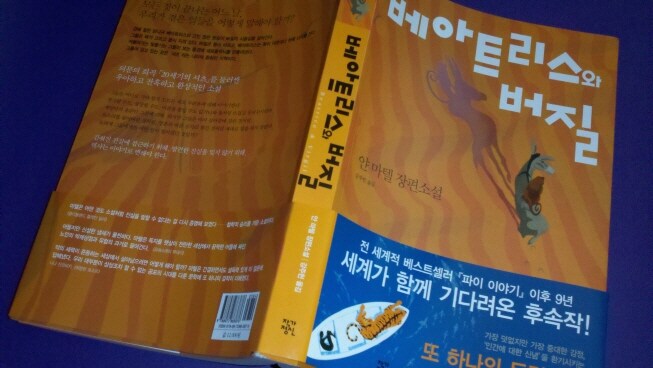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얀 마텔의 신작이 나왔네요. [파이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9년이 흘렀다니, 시간 참 빠릅니다. [파이 이야기]를 읽고 깊이 감명받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현실과 이상, 사실과 환상, 감정과 이성, 의지와 욕망 그리고 재마와 감동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이루어냈던 훌륭한 소설이죠.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의 다른 소설 [셀프]와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 출간되었습니다만, 이 소설들은 후속작이 아닌 전작이 [파이 이야기]의 인기에 힘입어 재출간된 것이었죠. [셀프]는 읽어보았습니다만 독특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정한 후속작이 나왔으니 반갑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주홍빛의 표지부터가 [파이 이야기]를 연상시키는데요, 디자인부터 후속작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소설은 표지에 호랑이 대신 당나귀와 원숭이가 등장해있습니다. 소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우선 베아트리스와 버질이 단테의 신곡과 관련되는 이름이자 소설 속 당나귀와 원숭이의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주요한 소재로써 홀로코스트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화적 특성이 강한 것이 얀 마텔 소설의 특징이고 보면 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는 바였습니다만, 후자는 다소 놀랍더군요. 제가 알기로 얀 마텔은 캐나다 출신이고 유태인과는 연관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현재에 와서 유태인의 헤게모니 장악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소재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것이 생산될 수 있을지 의아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아는 얀 마텔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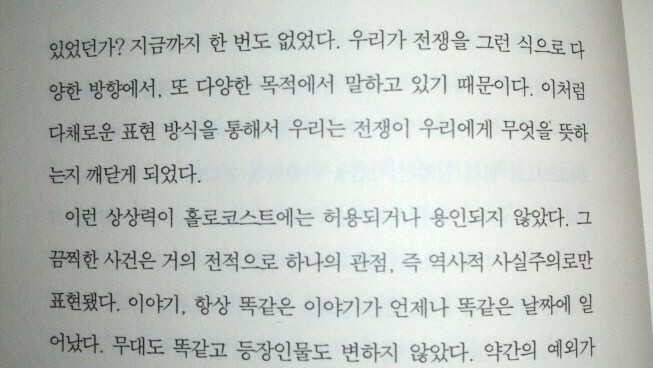
작가가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택한 이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작가의 분신인 '헨리'에 의해 소설 초반에 밝혀집니다. 즉 홀로코스트는 역사적 사실주의의 입장에서만 탐구되었을 뿐,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그 함의를 다양하게 풀어내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베아트리스에게 버질이 그 맛과 향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그러한 발상은 재등장합니다. 즉 어떤 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완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버질이 배 맛을 묘사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하고는 당장 손에 배를 들고 그 맛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으로도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미끄러져 내릴 뿐이라면 하물며 그러한 수단 자체가 제한된다면 실체로부터는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작가의 뜻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입장에 충실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작품 속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아트리스와 버질의 연극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잔혹함과 그것이 남긴 상처가 상징적인 방식으로 등장할 따름이죠. 오히려 이 소설은 홀로코스트로 대변되는 폭력성 일반에 대하여 말하고 잇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강한 향은 코를 마비시키니 그 향을 희석시킨 후에야 보다 그 향을 잘 분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조향사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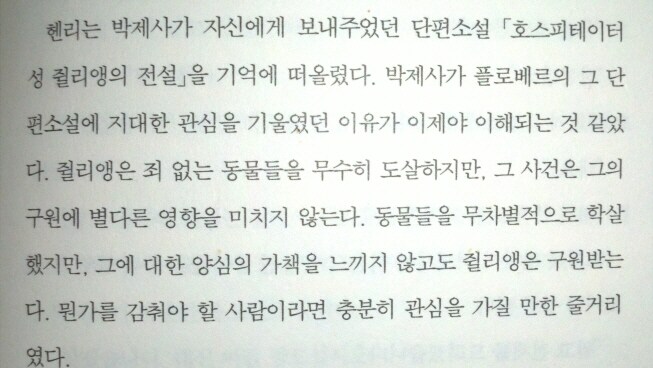
상징적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내리고 평을 내리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독의 소감을 말하자면 분명 [파이 이야기]만큼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로 기막힌 균형감각이 발휘되어 소설적인 재미도 발군이었던 [파이 이야기]에 비해 이 작품의 전개는 밋밋하고 희미하면서도 의아함을 남깁니다. 저로써는 마지막 장면의 반전-이라고 할까요-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급전직하 역시 여운을 남기기보다는 당혹스러움을 남길 뿐이었고요.
둘째로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가 너무 떨어지네요. 전작에서 파이와 리차드 파커에게 느꼈던 놀라운 공감을 생각해보면 이번 소설의 주요인물인 박제사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교감의 여지가 너무 없습니다. 인물의 생각도, 감정도, 의도도 느낄 수 없다고 할까요.. [성 쥘리앵의 전설]이 박제사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말하기'외에 별다른 이면이 보이지 않았다면 역시 실패한 캐릭터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폭력성에 대한 묘사는 있습니다만 통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통찰이 없으면 상징은 그저 유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실린 [구스타프를 위한 게임]도 실리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 자체로는 인상적이고 여운을 남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설 전체에 대해서라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품이 품고 있던 그나마의 여지들을 스스로 잘라냈다고 할까요..
실망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목마르게 기다려온 후속작으로써는 아쉽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9년이나 기다렸는데 통찰은 없고 상징과 기교만 남은 작품이라니, 팬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1독의 소감일 뿐이니, 다시 곱씹고 되씹어 읽어보면 다른 맛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는 남아있습니다. 제 식견이 부족하고 작품 자체도 상징을 많이 담고 있으니 말입니다. [파이 이야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독자로써 다시 곱씹어보고 새로이 소감 올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