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페이지 안되는 짧은 책에, 중간에 자꾸 장을 나눠 결코 길지 않은 책인데, 다 읽어'치우는'데 좀 걸렸다.
바쁜 핑계도 들 수 있을 테지만, 조금 느리다.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모렐의 발명'La Invencion De Morel이란 제목에 혹해서 잡히는 대로 읽은 작가,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의 궂긴뉴스를 찾아 읽어보았더니,
돼지 전쟁 일기 Diario De La Guerra Del Cerdo 1969
플라타에서 겪은 어느 사진가의 모험 Aventura De Un Fotografo En La Plata 1985
그의 대표작으로 소개를 해놓았는데, 빠져 있는 걸 보니 대표작에는 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모렐-은 환타지 속의 리얼리티, 평행 세계의 구축하며 시간을 묘하게 비틀어대는 재주가 탁월하여 믿기지 않더라고 독자들을 자의적으로 그 세계로 발을 들이게 만든다고 한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좀 느리지만 그런 비슷하게 묽힌 마테 맛을 느낄 수 있다.
200여 페이지 조금 더 되는 1978년 발표작, 뒤의 이분 책이 그랫다고 하니 정치적인 색채로 한 세발 건너 둘러놓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일타3피로 적절하지 않았을까, 달랑 책 하나 읽고 짐작해본다.
느릿하다. 그렇다고 아주 깊이 들어가거나, 한없는 주절거리며 뱅뱅이만 도는 미친 책은 아니라 자근자근 밟아 가는데, 흘러가는 문장 주워들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환타지냐 현실이냐 실랑이하며 갸우뚱거리며, 어디에 종지부를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모양새에 참고 읽다 못해, 괜히 딴 길을 새었더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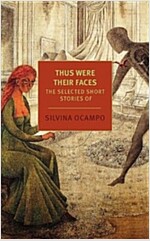
'책에서 사랑해 마지 않는/사랑하는지 모르는 그의 안사람'
실비나 오캄포 단편 선집이다. 실비나 오캄포 아르헨티나 문학사에 또 다른 한 자리 매김하며 카사레스/보르헤스 그룹과 교류하던 오캄포 자매들 중의 한 명이란다.
선집 형태라 그렇가도 하겠지만 세월을 잇느라, 여러 실험적 문체에서 다방면/하지만 한정적 주제를 다 걸치느라 질게 만든 메밀 국수처럼 자꾸 끊기는 느낌이라 한번 끊고.
중간으로 돌아가 내처 읽었다. 끝판이라, 더군다나 밝은 낮에 햇빛을 받으며 읽는지라 진도가 훅 빠진다.
그리고, ----스포일러-----환타지를 환타지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이제야 말이 되는 결말을 확인하여 여기 도장을 박아본다. 땡. 느낌은 뛰어난 솜씨에도-글쎄-다른 일로 바쁜 지라-모르겠지만-시원텁텁한 맛의 아이스커피, 그것도 생콩을 덜 볶은 맛이다. 환타지가 일상으로 스크린에 차고 넘치는 이렇게 뒤늦게 읽은 탓, 동시대에 접했더라면 상찬한 마떼 맛을 즐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조금 쉬었다가 유칼립투스 접이탁자에 커피 한잔 다시 놓고, (그렇게 유다른) 오캄포 여사님께 다시 돌아가 봐야지. 한쪽 도로에 차 지나는 소리에 다른 귀에 시끄러운 매미소리, 얼마만에 쉬는 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