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유의 힘
장석주 지음 / 다산책방 / 2017년 7월
평점 :



Metaphor.
즉 은유는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eta(over) + phora(carrying) 즉, 의미의 이동과 전환을 의미한다.
'-같다', '-듯하다'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숨기고 압축된 직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은유(隱喩)라고 한다.
이 은유라는 것 때문에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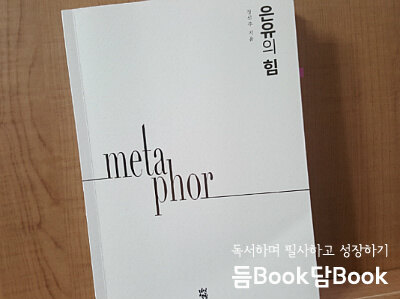
하지만 이 은유의 방법과 매력을 알게 되면 시를 즐겨 읽고 쓰게 될 것인데,
이런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저자는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의 문장으로부터 은유를 정의하고 있다.
p.8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천둥은 번개가 번쩍인 것을 공표한다.”고 썼다.
…
멕시코 시인의 저 문장은 사실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아울러 이 문장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는 하나의 은유로 오롯하다.
은유라는 한에서 이 문장은 사실을 넘어서서 사유를 무한 확장하는 힘을 갖는다.
나는 시가 생성되는 비밀의 핵심이 ‘은유’라고 보았다.
시는 말의 볼모이고, 시의 말들은 필경 은유의 볼모다.
은유는 시의 숨결이고 심장박동, 시의 알파이고 오메가다.
시는 항상 시 너머인데, 그 도약과 비밀의 원소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은유다.
상상력의 내적 지평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은유에 대해 사유하며 그 내부로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웠다.
문학시간에 배웠던 시는 늘 어려웠다.
몸과 가슴으로 느끼기 전에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 암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시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복의 저서 <무한화서>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저자는 오직 온 몸으로 쓴 시만 신뢰하라고 한다.
p.18~19
시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꺼내는 것이다.
머리가 아니라 몸!
“시는 몸에서 바로 꺼내야 해요.
시를 쓸 때 생각에 의지하면 항상 늦어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도록 하세요.
머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빨리 쓰세요.
시에서 리듬이 강해지면 의미가 희박해져요.
그건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갔다는 증거예요.”
읽다 보면 시인의 글은 마치 시처럼 느껴진다.
저자가 시에 대해 설명하는 정의적인 문장에서는 다 시는 노랫가락처럼 느껴진다.
아래의 문장처럼 말이다.
p.23
서정시의 질료적 본질은 나 자신의 노래, 나 자신의 숨결이다.
저자는 은유가 시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다양한 시를 소개하고 시에 내포되어 있는 은유의 내용을 아낌없이 풀어 놓는다.
p.30
시가 바로 은유니까!
그렇다면 시는 왜 항상 은유로 돌아오는가.
모든 시는 은유의 태동, 은유의 발생에서 시작한다.
은유는 하나의 사물, 하나의 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시만 은유를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은유 없는 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책에 소개된 여러 시 중에서 산문처럼 긴 시라고 해도 그 안에는 은유가 어김없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분석하는 맛이 시에게는 있다고 저자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책 속에 수록된 여러 편의 시가 모두 어렵게 느껴진다면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 내포되어 있는 은유의 설명을 참고해 보자.
약간은 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은유의 대상을 주제로 삼아 시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시에서 거울, 물, 이름, 시간, 눈물, 목소리 등등 많은 사물에 대해 시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은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는 한 번만 읽어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 번 꼭꼭 씹어 보자.
이렇게 씹어서 느끼다 보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시가 느껴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자는 시인에 대해 또 설명한다.
p.106
시인들은 말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다.
시는 말을 채집하고 그것을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말을 버려서 의미의 부재에 이르게 한다.
말의 바닥에 닿으려고 말을 지우고 빈자리를 만든다.
말의 빈자리에 시가 들어선다.
말의 祭儀로서의 시, 그 제의를 주재하는 집정관으로서의 시인.
좋은 시들은 가장 나쁜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남음으로 이끈다.
환멸과 지리멸렬 속에서도 자진하지 않고, 기어코 살도록 돕는다.
저자는 천생 시인이다.
시를 사랑하고 시를 좋아하고 시와 평생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 책을 읽으면서도 짐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쓰기 시작한 사람이나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조금은 친숙하고 시의 맛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책 도처에서 느껴진다.
이런 책을 단순히 어렵다고만 치부할 것인가.
삶은 곧 시이고, 시는 곧 은유이니 삶과 은유도 하나가 아닌가.
어찌 은유의 맛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참으로 재미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