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너리 오코너]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플래너리 오코너]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플래너리 오코너 -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외 30편 ㅣ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12
플래너리 오코너 지음, 고정아 옮김 / 현대문학 / 2014년 12월
평점 :



흔히 하는 말 중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다름’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다름’ 역시 차별의 산물이다.


나와 남을 ‘다르다’고 규정짓는 기준은 확정적이고 절대 불변하는 만고의 진리가 아니다. 차이의 기준은 언제나 모호하고 시대적, 장소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기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 역시 차별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별을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속 합리주의자들이 결코 정의롭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줄리언(「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이나 레이버(「이발사」)는 인종차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주위의 다른 인종차별자들과 다름없이 피부색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레이버는 조지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 단정하고, 조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조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 애쓴다. 줄리언이 ‘깜둥이 친구’를 사귀는 데 실패한 것도 당연하다(p556). 줄리언의 어머니는 백인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했고, 줄리언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려 했다. 결국 이들에게 흑인은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나와는 ‘다른’ 존재이자 도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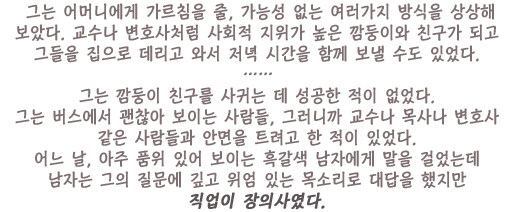
「오르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中
아이러니한 것은 이 책의 소설 속 인물들이 상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름’을 강조하기도, ‘같음’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농장의 주인인 매킨타이어 부인(「추방자」)은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 혹은 백인 추방자를 소작농으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다가도(“나한테 있는 건 온통 허섭스레기뿐이야!” p276) 백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이 가해지면 그들 간의 계급적 차이를 강조한다(“그 검둥이가 유럽 출신 백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건 절대 안 돼.” p302). 그리고 이렇듯 ‘백인’이라는 계급으로 묶이던 추방자는 ‘국가’라는 프레임이 가동하게 되면 흑인 노동자들에게 마저 소외당한다(“폴(란드) 남자요, 폴은 여기하고는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p293, “판사님은 익숙한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p295 이 두 문장 모두 '폴 남자'와 함께 일하는 흑인 노인 애스터가 한 말로 모르는 악마는 '폴 남자'를 의미한다.). 반면 같은 소작농임에도 쇼틀리 부부는 그들이 매킨타이어 부인과 '같고' 흑인 및 추방자와는 '다른' 미국국적의 백인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이렇게 플래너리 오코너가 다루는 인물들은 상층계급과의 ‘같음’, 그리고 하층계급(혹은 본인의 기준에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과의 ‘다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같음’을 강조하고 ‘다름’을 부각시키는가.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자존심을 지켜온 것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만의 '다름'을 찾는 차별화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그러나 '같음'을 찾아 연대한다면 자본주의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인생이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라지만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그들 역시 나만큼이나 소중한,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