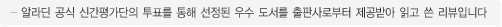[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테인 지음, 김지향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우리가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의지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의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자신을 후원하는 이익집단의 요구사항이라면? 차라리 '이게 다 돈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마저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 책에서 보게된다.
1900년대를 전후로 미국 사회에서 끈임없이 제기되었던 음식물과 영양소에 대한 소비구조의 근원을 파해친다. 개략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0.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듯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1. 그 발표 중에서 우리의 건강에 관계된 요소를 부각시킨다.
2. 부각된 요소은 부족할시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조작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한 삶은 물론 장수할 수 있다고 선전된다.
3. 촉진된 소비로 관련 기업이 돈을 번다.
4. 0-3의 패턴이 무수히 반복된다.
이 책을 읽다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게 존재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이를테면 비타민이라는 것 이름부터가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생기넘친다는 의미의 vital이라는 파생된 vitamin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생기있는 삶을 살 것 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이러한 환상은 대중의 소비욕구와 기업의 시장개척과 맞물려 비타민 관련 산업을 부추기게되고 그 사이에서 영양학자들은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들을 선전하며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게되는 것이다.
애매하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과학자들의 부와 명예에 대한 욕구, 그리고 기업가들의 욕심과 소비자들의 맹목이 만들어낸 음식에 대한 어리석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십수년전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들일까? 음식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물이라고 믿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과연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행위들이 없는 것인지는, 글쎄, 나는 오늘날 이러한 일이 없다고 확신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