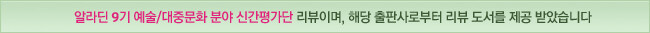[사진 철학의 풍경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사진 철학의 풍경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사진철학의 풍경들
진동선 글.사진 / 문예중앙 / 2011년 7월
평점 :

품절

"모든 새로운 것은 단지 망각일 뿐, 카메라는 잊기 위해 기억된다." 이 말은 존버거가 한 말이라고 한다. 꽤 그럴 듯한 말이고, 과연 그렇구나 싶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사진을 찍는 것일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찍는 것은 아닐까?
난 사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사진을 감상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찍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찍혀나온 나는 왠지 나 같지가 않고 낮설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나였어?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그나마 아무리 사진 찍기를 싫어해도 반 강제적으로 찍힌 나의 젊은 날의 사진이 몇장있다. 또 어느 날 그 몇 장 안되는 사진을 보면 왜 그리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까? 어느 틈엔가 날아가버린 내 삶의 시간들이 아쉽고, 그리워 뭉클해지는 것 같다.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자 나는 그처럼 사진 찍히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나의 이런 생각에 반하여, 지나가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을지도 모르는 순간을 사진에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사진의 운명이고, 사명은 아닐까?
솔직히 이 책은 좀 어려웠다. 예술에 철학을 접목시켜 미학이란 학문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사진에 철학을 접목시키는 줄은 몰랐다. 책은 사진에 철학을 접목시켜, 인신의 문제, 사유의 문제, 표현(또는 조형)의 문제, 감상의 문제 등을 요목조목 집어냈다. 한마디로 사진의 풍부한 철학적 사유가 돋보이는 책이다. 이 한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철학은 물론이고, 문학, 심리학, 미학까지 저자는 두루 섭렵한 흔적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심오한 사진 철학을 독자는 미거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사진을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겐 나름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닐까 싶다.
그래도 내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다이안 아버스와 사진의 폭력'(251p~)은 아니었나 싶다. 1970년대 사진계를 풍미했던 다이안 아버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일까? 그녀는 한마디로 사진계의 이단아였고, 그런 그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을 두고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수잔 손택은 <사진에 관하여>란 책에서 사진의 윤리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첫 번째로 '바라본다는 것의 근본 윤리'를 묻는다. 요절한 사진가(다이안 아버스)를 향한 윤리문제다. 그녀가 찍은 사진의 윤리이면서 사진가를 향한 윤리이다.
두 번째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카메라의 시선'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진의 시선이기도 하다. 왜 그토록 카메라만 쥐면 이미지 사냥꾼이 되어버리는가? 왜 그토록 먹이를 사냥하는 약탈자가 되는가? ...... (중략) 다이안 아버스의 자기고백처럼 성찰, 반성,자각을 희망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못된 짓이지요."(255p)
과연 모든 사진은 근원적으로 폭력적인가. 모든 사진은 포획과 탈취의 결과물인가(255p)
다이안 아버스의 죽음 앞에서 수전 손택이 제기한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각의 영웅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극단적인 시각적 공명심에 대한 경각이기도 하다. 수전 손택은 이렇게 말했다. "사진을 통해서 추한 것을 찾으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사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왔다. (...) 카메라가 이 세계를 미화하는 본연의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완수한 탓에, 이제 세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진이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다.(256p)
다이안 아버스라면 누군지 알 것도 같다. 언젠가 나도 본적이 있는 피카소가 짖궃게도 식탁위에 크루아상으로 8개의 손가락을 만들고 힐끔 다른 곳을 응시한 사진이 바로 그녀의 작품이란다. 결국 인간은 카메라 앞에 정직할 수 있는가를 수잔 손택은 묻고 있는 것일게다.
사실 수잔 손택의 말이 꼭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지는 않다.작가, 정치가, 영화 감독, 화가 등 이 세상에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하는 모든 일에도 적용될 법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선을 넘게되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조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일이 사람을 조정한다. 사람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카메라에 의해 사람이 조작을 당한다. 무서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다이안 아버스는 처음엔 카메라를 사랑했고 자신의 일을 사랑했겠지만, 결국 카메라란 괴물에 자신이 잡아먹힌 건 아닐까? 섬짓하면서도 뭔가 경종을 울리는 말같아 곱씹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아무런 생각없이 사진을 찍지 않기 위한 책 같다. 충분한 생각할거리를 제공해 주고 사진을 보라고 주문하는 책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