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환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들의 이야기다. 아버지는 카다피와 같은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카다피의 정치적 행보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 카다피 치하의 몇몇 수용소에선 “정치범”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다. 어떤 기록을 뒤져봐도 아버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들이 이 생사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카다피가 어떻게 집권하고 정권을 유지했는지, 리비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를 대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의 태도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드러난다.

반면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은 좌파운동가 부모를 둔 딸의 이야기다. 부모는 마르크스주의자이기에 팔레비 왕정에도 아마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 같지만,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이후 모든 종류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에 더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다 견딜 수 없어 프랑스로 이주해 삶을 꾸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딸의 시선으로 다뤄진다. 복장 제한과 일부다처제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여성차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리비아에서보다 더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딸은 부모의 행보에 대해 덮어놓고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념을 딸인 자신보다 더 우선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두 책을 읽는 가장 첫 감상은, 나름 소설 또는 이야기라는 이 두 책의 원래 형식과 걸맞지 않게 “공부했다”는 느낌이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운동은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던 내용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독재정치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에 저항한 사람들의 행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었다. 마지디의 글도 마찬가지였다. 호메이니가 일으킨 이슬람 혁명이 이란 사회 전체에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 그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두 책 모두의 배경이 우리가 아랍이라고 묶어서 부르기 좋아하는 어떤 사회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속주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확실히 한 쪽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만은 분명한 공통점이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로운 학술활동, 모든 것이 정부의 검열대상이었다. 남자였던 마타르에게선 드러나지 않았던 성차별적 억압이 마지디의 글에서 전면에 드러나는 것 또한, 책을 단순히 읽는 사람의 입장에선 일종의 “깨알” 포인트이기도 했다.
문화로 보나 거리로 보나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의 거의 끝에 자리잡았다는 엄청난 간극이 있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에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각각 그 이유는 석유와 지정학적 지위로 서로 달랐지만, 2차 대전 이후 펼쳐진 냉전과 연장된 식민주의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집권한 정부도 독재를 일삼았는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도 독재를 했다는 것은 굳이 말해봐야 입이 아픈 사실이다. 그에 대항하던 수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불구가 되어 살아가거나 남산의 핏빛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반대자들의 아내와 아들딸들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각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편하게 마음을 둘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어찌할바를 모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억압의 무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무거웠지만 여성에겐 훨씬 더 무거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 책이 모두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디보다 마티르의 책이 더 흥미로웠다. 모르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리 알았던 내용이 있다면 영국의 (노동당 간부들을 비롯한) 고위층이 카다피의 독재를 못본 척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 정치인들의 산실인 명문대학 런던정경대에서 카다피 정부의 비자금으로 학술활동을 했다는 것 정도였다. 그 때도 미친 놈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부살람 학살 사건을 비롯해 독재정부가 해야할 것은 빼놓지 않고 다 했었던 카다피 정권의 맥락을 고려하니 정말 상종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자부하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선, 좌파가 저러고 다녔다는 게 너무 슬프고 짜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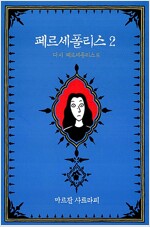
반면 이란에 관해선 예전에 비슷한 만화를 본 적이 있었다.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라는 만화다. 사트라피가 이란의 전통과 문화에 좀 더 우호적인 것 같긴 하지만(더 정확하게는 1세계 백인 페미니즘의 잣대로 이란을 보지 말라...는 정도였다), 어느 작가의 관점으로 보든 이란의 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마지디의 글은 내게 이란에 관한 어떤 대체불가능한 경전이 될 것 같다.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을 동원해 이란 사람들의 삶을 사트라피에 비해 좀 더 내밀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상투적인 말로 글을 마무리해볼까 한다. 소설이나 소설적 요소가 섞인 논픽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찾아읽을 생각도 잘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두 권을 그야말로 따로 나가는 독서모임이 아니었다면 출간이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종류의 책이었다. 게다가 읽었더니 (여러가지 의미에서) 재미있기까지 했다. 오랜만에 독서모임하는 재미 중 중요한 어떤 요소를 다시 깨닫게 된 계기랄까?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