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벽한 날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완벽한 날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완벽한 날들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 마음산책 / 2013년 2월
평점 :



자연, 사소한 전환이 모여 아름다움을 방출하는 <완벽한 날들 - 메리 올리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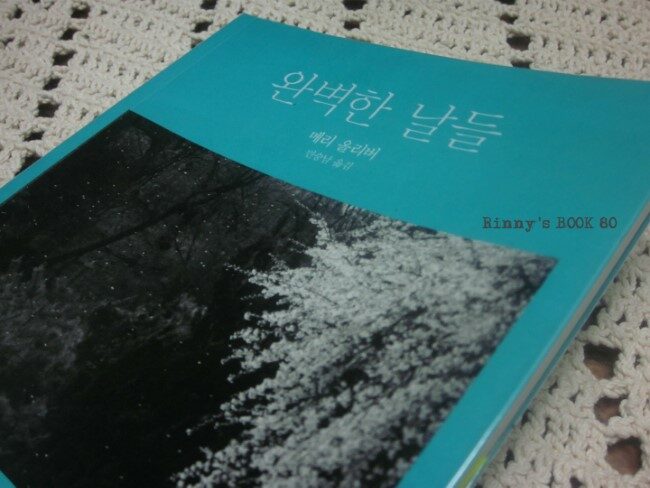

자연에 살고 싶은 꿈을 꾼다. 아니 어쩌면 자연에 이미 가깝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의 헌신으로(전에는 지나친 몰두로만 보였지만) 우리의 집, 아파트 1층의 정원이란 공간은 화초로 가득차 축복을 받은 채 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자연에 대한 애정을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낙원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때는 언제 올까? 사람들은 아마도 누구나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귀농을 권장하는 공익광고, 그리고 쏟아져나오는 힐링이란 주제와 자연주의적 삶. 그러나 이미 너무나 편리하고 기계적인 삶에 익숙해져버린 우리가 쉽게 그 환경을 버리고 반대의 생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갈 나를 상상해보면 역시 만만치 않은 함정들이 그려진다.
그렇지만 또다시 이러한 모든 함정을 팽개치고 자연에의 삶을 꿈꾸게 하는 책이 있다. 바로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 김연수의 소설에서 <기러기>라는 시가 인용된 적이 있는데, 이 시를 쓴 여류작가가 바로 메리 올리버라는 사람이고 이 책은 한국에서 출판된 그녀의 첫번째 책이다. (그녀는 이미 자국에서는 수십개의 작품을 펴냈고, 퓰리처상도 수상했다.)

김연수 작가가 마음 속 깊은 곳에 혼자만 소유하고 싶었던 메리 올리버의 글. 그녀는 '프로빈스 타운'에서 날마다 자연을 느끼며 찬양한 글들을 묶어 완벽한 날들을 펴냈다. 그녀는 빗소리를 듣고, 바다를 거닐고, 꽃들을 관찰하며, 열쇠구멍 속 거미에게 행운을 빌고, 흰 깃털을 달고 넘쳐흐르는 파도를 감상한다. 그녀에게 그러한 것들은 '경박함, 무관심, 정신과 마음의 부재 같은 못난 기분 상태를 지적해주는 '귀중한 동반자'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즉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자신이 추구하는 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워즈워스, 에머슨, 호손 같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녀가 보고 있는, 그녀가 속해있는 그 풍경, 매일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그 풍경을 내가 보는 것처럼 찬란하고 마음 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소한 전환과 일상적인 변화로 달라지는 마음의 방랑, 큰 것과 작은 것을 번갈아 좁았다 넓어지는 시야, 경외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을 글로만 가지기에는 아직 아쉽지만, 그녀의 감정이 오롯이 들어간 글에 '완벽한 날들'이란 제목만 보고서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을까. 벌레처럼 자그마한 것을 보는 것에 그러한 기쁨이 숨겨져있었을까. 한 줄, 한 줄 읽어나갈 수록 놀라움이 깊어지는 책이다.

- 낙원에도 규칙은 있어야 한다. 나는 그 규칙들이 신의 솜씨인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지 알지 못한다. 우연조차도 신의 뜻일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으론 그 규칙들이 우연의 산물일 것 같다. 훌륭하지도 깔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저 현실적인 정도이며 비생명보다 생명을 추구하기에, 숭고하다. 모든 생명력은 그것의 존재를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지닌다. 장식이나 환영처럼 보이는 것도 순수히 실용적이다. 생명력은 안개나 전기의 엔진에서 나오며 장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확신에 차 있다. 그리고 거대한 어깨를 지닌 바닷속 시련에 대비해 다산한다. (20p)
- 그는 늘 자연계의 빛과 고요를 사랑했지만 이제 세상의 괴력과 불가사의에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선 곳에 있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그 음모들에까지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 후로 워즈워스는 분명하고 균형잡힌 풍경을 이룬 응결체들과 기체들의 배열뿐만 아니라 회오리바람도 찬양하게 되었다. 세상의 미와 기묘함은 기운을 돋우는 상쾌함으로 우리의 눈을 채우는 한편 우리 가슴에 공포를 안겨주기도 한다. 세상의 한쪽에는 광휘가, 그 반대쪽에는 심연이 존재한다. (48p)
- 문제는, 삶에서든 글쓰기에 있어서든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독한 날씨는 이야기의 완벽한 원천이다. 폭풍우 때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한다. 어디론가 가야만 하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느낀다. 역경, 심지어 비극도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스승이 된다. 우리 모두 도전과 용맹을 찬양한다. 바람 없는 날 단풍나무들이 천개를 길게 드리우고 푸른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 때, 어느 향기로운 들판에서 불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된 바람이 살그머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인가? 너그러운 땅에 누워 편안히 쉬는 것이다. 그리고 잠이 들기 쉽상이다. (62p)
- 여리디여린 아침이여, 안녕./ 오늘 넌 내 가슴에/ 무얼 해줄까?/ 그리고 내 가슴은 얼마나 많은 꿀을 견디고/ 무너질까?
이건 사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 : 달팽이 한 마리가/ 격자 모양 잎들을/ 푸른 나팔 모양 꽃들을 기어오른다.
분명 온 세상 시계들은/ 요란하게 똑딱거리고 있을 거다./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달팽이는/ 창백한 뿔을 뻗어 이리저리 흔들며/
손가락만 한 몸으로 느릿느릿 나아간다/ 점액의 은빛 길을 남기며.
오, 여리디여린 아침이여, 내 어찌 이걸 깰까?
내 어찌 달팽이를, 꽃들을 떠날까?/ 내 어찌 내성적이고 야심 찬 삶을 이어갈까? (119p : 여리디여린 아침)

여러개의 글을 묶은 산문집이라 다소 어렵고 난해한 글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어려워도, 왠지 계속 읽고 싶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