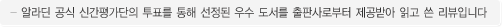[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김수영을 위하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김수영을 위하여 -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강신주 지음 / 천년의상상 / 2012년 4월
평점 :

절판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꿈꾸는 그 이름이 될 수 있을까?
김수영은 김수영이
되길 위한 시인이었다. 그는 또 구름의 파수병이 되길 바랐다. 자유롭게
고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들판의 민들레도, 가난한 아이의 눈물도, 그리고
시인이 서 있는 높은 산정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름. 김수영은 살아서 써 내려간 시 덕분에 죽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마음껏 의지하고 싶은 푸근하면서도 저릿한 구름이 되었다.
‘김수영을 위하여’는 철학자 강신주가 김수영을 사랑하며 열병을 앓고
열꽃을 피운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이다. 김수영이 풀이 눕는다고 하면 바람이 불어 풀이 눕는구나
했었고, 의자가 걸린다 하고 테이블도 걸린다 하면 참 피곤하겠다고 우리들은 멀찍이 놓고 생각할 것이다. 다행히도 시인이 쓴 시를 시답게 시처럼 읽도록 도와준 저자가 있었기에 풀이 눕는 것이 의자가 걸리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김수영이라는 한 시인의 인생과
그 시에 힘입어 제대로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이 만들어 주었다.
김수영을
읽으면, 몸이 금방 뜨거워진다. 뜨거워진 손은 또 김수영처럼
시를 쓰고 싶게 만든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벽’을 보면 된다. ‘벽’이란
한계점이다. 고치려야 고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숙명이다.’로 시작하는 산문 ‘벽(壁)’(1966)을 읽다 보면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나를 둘러싼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며, 그 생각의 부산물을 잘 다듬어 한 편의 절절한 글로 써내고 싶다. 읽으면, 자연스레 느끼게 되고, 말하게
되고, 글로 옮기고 싶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진 시인, 그가
바로 김수영이다.
김수영은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은 대중적이면서도
대중적이지 않고, 밀어내면서도 당긴다. 김수영에 대해 오래
전부터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김수영 시를 가끔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김수영의 정신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책은 한번쯤 읽어볼 만하다. 시인이기
이전에 거대한 흐름으로써 한 인간의 면모를 느낄 수 있고, 그의 일대기를 시와 함께 흡수하며 지금 자신이
고뇌하고 있는 삶과 세상의 의문들에 대해 답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리라. 다만, 결코 이 책에 담긴 사색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심호흡 한 번 제대로 하고 맞이해야 할 테다. 그리고 책장을 덮을 때는 자신이 꿈꾸는 이름에 가까워 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다. 요즘 한창 물이 올라 뿜어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시인이 되고 싶어하고, 철학가를
꿈꾸고, 행동하는 사회인을 자처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써내는 짤막한 글 곳곳에 생각을 담고, 생각에 힘을 주고, 리듬을
살린 흔적을 자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1967년에
이런 세계를 예상했을까? 다음의 글을 보고 문득 떠올려 본 것이다.
서구의
어느 비평가가 말했듯이 앞으로 먼 후일에는 모든 세계의 인류가 시를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오. 또한
헤세가 그의 시에서 읊고 있듯이, 시가 필요하지 않은 낙원이 도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착한 시인의 생활을
하고 오늘날의 시가 무효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오.
- <문단추천제 폐지론>(1967.2)
물론
이 글을 쓴 배경과 내가 짚어낸 상황이 맥락은 다르지만, 이렇듯 이 책의 김수영의 글을 현실에 맞춰보며
상상력의 재료로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 김수영은 시인을 꺼리는 시대,
목소리를 가려야 하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목소리를 쏟아내지만, 그것이 진정 소통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김수영이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면 너무 슬픈 것 아닌가? 이모저모 의문도 품어가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내 영혼의 속살들을 훔쳐볼 수 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된다.
그렇다. 이 책은 철저히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나직이 반성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어쩌면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언제든 그러하지 않았나. 늘 반성하고, 그보다 더 많이 겸손해지려는 것도 습관이니까. 그런 습관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이 책을 펴 들고 각자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 치길 바란다. 단, 한가지 마지막까지 김수영 그와 공유해야 할 것은 ‘자유’리라. “두려움 사이에서도
자유를 잊지 말고 슬픔 속에서도 환희를 잊지 말고” 고뇌하는 노인이 두 손을 주먹 쥐고 얼굴을 가린
채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과 함께 제시된 이 문장이 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우린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김수영을
만난 저자의 에필로그와 또 김수영을 만난 편집자의 글도 일품이다. 그것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우린
모두 허기를 느낄 테다. 나도 내 삶에 오롯이 기대고 내 목소리로 인생을 쓰고 싶은 허기를. 이제는 그 허기를 채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