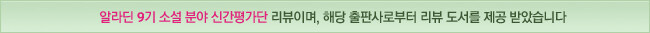[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 여백(여백미디어)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자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지. 매일과 똑같은 일상임은 분명한데 가족이, 친숙하게 사용하던 물건들이, 주변인들이, 그리고 나 자신조차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 그냥 견딘다. 묵묵히 하던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견뎌낸다. 그게...... 나다.
그런데,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속 K는 그렇지 않은가보다. 처음 그의 여행은 감쪽같이 사라진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낯선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어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 낯설다와 낯익다.. 두 단어의 발음은 비슷할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반대이다. 내게 익숙한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매일 바라보던 것이라도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것인데도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K처럼 모든 것이 뒤바뀐 듯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K는 자신이 온종일 겪은 낯익은 사물과의 익숙함과 낯선 사물과의 이질감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식이 자신을 불안케 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깨달았다. "...122p
나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낯설게 느껴지는가 하면, 처음 보는 것이 분명할 사람들은 내가 아는 누군가와 꼭 닮아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는 K가 있다. 그렇다면 K는 누군인가. 이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다가간다. 익숙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행동을 하는 나는 분명 나인데 어느 순간 무언가 낯설게 느껴지면 그건 내가 아닐 것인가. 나는 그냥 참고 견디는 성격이므로 K처럼 K1을 찾아나서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소설을 이해하는 건 여기까지다. 낯익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음을 공감하는 것.
소설은 은유로 가득하다. 파워레인저와 세일러문이 등장하고 모든 것들이 양면이 존재함을 뜻하는 야누스와 뫼비우스의 띠가 등장한다. K1과 K2의 합체는 K의 남겨진 인생을 위해서도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지진과 수많은 이별 등 마지막 장면은 도통 나로선 이해불가능이었다. 사실 어쩌면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이고 가장 중요한 뜻을 담았을지는 몰라도. 최인호님의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데... 내겐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