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과학>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문/사회/과학> 파트의 주목 신간을 본 페이퍼에 먼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변함 없이 바쁜, 혹은 바쁜 척 하는 가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최재천, 장대익, 이라는 지은이가 눈에 크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에서부터 최재천, 그리고 최재천의 제자인 장대익 교수.. 좀 비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히 말하건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사제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에드워드 윌슨과 최재천 교수는 개미연구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 본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하여 사회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최재천 교수도 마찬가지로 '개미제국의 발견' 과 같은 저작에서 스승의 논의를 조금씩 가져오기도 합니다. 장대익 교수의 경우 '다윈의 식탁' 과 같은 책을 통하여 대중들이 진화론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해오고 있지요. 이 책은 인문계열과 과학계열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은 분야인 사회생물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입문서가 되어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는 백과사전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책에 끌리게 됩니다. 사실 집에는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가 있고, 미처 그 책도 다 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이런 철학의 흐름에 대하여 다룬 책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상학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조주의로 흐르는 거대한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차례를 잘 보면 보통 비평한다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롤랑 바르트라던가 발터 벤야민, 게오르그 루카치 등의 익숙한 이름들도 보이는군요. 표지가 읽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한 번쯤 흐름을 정리해보면 '논객(?)' 들이 쓰는 벤야민이라던가 루카치 등 준거틀들을 좀 더 잘 이해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논객들의 단순한 준거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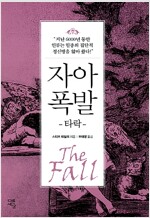
이 책의 부제는 타락인데, 이는 책의 제목인 자아폭발과 그 타락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제목을 보았을때는 이 책이 어떤 자아폭발이라는 현상에 대한 연작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만 저자들은 저와는 생각이 다른지 자아폭발이라는 것을 이미 타락이라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수많은 인류의 문제들의 원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사실 이렇게 미리 규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결론은 어느 정도 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아폭발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는 반성을 안하고 있다. 이제 이 자아를 초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렇게 추천 도서로 올리는 이유는 인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그리고 변화되어온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료로 어떻게 뒷받침되는가, 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증명되지 못하는 가설은 끝내 가설로 남는 법이지요. 내용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수많은 고증 자료를 찾아서 그들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저자들의 노력은 높이 사줄 만 합니다. 물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있는지는 직접 책을 읽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최근에 루소에 관한 평전을 한 권 읽고 다윈에 관한 평전을 읽었습니다. 다윈에 관한 평전은 1500쪽이 넘는 책이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읽었었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 관한 책들은 저를 매료시킵니다. 어쩌면 그것의 기반에는 타인의 삶을 엿본다는 그런..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제가 소설을 읽으며 쾌감을 느끼는 것과도 일맥상통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단 한 권의 책으로 여섯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있다면 6명을 500쪽 남짓에 다루는 터라 개개인에게 사실 별로 많은 페이지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사실 저 인물들 면면은 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라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여섯 명, 루터, 괴테, 훔볼트, 베토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은 몇 번이고 다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최근에 루소에 관한 평전을 한 권 읽고 다윈에 관한 평전을 읽었습니다. 다윈에 관한 평전은 1500쪽이 넘는 책이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읽었었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 관한 책들은 저를 매료시킵니다. 어쩌면 그것의 기반에는 타인의 삶을 엿본다는 그런.. 비밀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제가 소설을 읽으며 쾌감을 느끼는 것과도 일맥상통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단 한 권의 책으로 여섯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있다면 6명을 500쪽 남짓에 다루는 터라 개개인에게 사실 별로 많은 페이지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사실 저 인물들 면면은 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라는 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여섯 명, 루터, 괴테, 훔볼트, 베토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은 몇 번이고 다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중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중국역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앞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춘추전국시대가 바로 그것인데, 물론 그 전국시대에서도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었었지만 그들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내왔었지요. 그런데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어쩌면 통일된 진나라는 진시황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면 마치 이 나라를 세운 사람도 나이지만, 이 나라를 붕괴시킬수 있는 사람도 나다, 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거장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하나 빚어내고는 죽음에 이르러 부수는 것 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그런 뜻에서 이 책은 엄밀히 따지면 진나라 이야기, 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제를 만들었으나 불사에 대한 욕망에 빠져 이윽고 모두를 멸망시킨 그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중국역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앞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춘추전국시대가 바로 그것인데, 물론 그 전국시대에서도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었었지만 그들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내왔었지요. 그런데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어쩌면 통일된 진나라는 진시황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면 마치 이 나라를 세운 사람도 나이지만, 이 나라를 붕괴시킬수 있는 사람도 나다, 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거장이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하나 빚어내고는 죽음에 이르러 부수는 것 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그런 뜻에서 이 책은 엄밀히 따지면 진나라 이야기, 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제를 만들었으나 불사에 대한 욕망에 빠져 이윽고 모두를 멸망시킨 그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으아... 책만 읽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