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 평범한 나날을 깨워줄 64가지 천재들의 몽상
김옥 글.그림 / arte(아르테) / 2016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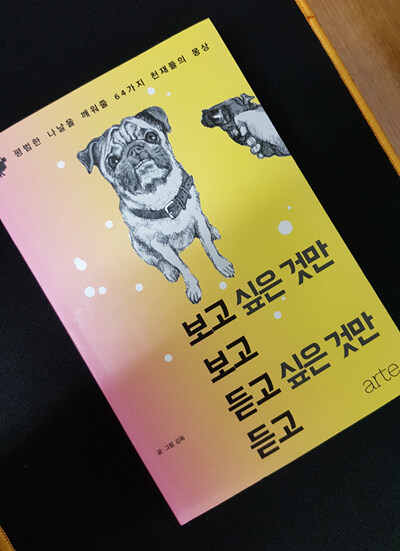
요새야 뜸하지만 어렸을 땐 헌책방 쏘다는 게 큰 기쁨이었다. 막 독서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신간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헌책방은 이전 세대에 나온 책과 만나는 설레이는 데이트 공간이었다. 그리고 책을 고르다보면 자주 밑줄이 그어져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단상을 책의 여백에 정성껏 기록해둔 글귀들도. 그러면 나는 깨끗한 새책보다는 기꺼이 그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메모가 된 책을 고른다. 깨끗한 새책이라면 느끼지 못할 연대감이랄까, 어떤 종류의 동류의식을 메모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젠가 청하에서 나온 니체의 <선악의 피안>을 중고로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자를 대고 그은 밑줄과 단정한 글씨로 적은 단상이 있었다. 난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라면 무심코 그냥 치나쳤을 대목을,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이유로 되풀이 읽곤 하였다. 그리고 내가 놓칠 뻔한 중요한 착상을 그 단정한 밑줄에서 발견하곤 했다. 즉, 내게는 책의 이전 소유자가 꽤나 까탈스러운 선배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아니면 멋진 소개팅 상대이거나.
약간 맥락이 다르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서 책이나 영화에 대한 감상을 담은 에세이집을 좋아하는 편이다. <내가 읽은 책(혹은 영화)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을까(보았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보고 싶은 작품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덕은 타인의 감상에서 따뜻한 연대감과 함께 배움을 얻는 것이리라. 어제 읽은 김옥 작가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도 그러한 발견의 기쁨을 주는 에세이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으면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 하고 동질감을 느낀다.
‘그녀’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 그녀, 그남, 그녀. ‘그 여자’를 가리키고 싶은 나는 갑자기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머뭇거려진다. 나의 머릿속은 ‘그녀’를 먼저 떠올리지만, 문득 불편한 무엇과 마주치게 된다. 나는 ‘그 남자’를 ‘그남’이라고 사용하지는 않는다.(p.90) 이건 영화 <어톤먼트>에서 세실리아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인칭대명사에 있어 성차를 얘기하는 대목인데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기에 어떤 종류의 부드러운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런 대목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왜 여자 어린이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까? 사춘기 이전의 여자 어린이는 젖가슴이 발달하지 않아 굳이 가슴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지. 만약 남자도 평소 브래지어를 입거나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왔다면 어떨까? 남자의 상반신 누드는 아주 야해 보이지 않을까? (p.204) 이건 모델 프레야 베하의 사진에 대한 글에서 등장한다. 나 역시 왜 여자 어린이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지 궁금해한 적 있다. 나는, 이를 성차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켜 생각하지 않았는데 작가의 단상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처럼 작가는 자주 여성의 시각에서 예술의 프리즘을 통해 사회에 내재된 성의식을 들여다본다. 말했다시키 남성인 나는 그런 시각에서 배움을 얻는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자면 이런 거다. 작가는 ‘여성의 게이 사랑이 문화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들 간의 동성애에 매료되는 이유는 뭘까?’(p.225)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곧 나의 질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에 대한 답을 메튜 본의 발레 <백조의 호수> 대한 단상을 통해 찾는다. (메튜 본은 동성애 코드를 활용한 현대극으로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 했다고 하는데 기회되면 보고 싶다.)
‘만약 그들이 모두 남성이 된다면? 감정이입한 여성들은 어느새 왕자가 되고, 백조가 되고, 흑조가 된다. 잘생긴 왕자를 사랑하고, 고결한 남자 백조를 사랑하고, 나쁜 남자 흑조를 사랑할 수 있다. 발레 무대에서는 세 남성 간의 사랑이지만 그들을 어떤 여자에게도 빼앗기지 않음으로, 나의 남자들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p.229) 이게 작가의 잠정적인 답인데 나름대로 여성들이 BL에 빠지는 이유를 진단하고 있다. 나로서는 꽤나 수긍이 가는 결론이었다.
이처럼 이 책은 영화, 소설, 미술, 사진, 발레, 그리고 인형과 같은 오브제 등에 걸쳐 여성이 예술과 사회를 대하는 시선을 일러스트와 더불어 보여준다. 그런 그렇고 몇 군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옮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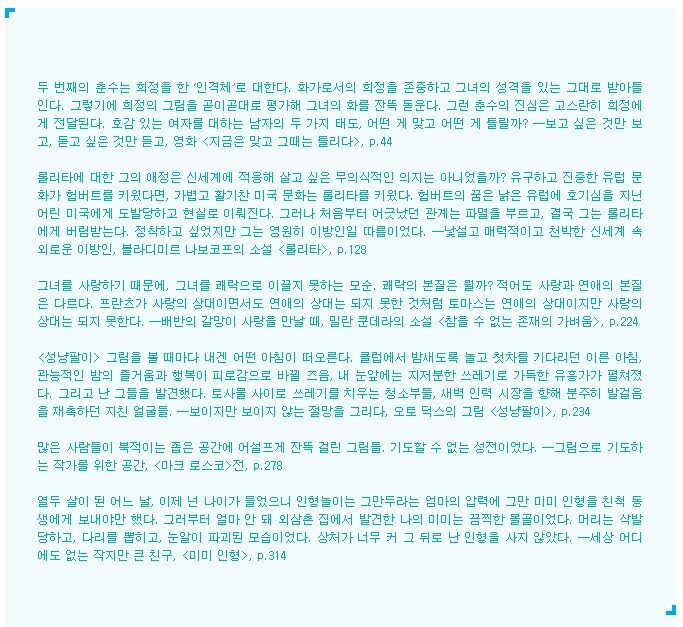
Post Script
1.
앞서 말했다시피 이 책에는 많은 예술작품이 등장한다. 특히 영화의 경우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도 생소한 작품들이 등장하여 깜짝 놀랐다. 다만, 작품의 표기에 있어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재판을 찍게 되면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화 <귀여운 반항아>의 원제로 적힌 <L’dffrontee>는 <L’dffrontée> 오타이다. 좀 더 까탈스러운 지적을 하자면 독일권 작가인 오토 딕스의 <성냥팔이>는 <The Match Seller>라는 영문보다는 원어인 <Der Streichholzhändler>로 표기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더불어 오토 딕스의 생몰연도(1981-1969→1891-1969)에도 오타가 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불어판 번역제목인 <L'Insoutenable légèreté de l'être> 보다는 체코어<Nesnesitelná lehkost bytí>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의 원제가 불어로 알려진 것은, 1984년 번역서가 원서보다도 먼저 프랑스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체코어 원서는 프랑스판보다 1년인가 후에 출판)
2.
영화나 책에 대한 에세이집을 읽다보면 항상 부딪치는 문제인데, 작품의 반전을 드러내는 스포일러는 미리 주의를 주거나 살짝 비틀었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이 책에는 SF영화 <로건의 탈출>이 등장하는데(내가 무척 좋아하는 작품이 소개되어서 반가웠다) 이 작품의 중요한 반전이 책속에 그대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영화의 이 반전은 마치 <식스 센스>처럼 노출되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데 만약 이 책을 읽고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좀 실망할 수 있을 터다. (음, 이렇게 적고 보니, 반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호소력 있는 에세이를 쓰기 어렵겠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반전을 숨기자니 글이 추상적이 될 테고 그렇다고 그대로 노출해버리면 나중에 작품을 찾아 보는 재미가 덜어진다. 글의 서두쯤에서 <나중에 작품을 찾아볼 의향이 있는 분은 이 꼭지를 건너뛰시오>라고 경고문이라도 적어두는 게 최선일까? 딜레마다.)
3.
이 책을 읽는 재미 중의 하나가 작품을 소개하는 소제목이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를 소개하면서 <어린 미국에 정착하고 싶었던 늙은 유럽>이란 소타이틀을 달았는데 작품의 핵심을 짚어내는, 정말 재치 있는 소개였다. 더불어 (당연하겠지만) 원작을 재해석하는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기쁨도 크다. 예를 들어, 오토 딕스의 <성냥팔이>를 작가가 다시 그린 일러스트나(p.232) 사진 작품의 일러스트는 이 책을 보는 기쁨을 배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