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리소설로 철학하기 - 에드거 앨런 포에서 정유정까지
백휴 지음 / 나비클럽 / 2024년 1월
평점 :




문학에서 장르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장르문학이라는 이름이 가진 뉘앙스는 시간 때우기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문학성이 없는 문학이라는 게 흔히들 하는 생각이다.
나에게 추리소설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셜록 홈즈와 애거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이다.
셜록 홈즈를 좋아했고,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읽어왔기에 나에게는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책을 다시 손에 잡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장르문학을 통해서다.
판타지와 스릴러를 섭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때우기를 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채워진 나름의 무게가 느껴지는 와중에 있었다.
나는 장르문학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 <추리소설로 철학하기>를 보자마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내 마음 한편에서 불편하게 자리 잡았던 장르문학에 대한 홀대에 쐐기를 박아 줄 책이라는 나름의 믿음으로 겁도 없이 읽어갔다.
철학을 전공한 추리소설 작가.
이 타이틀이 이 책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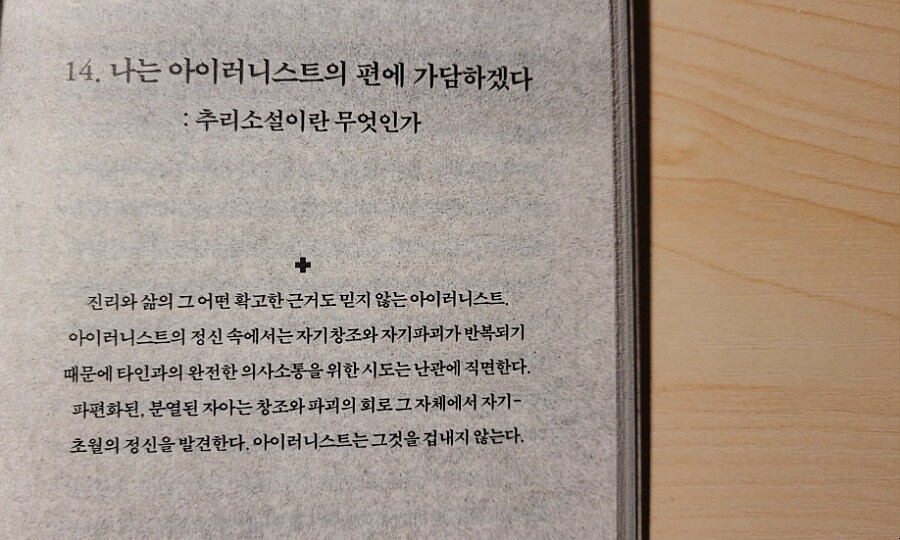
이 책은 추리소설 작가와 철학자를 한 팀으로 묶어 이야기한다.
이 생소한 작업이 아주 찰떡같은 궁합을 보인다.
철학에 철자도 모르지만 내가 즐겨 읽는 추리소설에 담긴 철학적 사유와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
이미 읽은 이야기들은 다르게 느껴지고, 아직 못 읽은 책들은 비교하며 읽어 보고 싶어진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밀실은, 분열된 자아들이 서로 다투는 투쟁의 장이자 의미가 동결된(투쟁의 결과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혹은 임계점으로서의 자기의식의 회색 지대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기본 정서는 노스탤지어 nostalgia다. 누가 뭐래도 마음이 과거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이다. 노년의 인간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보편적 정서지만 크리스티의 경우 개인에게 국한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녀가 속해 있던 영국 부르주아 문화 전체가 노쇠 현상을 겪는 가운데, 예외 없이 그녀의 작품에서도 한없이 뒤를 돌아보는 듯한 만년의 쓸쓸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르헤스를 추리소설가로만 보는 것도 어리석지만, 추리소설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더 어리석은 평가다. 어쩌면 올곧이 포의 유지를 받든 이가 보르헤스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추리소설 작품이 예시로 담겨 있어서 철학의 무게를 덜어준다.
동서양의 추리소설 작가와 철학자를 이어준 기획이 매력 있다.
없다고 생각했던 추리소설의 깊이를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야 할까?
지금 <장미의 이름>을 읽고 있는 중인데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을 쓴 이유가 21세기는 추리소설의 시대라고 생각하며 크리스테바와 각자 추리소설을 써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 쓴 작품이라고 한다.
에코와 크리스테바 둘 다 사상가인데 추리소설을 썼다.
추리소설을 가벼운 읽을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추리소설 따위나 읽고 있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
당신들이 모르는 추리소설엔 이렇게 다양한 철학이 담겨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올해는 가지고 있는 책을 읽겠다 다짐하고 책 쇼핑을 줄이기로 다짐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책들 중에 읽어 보지 못한 작가나 책들의 목록이 자꾸 추가되어 마음만 바쁘게 만든다.
빠르게 읽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책이다.
천천히 공부하듯이 읽어 가면서 읽은 책들에 담겨 있었던 철학적 사고를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거 같다.
추리소설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에게 추리소설에 담긴 철학적 사유를 알려줄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