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
웬디 미첼 지음, 조진경 옮김 / 문예춘추사 / 2022년 10월
평점 :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치매가 우리의 먹는 방법은 물론 먹는 음식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저자는 영국국민의료보험에서 비임상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58세에 조기 발병 치매를 진단받았다.
이 책은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현상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정말 없다는 생각을 한 그가 자신의 경험을 적음으로써 이 병에 대한 자료와 자신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쓴 책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겨우 '기억을 잃어가는 것' 밖에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외에는 치매가 어떤 병이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치매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걸까?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그 경중이 다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나 자신이나 내 주변에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면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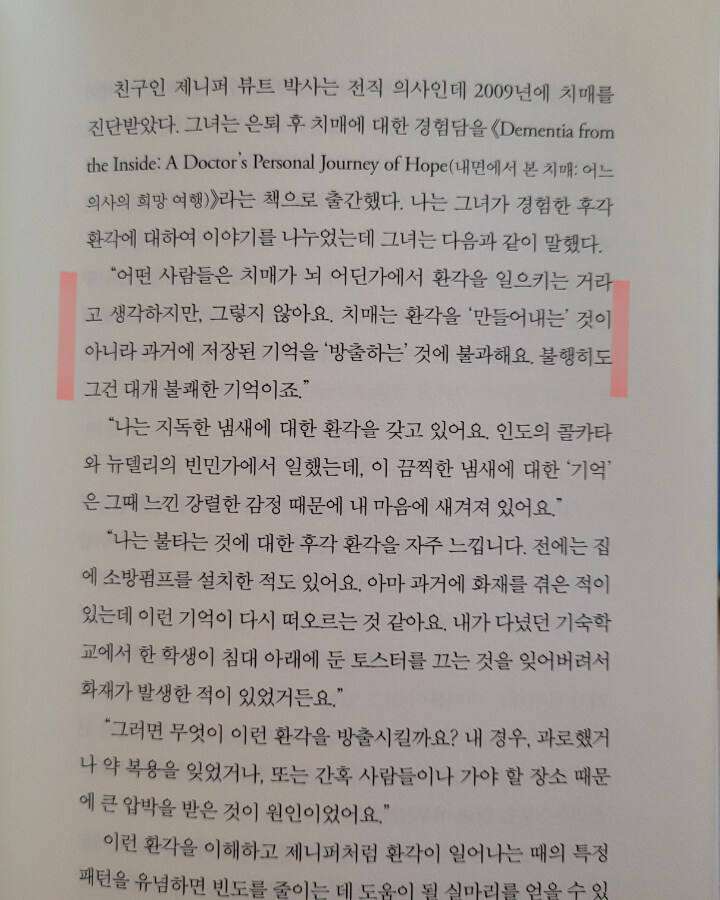
환자의 눈은 예전처럼 음식을 갈망하지도 않는다. 음식과 접시의 색깔 대조가 뚜렷해야 접시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치매 환자는 '맛'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음식이 맛없는지 맛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흰 그릇에 음식이 놓여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색이 들어간 접시를 선택했다.
음식과 접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릇도 편편한 접시보다는 오목한 접시를 선택했다.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기 위해서다.
치매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것이 치매의 증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환자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말할 때, 그 순간 그에게는 정말 냄새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모두를 위해 치매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치매에 걸리면 눈은 환각을 본다.
그것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순간의 기억이 다르기에 무언가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거나 한다면 그건 그의 뇌가 기억의 어느 부분을 소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친구 중에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수없이 '뱀'을 잡았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방에 자꾸 '뱀'이 있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매일 뱀을 잡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는 친구의 말이 이 책을 읽으며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아마도 그녀의 시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뱀과 마주친 순간이었나 보다.
그녀의 뇌는 자꾸 그 상황을 복기하고 그녀를 계속 두려움에 떨게 했다.
나한테 늘 더 필요한 한 가지는 시간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나쁜 말은 '빨리 해'다. 이 두 마디를 들으면 돌연 공포와 혼란, 실패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다. 내 속도에 맞게 하면 된다.
치매에 걸리고 나서 맛을 잊어버리고, 과거가 눈앞에서 재생되며,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
소리에 민감해서 보통 때라면 그저 스치고 지나칠 백색 소음조차 증폭되어 들려서 신경을 괴롭힌다고 한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리기에 예민해지고,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에 '또 시작했군' 이라고 생각하며 환자를 진정시키려고만 할 뿐이다.
저자는 혼자서 생활한다.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요리를 하는 대신 간편 요리를 사서 쟁여 놓고 먹는다.
먹는다기보다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따름이다. 늘 똑같은 음식을 한 달 내내 먹어도 치매 환자에게는 늘 새로운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서글프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다.
치매 환자는 현실을 산다는 저자의 말이 참 심오하게 들린다.
지금 현재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충실한 삶.
저자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도 병증이 더 심해지면 그녀는 더 많은 걸 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하루는 늘 새로울 것이다.
치매란
인간이 과거로 회귀하는 과정인 거 같다.
예전에 스핑크스가 자신을 통과 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다.
"아침에는 네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무엇이냐?"
나이 들면 점점 어린애로 변한다고 한 옛말은 치매의 옛 버전이 아닐까?
저자가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치매를 말하는 좋은 예가 되는 거 같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치매 환자의 시간도 거꾸로 흐른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치매가 나에겐 두려움을 주는 병중에 하나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병에는 그것을 극복해 내는 사람들이 있다.
치매라는 병에는 치료 약도 회복될 경우도 지금은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저자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조건 병에 걸렸다고 억압하거나, 무조건 일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같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많은 돌봄이 필요할 거 같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치매'에 대해서만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해야겠다.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은 얼마 전 읽은 <돌봄이 돌보는 세계>와도 맥락이 닿는 책이다.
우리 사회는 돌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비해야 할 거 같다.
이 책의 저자처럼 치매에 걸렸어도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위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짐스러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품앗이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정말 좋겠다..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읽어봐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