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하우스
피터 메이 지음, 하현길 옮김 / 비채 / 2022년 7월
평점 :




뭔가를 죽이는 일은 처음이 힘들지,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 뒤는 한결 수월해지는 법이다.
한 달 전 뺑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핀 매클라우드 형사.
그에게 루이스 섬에서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그가 맡고 있던 에든버러의 살인사건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 조사해 보라는 홈스 컴퓨터의 지시가 그를 다시 고향인 루이스 섬에 발을 디디게 한다.
18년 동안 떠나 있던 곳.
죽은 자는 언제나 주먹질로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던 에인절이었다.
섬에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그 사람은 천장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방이 비록 크진 않지만, 서 있는 자세로 봐서 2미터 40센티미터는 족히 넘어 보여다. 다리가 굉장히 길었고, 바짓단은 검은색 부츠 안쪽으로 말려들어가 있었다. 체크무늬 셔츠의 끝자락은 허리띠를 두른 바지에 집어넣고, 그 위로 모자 달린 파카를 걸친 채였다.
본토와 떨어져 다른 언어인 '게일어'를 사용하는 루이스 섬.
그곳엔 매년 구가 사냥이 벌어진다. 일종의 성인식이자 통과의례였다.
갓 태어난 새나 다 자란 새는 잡으면 안 되고 그 중간의 새들을 잡는다.
2천 마리의 중간 새들이 인간의 "입맛"을 위해 도살되는 "구가 사냥"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블랙하우스는 자연석으로 벽을 세우고 짚으로 지붕을 이은 전통적인 가옥 형태였다. 사람의 거처는 물론 축사 역할도 했다.
토탄으로 인해 검게 그을린 집들.
그래서 루이스 섬의 집들을 블랙하우스라고 부른다.
다시 찾은 고향은 핀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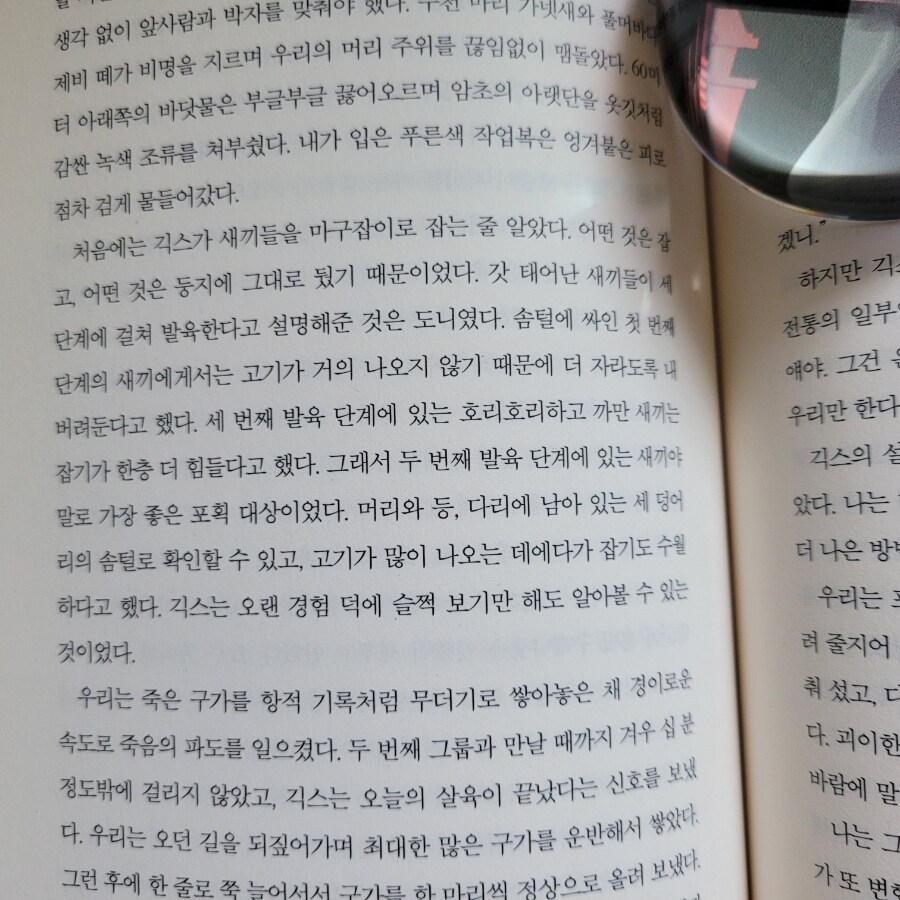
처음 만나는 스코틀랜드 작가 피터 메이.
탄탄한 글이 쉼 없이 조여오는 블랙하우스는 읽는 내내 루이스 섬의 따스함과 서늘함이 공존하는 작품이었다.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고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삶의 방식이 육지와는 또 다른 매력과 함께 답답함을 동반한다.
섬이라서 그곳의 삶은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그들만의 언어로 된 공동체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비틀어진 삶을 이어갔다.
고립된 지역에서 드넓은 세상으로 탈출한 사람과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인 사람.
한없이 사랑했지만 보상받지 못한 사람.
수없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친구였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
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엔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다.
처벌과 침묵.
많은 작품들 속에서 만났던 섬사람들의 행위보다 점잖은 루이스 섬의 처벌과 침묵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핀을 이곳으로 부른 범죄는 그렇지 못했다.
더위 속에서 나는 루이스 섬에 몰아치는 비바람을 느꼈고
새들의 비명을 들었으며
수많은 새들의 시체와 마주했고
묻지 못한 비밀과 대면했다.
피터 메이가 잘 숨겨 논 비밀이 까발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책장을 앞으로 넘겼다.
어딘가에서 놓친 복선을 찾느라...
섬에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 내는 것은 작가의 필력에 있다.
피터 메이는 그 필력을 지닌 작가다.
블랙하우스는 넓은 시야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를 교차 시키면서 범인을 추적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범인을 잡는 것에 몰입하지 않는다.
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살인자일까? 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 중요한 이야기다.
루이스 섬 3부작의 서막 블랙하우스.
쫄깃한 이야기에 반해서 나머지 시리즈를 기다리는 마음이 설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