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
와타야 리사 지음, 최고은 옮김 / 비채 / 2022년 4월
평점 :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어.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 동경하던 선배를 대학생이 된 후에 만나 사랑에 빠진 아이.
소우와 함께 여행지에서 만난 소우의 친구 커플.
놀랍게도 남친의 친구 애인은 유명한 연예인이었다.
동성 친구 하나 없을 거 같은 냉정 맞은 사이카.
어색한 분위기를 살려보려 친근하게 대했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아이.
그러나 그 도도하고 냉정 맞은 사이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우에게 청혼까지 받은 상황에서 아이는 사이카의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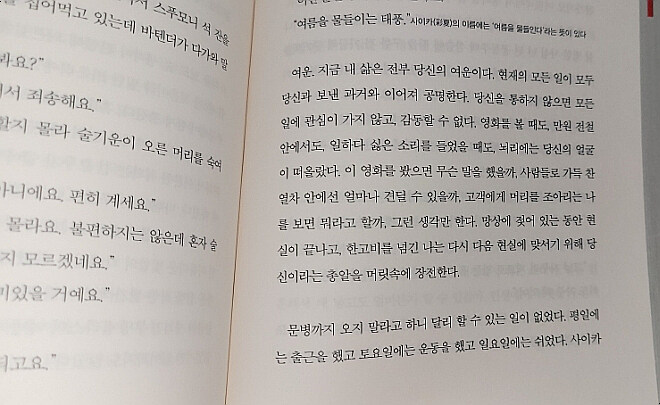
몇 년 전 그해, 여름 손님(Call me by your name) 이라는 안드레 애치먼의 소설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는 그에 버금가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섬세한 감정의 흐름과 세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가려는 그녀들의 노력이 참 예쁘고 단단하다는 느낌이 든 이야기였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도 이렇게 지고지순할 수 있을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저돌적으로 아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이카.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아이는 절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이카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린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것도 잠시 누군가 두 사람의 모습을 찍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순간이 온다.
사이카의 소속사에서는 간신히 보도를 막고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고 한다. 잠시만. 잠잠해질 때까지. 사이카가 정상에 올라 자신들이 투자한 것을 회수할 때까지. 순진하게 그 약속을 믿고 사이카의 장래를 위해 헤어지기를 결심한 아이.
사랑은 그렇게 나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법이다.
이런 건 절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안전지대에 있을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 만큼 삶은 평화롭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하나의 경계선이 사라지려는 것뿐인데 나는 이토록 불안정했다. 설령 자신이 그은 선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잣대 앞에서 굴복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을까?
사회적 잣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커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수위 높은 장면들 앞에서 뭔가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든 것은 나 역시도 선이 그어진 사람이라서일까?
궁금했었다.
퀴어 소설에서도 왠지 남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았으니까.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를 읽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그저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지탄받아야 하는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랑의 행위는 어째서 남녀 간에만 허락되는 걸까?
그건 누가 정한 걸까?
사랑의 행위는 그저 사랑한다는 몸짓일 뿐이다. 그것을 성별로 나누면 금기가 될 뿐.
어느 대목에서도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었으니 내가 열린 사람인 걸까, 아니면 작가의 필력이 좋았던 걸까?
사이카와 아이의 사랑을 반대할 이유가 나는 없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사랑받았다면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도 사랑받아야 하니까.
처음 여성과 사귀면서 알게 된 건, 여성과의 연애는 남성과의 연애에 비해 순도가 높고 불순물이 적다는 것이었다.
작가의 필력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깔끔한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관한 이야기였다.
쉽게 불타오른 만큼 쉽게 꺼져버릴 줄 알았지만 그 불씨는 누군가의 가슴속에서는 은은한 불꽃이 되어 살아 있었고,
누군가의 가슴속에서는 재가 되어 꺼져가는 불씨처럼 몸이 사그라 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타인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었다. 강제로 문이 닫힌 뒤로는 계속되지도, 변화하지도 않았기에 사랑의 절정, 그 완벽한 상태로 몇 년이고 보존됐던 거겠지.
사랑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기에 가장 빛나는 추억 삼아 몇 번이고 기억의 서랍에서 꺼내 왜 끝나버린 걸까, 안타까워하며 음미할 수 있었다.
와타야 리사의 작품은 처음인데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이라는 소설 제목은 기꺼이 기억하고 있다.
문장의 흐름이 섬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필력이 있는 거 같다.
처음부터 내내 좋아했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책을 읽는 동안 서서히 내게 스며들었다.
어쩜 어떤 경계에 서 있다가 이 책으로 인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다고나 할까.
경계를 넘는 사랑은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는 변명으로 자기 사랑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