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제니 오델 지음, 김하현 옮김 / 필로우 / 2021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것이 휴대폰 밖의 우연과 방해, 뜻밖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계론적 세계관이 없애려 하는 '비작동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휴대폰은 하나의 작지만 큰 세상이자 나를 어디든 데려다줄 수 있고,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현실의 초라한 나조차도 휴대폰 안에 있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좀 더 편한 업무 환경 속에서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주는 거 같으면서도 사람을 더 옥죄고 있다.
문명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24시간 영업.
메신저와 메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직장의 연장선이 되고
일을 꼭 회사에서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운 출근 규정은 오히려 쉬는 시간을 없애 버리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왠지 디지털 조삼모사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고도로 발달한 기업 문화와 광활한 산맥 사이에 사는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눈앞에서 실제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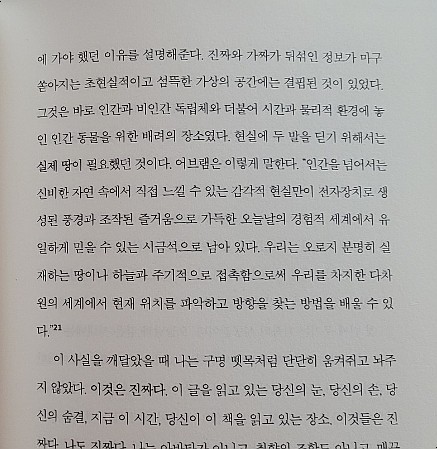
빨라지고 바빠지는 세상
e-편리한 세상은 e- 살벌한 세상이 되었다.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
잠들기 전 잠시만 보자고 한 유튜브는 보다 보면 날 새는 광경을 같이 보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랑님과 연해할 때 스마트폰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둘 다 2G폰을 쓰고 있었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보면 그가 커피 두 잔을 손에 들고 있거나 내가 오는 방향을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싱글싱글 웃었다.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날은 그가 전화기를 바꿨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약속 장소로 가던 나는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랑님을 보았다.
기쁜 마음으로 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손에 든 무언가를 보며 길을 걷고 있었다. 바야흐로 디지털 유목민이 된 인간을 보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유목민은 집에서도 유목민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나 역시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는 그 자그마한 사각형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적은 거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목만 보고도 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현타가 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생산성을 거부하고 멈춰 서서 귀 기울인다는 의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종적. 환경적. 경제적 불평등을 찾아내고 실질적 변화를 불러오는 적극적 듣기를 수반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재교육 장치로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각들을 되찾게 된다.
그것들은 비대면의 세상인 온라인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상대방의 몸짓이나 말투, 행동, 눈빛, 표정 등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신호들이 함께 한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 느끼면서 상대를 파악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쉬지 못하는 인간은 바쁘게 살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단순히 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쉼을 통해 잊고 있었던 감각들을 일깨우고, 무관심했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소홀했던 문제들에 시선을 두라는 의미다.
한때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창으로 보이는 바깥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의 사각형만을 바라보며 살아서 다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저 사각형 밖에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다운 법을 잊고 산 거 같다.
인간은 기계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느끼며 사는 동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생산적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목표로 살고 있다.
이제 디지털 옷을 잠시 벗고
나 자신과 내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기계 속에 묻혀서 기계의 무덤 속 하나의 부품이 될지도 모른다.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생각해 내자.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당신의 결핍이, 공허가, 있는 줄도 몰랐던 감각이 채워질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땐 '밤'이 되면 모두가 집에 있었다.
지금은 모두가 집에 없고, 집에 있어도 다른 세상을 산다.
내가 어렸을 때의 그 '밤'들이 그리워졌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시절의 '쉼'이 그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