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책] 엔젤스 플라이트 : 해리 보슈 시리즈 6 ㅣ RHK 해리 보슈 시리즈 6
마이클 코넬리 지음, 한정아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9년 11월
평점 :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 옛 친구,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해리 보슈 시리즈를 한 권씩 쌓아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마이클 코넬리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된다.
범죄 담당 기자였으니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다.
촘촘하게 엮이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어느 한순간 맥락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부상해간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야기의 탑이 쌓여 갈수록 그 어떤 범죄소설에서도 느낄 수 없는 현실이 보슈의 이야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90년대 LA폭동과 OJ심슨 사건이 있었던 시점에서 얼만 안된 시기에 인권 변호사이자 경찰 상대 소송 변호사인 하워드 일라이어스의 시체가 발견된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철도 엔젤스 플라이트다.
당직도 아니고, 담당구역도 아닌데 어빙의 명령으로 해리는 현장에 불려 나온다.
해리가 유일하게 일라이어스에게 소송당하지 않은 형사였다.
그리고 해리의 팀엔 두 명의 흑인 경찰이 있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또다시 폭동이 일까 봐 걱정하는 경찰 간부들은 이 사건을 해리에게 맡긴다.
경찰로서 동료들을 의심해야 하는 입장에 선 해리는 정치적 입장만 고수하는 윗분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진다.
게다가 해리는 지금 결혼생활도 위기단계에 와 있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화가 엘리노어의 전화일 거라 생각하고 받는 해리의 불안한 모습에서 이미 그의 불행은 예고된다.
시한폭탄 같은 사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짐한 어빙은 해리에게 감찰계 소속 형사 체스턴을 붙여준다.
체스턴은 해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자였다.
어빙은 찾고 있는 썩은 감자가 경찰국이라는 자루 안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루를 보호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보슈가 인생에서 성취한 모든 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동기로 바꿈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어빙은 모르고 있었다. 보슈는 어빙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엔젤스 플라이트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잡했다.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과 증거 심기, 증거에 의한 껴 맞추기식 수사.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답답한 그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고집스러운 해리가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그가 가끔은 자꾸만 돌아가도 되는 길을 직진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희생을 치르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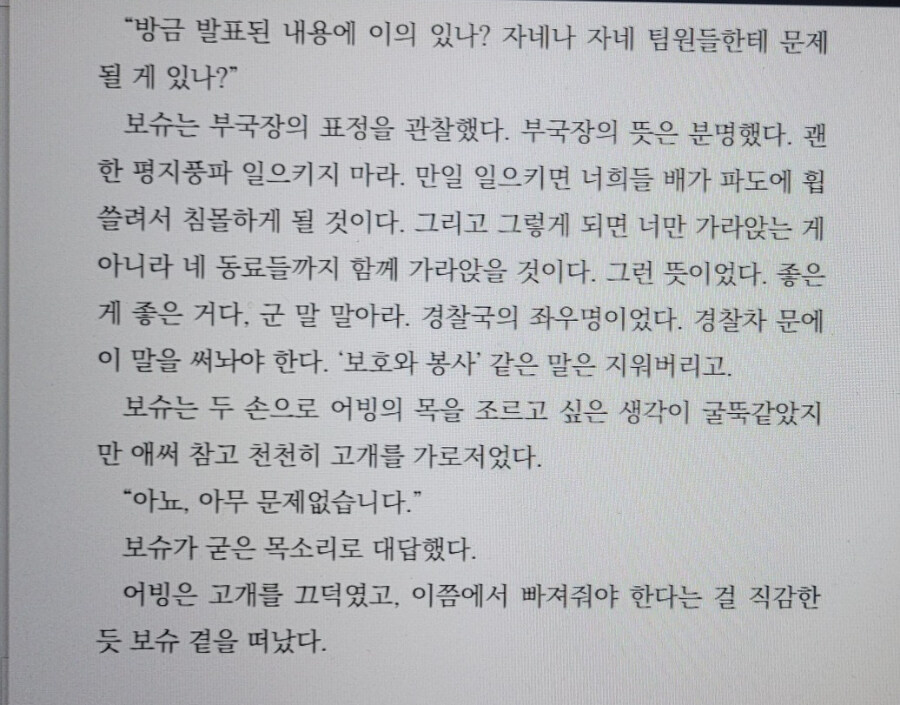
어빙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뇌부들의 행태는 볼 때마다 천불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나아가는 해리 보슈의 모습은 당당하면서도 짠하다.
보슈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엘리노어마저 떠나면 해리는 어떻게 살까?
해리가 받는 압력과 지칠 줄 모르는 수사와 함께 그의 위태로운 사랑이 엔젤스 플라이트를 읽는 내내 마음에 걸린다.
나조차도 엘리노어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말이다.
엔젤스 플라이트는 경찰 조직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얼마나 많은 실수와 범죄가 묻히고 세탁되고 포장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서 씁쓸했다.
그럼에도 해리 보슈 같은 경찰들이 있어서 경찰 조직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상은 수많은 범죄자들 보다 선량한 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