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떻게 지내요
시그리드 누네즈 지음, 정소영 옮김 / 엘리 / 2021년 8월
평점 :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썼을 때 시몬 베유는 자신의 모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그 위대한 질문이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물음표 없는 질문은 듣는 사람에겐 질문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엔 " " 가 없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든다.
그들의 대화에 " "가 채워졌다면 이 책은 좀 더 가벼운 이야기가 됐을 거 같다. 왠지...
여성들의 이야기는 흔히 슬픈 이야기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인류의 죽음을 강의한 남자는 어떤 질문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한다.
다 끝났다.
어떤 희망도 여지도 없이 다 끝났다. 고 말 하는 남자는 전 남친이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암으로 죽음을 앞둔 친구가 있다.
시니컬한 친구는 신랄한 유머를 탑재하고 있고
하나뿐인 딸과는 거의 회복 불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열심히 싸웠지만 딸도 암도 친해지지도 완전히 쫑 나지도 않는 어정쩡한 관계다.
친구는 '죽음'을 준비한다.
친구의 '죽음' 여행에 동행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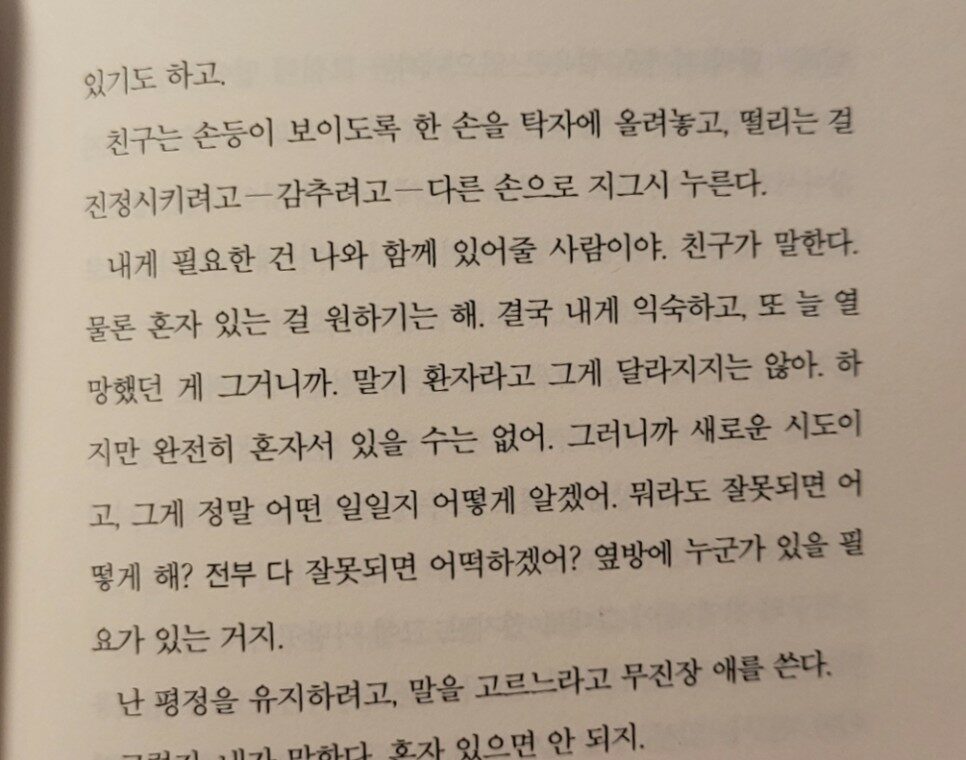
말기 환자 곁에서 지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에 얼마큼 공감할지 잘 모르겠다.
그게 가족이 아닌 친구라면.
나는 가족은 겪어 봤지만 친구는 겪어 보지 않았기에 그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선을 따라가기 위해 느린 호흡으로 읽었다.
시시각각
하루하루
시간시간
변한 게 없는 거 같은데 변해있고, 변해졌다.
잘 먹지 못하는 친구 앞에서 배가 터져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 나
이 여행을 온 걸 후회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나
친구를 이해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는 그들
서로 부담스럽지만 서로 녹아들어 가는 그들
남겨질 친구를 걱정하는 친구
혼자 떠날 친구를 걱정하는 친구
알듯 모를듯 한 마음들이 서로 엉켜 있는 글 앞에서 내 마음도 시시각각 이랬다저랬다 한다.
이것이 싸우는 내 나름의 방식이라는 걸 사람들도 이해해야 해. 내가 먼저 나를 없애버리면 암이 나를 없앨 수 없을 테니까.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본다.
나는 말기 환자의 죽음을 지키면서 그런 다짐을 해왔다.
내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고.
그래서 이 여행을 이해하고 기꺼이 친구와 동행한 그녀가 고맙다.
네 걱정은 전혀 안 했어. 친구가 말했다. 너한테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리라는 예상은 못 했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것 - 내 편에서도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슬픔과 고통을 모른다.> 내가 잘 쓰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오래전 동창 모임이 있었다. 한 친구가 왔다.
동창이라고 했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친구였다.
그녀의 친한 친구가 모임 전에 우리에게 귀띔을 했었다.
암 환자라 얼만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 모습을 보러 온다고.
어려서 그랬을까.
죽음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는 돌아가며 알은체를 했고, 그 뒤로는 술독에 빠져 끼리끼리 흩어졌다.
불현듯 꼿꼿하게 앉아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흡수하듯 바라보고 있던 친구를 보았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못 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기억은 달라졌을까?
가끔 흐릿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빛바랜 사진처럼 뇌리에 박혀있다.
나는 뭔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사는 건
죽음으로 향해가는 완행열차다.
누군가에겐 급행열차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작가지만
글을 읽는 내내 프랑스 문학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글이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야만 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피붙이가 아니어서 조금 덜 감정적이게 되지만
여전히 슬프고 아린 그런 감정.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내는 일은 죽는 거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