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지나고 나면 지독하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발상.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 모든 사건들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털끝만 한 인연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심한 발상에 투여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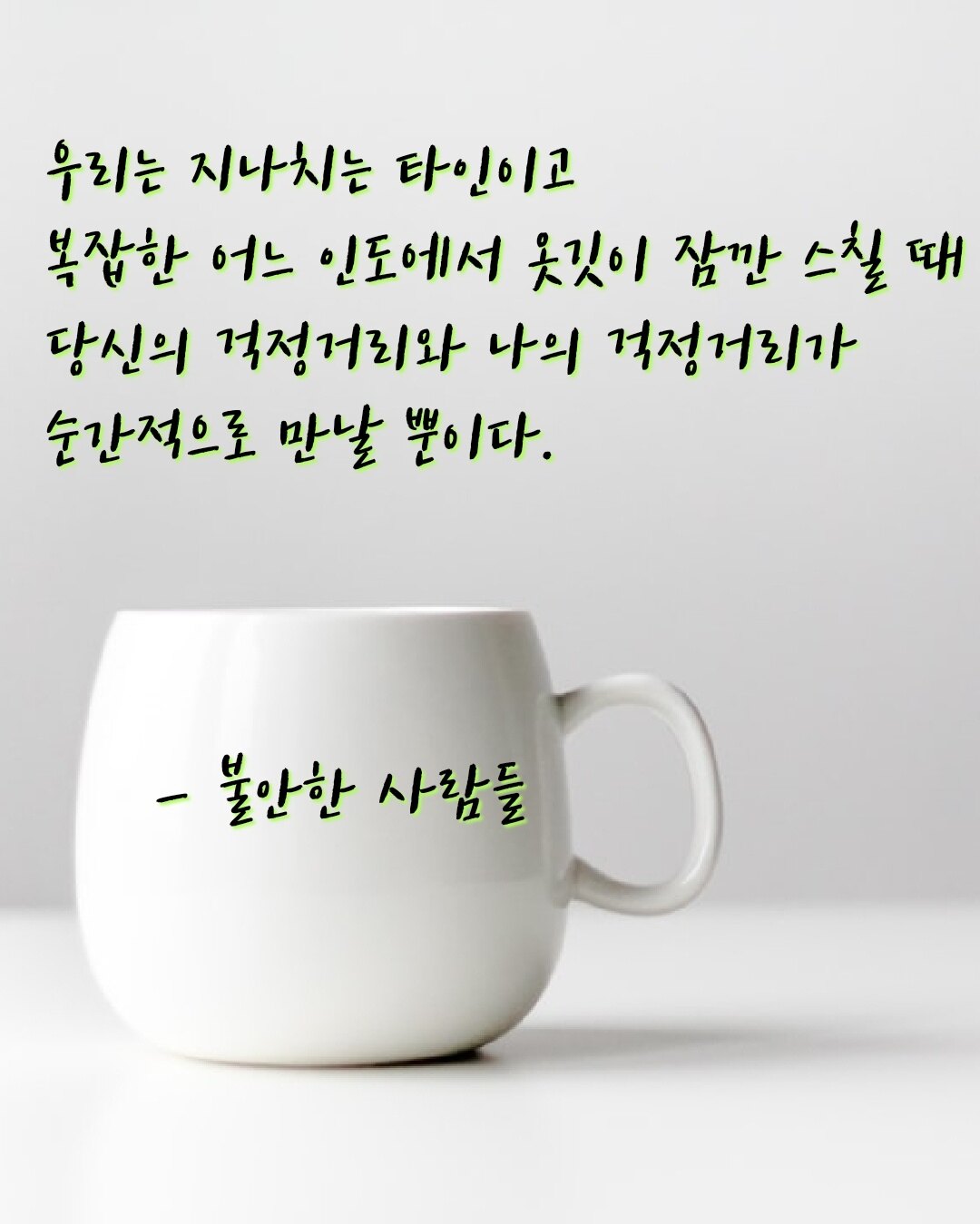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두는 착하고, 따뜻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인질극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한심하고, 짜증 나고, 고집스럽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따뜻하고, 감동스럽고, 용기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된다.
정말
보통의 선한 사람들이
한순간 잘 못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왕좌왕하고,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는 모습 그대로가 담겨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과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마저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희한한 위로를 받게 된다.
이 성가신 인질들은 은행강도를 다그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떻냐고, 은행 강도답지 않다고 지적질 한다.
생전 처음 은행 강도를 계획했지만 하필 털려던 은행은 현금이 전혀 없는 은행이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행인 걸까?
간신히 도망쳐서 얼결에 들어간 곳이 오픈하우스 아파트였고,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인질이 되었다.
이 어설픈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조마조마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였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프레드릭 배크만은 자신의 이름값을 지켰다.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티끌만 한 인연으로 서로를 보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은행강도로 시작해서 인질극으로 변질됐지만 결국 다리에 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낯선 존재들이지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보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새해 전야제에서 터뜨리는 불꽃놀이 같다.
세상 어딘가엔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짜증 나는 사람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랑을 잊은 사람에게 사랑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뒤에 가서야 이 이야기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각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다.
느긋하게 즐기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해 본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