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글들이 아니라서.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문체에 익숙해지면 알게 된다.
글 하나하나가 바로 그녀들의 외침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글엔 마침표가 없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살아있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모든 그녀들의 이야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작품이다.
남자들이 없는 세상.
여자들만의 공동체에서도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성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야말로 젠더의 문제다.
인간에겐 그런 본성이 누구에게나 스며 있을지 모른다.
더 강한 사람 중에는 약한 사람을 길들이고, 세뇌시키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미니크와 은징가의 이야기에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 족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의지를 자신 안에서 끌어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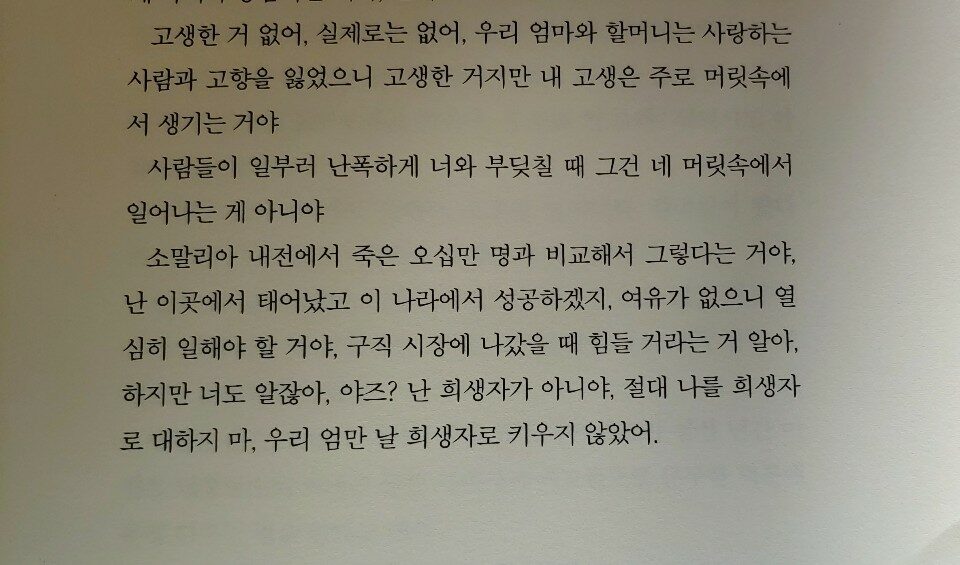
이 수많은 여자들의 서사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한다.
책을 읽는 동안 뭔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영국계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착취와 편견의 실체들이 흑인 여성들에게 좀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은
같은 여성이지만 백인 여성들에게 받는 차별적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작품은 여성의 이야기이자 젠더의 이야기다.
아니.
차별받고, 혐오 받고, 편견의 시선으로 보아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토록 다양한 이야기를 수다 떨듯이 써 내려간 버나딘의 마음속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가 주는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소수로 보이는 이들이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이유 없는 시선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내 시선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었다.
그녀들의 신랄한 표현을 읽고 있자니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져 온 관습적인 편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심어졌던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차별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편견과 차별은 무지에서 오니까.
그녀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본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문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알아가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