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버스토리
리처드 파워스 지음, 김지원 옮김 / 은행나무 / 2019년 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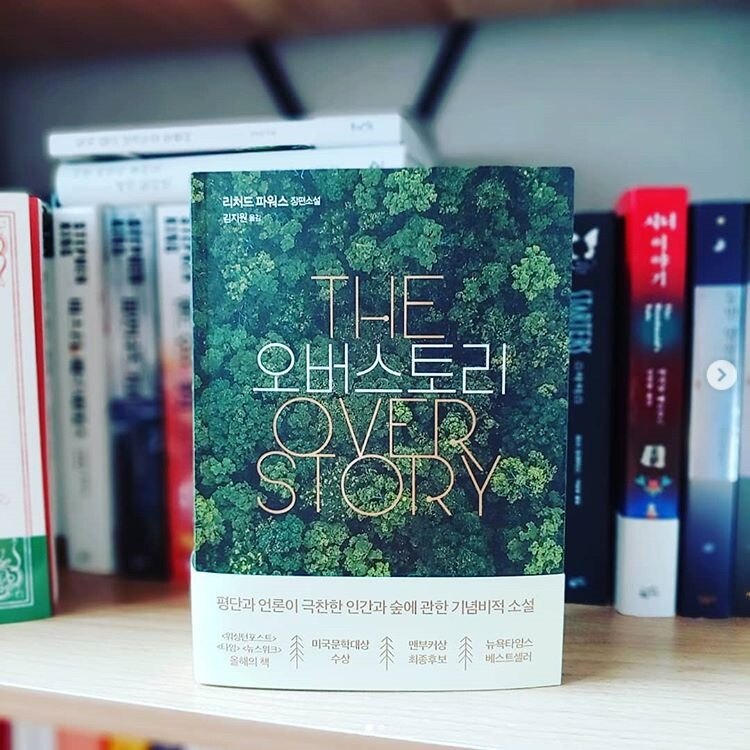
여기는 나무가 끼어 사는
우리 세계가 아니다. 나무의 세계에 인간이 막 도착한 것이다.
되도록 느리게 읽었다.
숨 가쁘게 읽어내리기엔 문장에서 느껴지는 급박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웠다.
한 달 가까이 머리맡에 두고 잠들기 전에 읽었다.
9명의 사람들이 있다.
길게는 먼 조상들부터 짧게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반부를 할애하며 펼쳐진다.
그들이 어떻게 나무와 숲으로 향하는지를.
태곳적부터 나무는 존재했다.
나무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살아났다.
인간도 나무에서 갈라져 나왔다.
어디쯤에서 갈라진 DNA.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비해 갈라진 또 다른 종은 아낌없이 모든 걸 소비하고 있다.
인류는 끔찍하게
유해하다. 이 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실험이다. 곧 세상은 건전한 지성, 집단 지성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군락과
군집으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과 전엔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눈앞에 두고 먹먹해진다.
나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턱대로 다 있는 대로 써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이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숨 쉬고, 어떻게 먹을 걸
구하고, 어떻게 푸르름을 눈에 담고 살아갈까?
친산업적 산림청이라는
곡예단의 후원을 받는 부유한 벌목 회사가 이 지역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수 세기 동안 자란 다양한 침엽수들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 서둘러서 불법으로 베고 있다. 그녀는 이런 도난을 늦추기 위해서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의로운 행위까지도.
각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던 아홉 명의 준비된 사람들이 나무와 숲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 각자 어떤 나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나무의 깊이.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급진적 환경주의자로 낙인찍고 처벌한다.
정작 처벌해야 할 대상은 놔두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신 처벌받는다.
?
벌목 회사와 환경보호자들.
각자에겐 각자의 이해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지만 나무와 숲에 대한 이해는 없다.
인간종은 스스로 우월했다. 모든 종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들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멸종시켰다.
나무도 그리되어 가고 있다.
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벌목된 지역에 심어진다.
그렇게 나무를 심는다는 이미지를 남겨두고 벌목회사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들을 단 몇 시간 만에 잘라내어
버린다.
그 나무들은 서로의 뿌리로 연결되어 이 지구의 또 다른 세계에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연락망이 되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말이다.
그걸 이해하는 한 여자의 의견은 그녀가 단지 난청에 말을 버벅거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그녀가 단지 그녀. 라는
이유로 묵살당한다.
그렇게 지난한 세월이 가고 그녀의 이야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왔다.
나무는 서로 소통한다.
기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점에 있는 생물종이 아니야. 다른 생물들, 더 크고, 더 작고, 더 느리고, 더 빠르고, 더 오래되고, 더 젊고, 더
강항 생물들이 지배하고, 공기를 만들고, 햇볕을 먹지.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무나무에서는 수 세대
동안 고무를 채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건 한 번뿐이에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지구 어딘가에선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렇다.
그리고 내 곁에도 그 잘라낸 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숨 쉬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직업전환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책을 읽다가 작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목격했을까.
아낌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나무들이 서서히가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눈앞에서 잘려나간 모습을 보는 처참한 심경으로 이 글을
썼으리라.
환경에 대해
나무에 대해
숲에 대해
다른 생물에 대해
그동안 보고, 배우고,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이 책을 통해 느끼고 있다.
나무가 잘려 나가는 장면에서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느낌이 들어 괴롭게되고. 그리고 분노하게 된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도 이야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렵고 힘든 숙제를 짊어진 느낌이다.
집안을 둘러본다.
나무의 숨결이 안 미친 곳이 없다.
공존하는 법을, 느리게 채취하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나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걸지도
몰라.
이것이 사실일지 모른다.
우리는 고작 100년을 산다. 그렇게 된 지 몇 해 안되었다.
하지만 나무는 수백, 수천, 수만 년을 산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내가 잠시 빌린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울린다.
잠시 빌린 것뿐인데 그래서인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책을 생각하는 동안
코 끝에 나무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책이야말로 나무의 잔재가 아니던가.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
그걸로 만드는 건 최소한 당신이 잘라낸 것만큼 기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