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가
- 김려령
- 출판
- 비룡소
- 발매
- 2012.02.05
가끔, 허공속에서 툭 떨어지는 손을 봅니다. 그리고 옆을 봅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 혼자만 외따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그마한 상처 하나쯤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때만큼은 저쪽 명치의 언저리쯤에 박혀있는 가시가 보입니다
언제 박혔는지 몰라서, 빼내면 더 아플까 싶어서 그냥 놔두고, 또 놔둔 그 가시는 내내, 그 어느날의 거리에서 울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참아내고 있는 게 더 서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알에서 깨어나라.
하나의 세계가 깨지고, 또다시 태어나고_ 라지만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람들은 잊고 있나 봅니다.
모든 알이, 수정난이 되고, 무사히 부화가 돼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어쩌면 잊고 있는 것인지도요.
그리고는, 수정난에서 태어난 병아리들이 무사히 모두 닭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어쩌면 잊고 있는지도요.

지금, 그렇게 낯익으면서도 낯선 곳으로 나오기가 무서운 병아리 같은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악 부화를 해서 옆에 같이 무사히 부화가 된 자신과 거울처럼 닮아있는 것이 신기해서 쉬이 손을 잡게 된 것일지도요. 내 닮은 모습, 그리고 내게는 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것, 어렵게 뱉아논 고백들을 들려주는 책, 가시고백입니다.

작년, "완득이" 가 영화화 되면서 알려진 소설가, 김려령의 2년만의 신작, "가시고백". 완득이 이후, 읽었던 "우아한 거짓말" 이 내게는 무겁게 느껴져선 어떨까 싶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다.
- 스포 싫다, 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패스해주세요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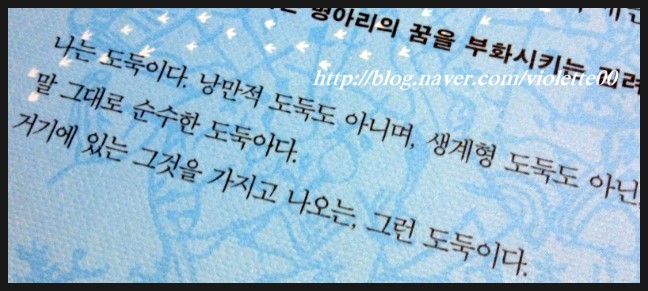
이야기는, 해일이 자신의 가시를 살짝 고백함으로 시작한다. 도둑이라고 한다. 엄마의 손재주를 닮아서일까 라고는 하지만, 실제, 해일의 그 손은.. 7살, 잃지 않기 위해서 열쇠를 꼭 쥐던 그 무렵부터 였을 지도 모르겠다.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훔쳐야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해일은 훔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담임이 말한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어먹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해일이 목구멍까지 따끔거리고, 실은 그의 말을 빌어 창자까지 컹컹 울리는 통곡과도 같은 웃음을 지어야하는 이유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손을 잡아줄.
지란은 결손가정이다. 새아빠가 내 아빠가 될 그 찰나를 훔쳐버린 건 해일이였다. 그러나, 안다. 해일 때문이라는 것은 또 변명이라는 것을. 그냥, 아빠가 미웠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밉지가 않다면, 뭘하든 상관없는 사람이 또 그 아빠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마음 속에 콕콕 가시가 박혔다. - 결국 지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결정은 어른들의 몫이니까. 힘없음이, 아빠의 손을 잡아줄 수 없음이 또 아파오는 나이, 바로 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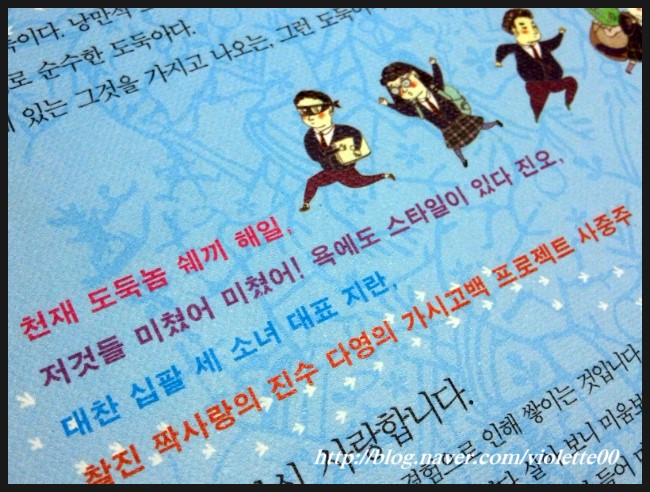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이면서도 서로가 참 많이도 거울처럼 다르면서 닮아있는 아이들. 그런 것쯤, 이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기에는 아픈 아이들이다. 누군가의 손이 참 필요했던 아이, 해일이였고 놔버린 손을 잡고 싶지만 머뭇거린 지란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조금은 엉뚱하지만, 해철의 말을 빌어 의식이 세련된 진오와 이제 해일의 손을 잡고 싶어하면서도 멋쩍어서 괜히 선생님을 들먹이는 다영이 다가온 것이다. 이름하여, 친구. 그 넷의 이야기이다.
고백은 해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상당히 가볍다. 그리고 가독성도 좋다. 그것이 아마도, 김려령 소설의 최대 장점이면서도 조금은 위태로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참 재미나게 읽었다. 뭐 이렇게 화해도 빨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냥, 저 쪽 켜켜이 쌓인 먼지를 그들은 또 그 나이이기 때문에 풀어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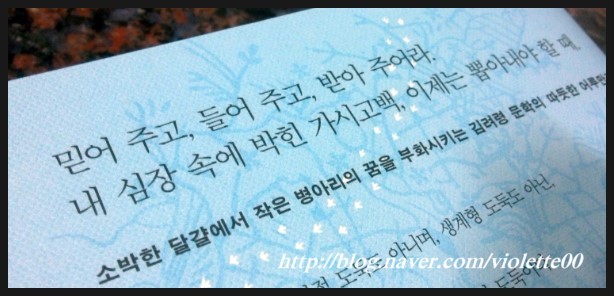
이 넷이 뭉치게 된 것은 병아리 때문이기도 하다. 김려령은, "부화" 하는 병아리로 이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7개중 2개만 수정이 된 병아리. 그렇게 7살의 해일을 또, 혼자가 아닌 둘 혹은 "친구" 라는 이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의외로 유치해 보이는 이 소설이 키득거리다가도 어느 순간쯤은 저쪽에서 따끔따끔 아파왔다. 해일처럼 창자가 울리는 그런 울음같은 웃음아니라도, 어,어..하는 사이 묘하게 설득당하고 있었다.
물론, 진오와 다영이 그저 짝사랑만 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의 가시고백은 없는가? 라고 한다면, 그 둘쯤은 아픈 둘을 위해서, 그냥 이쁜 거울이 되어 주고, 손 내밀어 주고, 손잡아주는 역이면 족했던 것 같다. 해일의 내면, 바로 그가 바라던 것은 "진오" 였을 테고, 지란이 원하는 또다른 자신은 바로, 다영과 같은 친구를 이상형으로 품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설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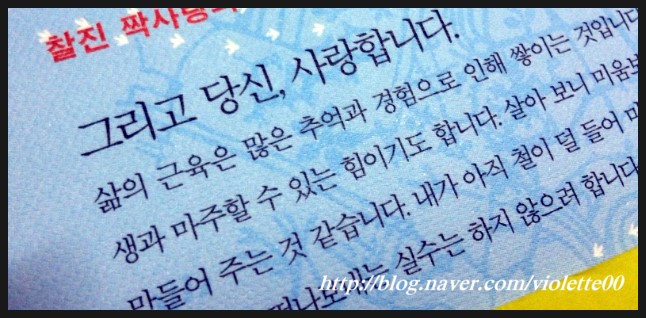
마음이, 따뜻해왔다. 처음에는 싸했던 마음이였는데, 어느샌가 웃다가, 따끔따끔해져 오는 가시를 보다가, 유치한 그들을 보면서, 온기가 전해져왔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 가끔은 툭툭 내뱉는 굳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도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미 표현돼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김려령의 소설은 가볍지만, 또한 가볍지 않게 어딘가를 긁어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물론, 정작 청소년들은 우린, 여전히 아픈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그것은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를 읽은 청춘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목에 깔깔한 가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시를 조금은 손을 넣어 뺄 용기가 생기기를. 먼저 손내밀 수 있기를. 그것은, 청소년이나, 혹은 성인이나 마찬가지는 아닐까? 더 가시가 깊게 박혀서 빼내기 어려워지기전에, 그리고 더 아프게 되기 전에, 목에 걸려 있는 그 뭔가의 가시를 한번쯤, 뱉을 수 있기를..
- 안 읽은 신 분들을 위한, 요약은_
이 소설은, 유치하고, 가볍다. 라고 분명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갈등? 너무 싱거운데. 라고 느끼실 수도요.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완득이처럼, 사각으로 몰린 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 모습에서 키득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했으며, 따뜻해지기도요. 다만, 가벼운 글쓰기가 최대장점이지만 그래서, 김려령 작가가 전하는 메세지가 퇴색되지 않기를요. 정작 청소년들은 얻지 못한 위로를, 지금의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늘 말씀드리듯, 개인의 호, 불호는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