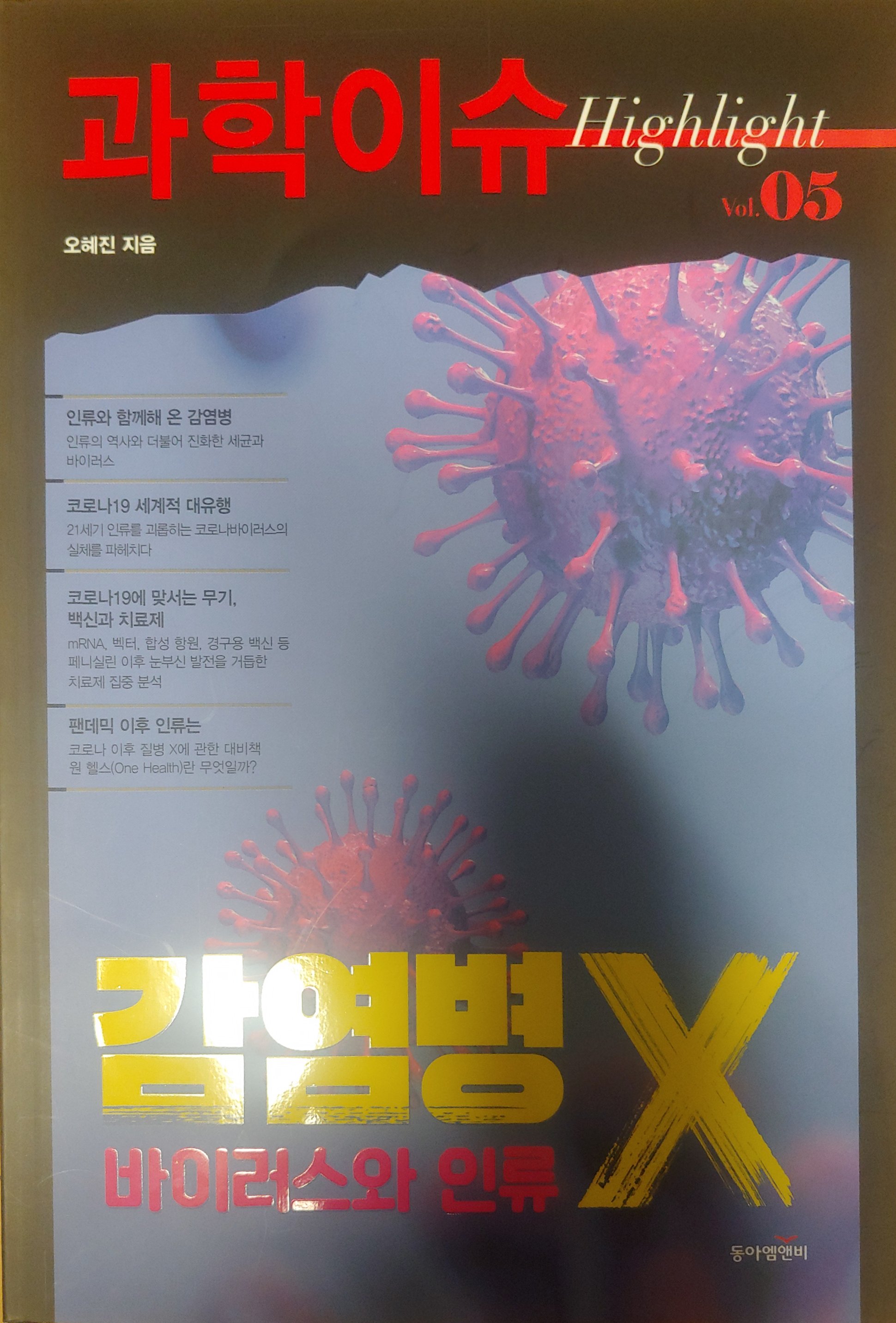
우리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미생물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거나, 체내에 들어온 미생물의 수가 너무 많아져
면역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감염병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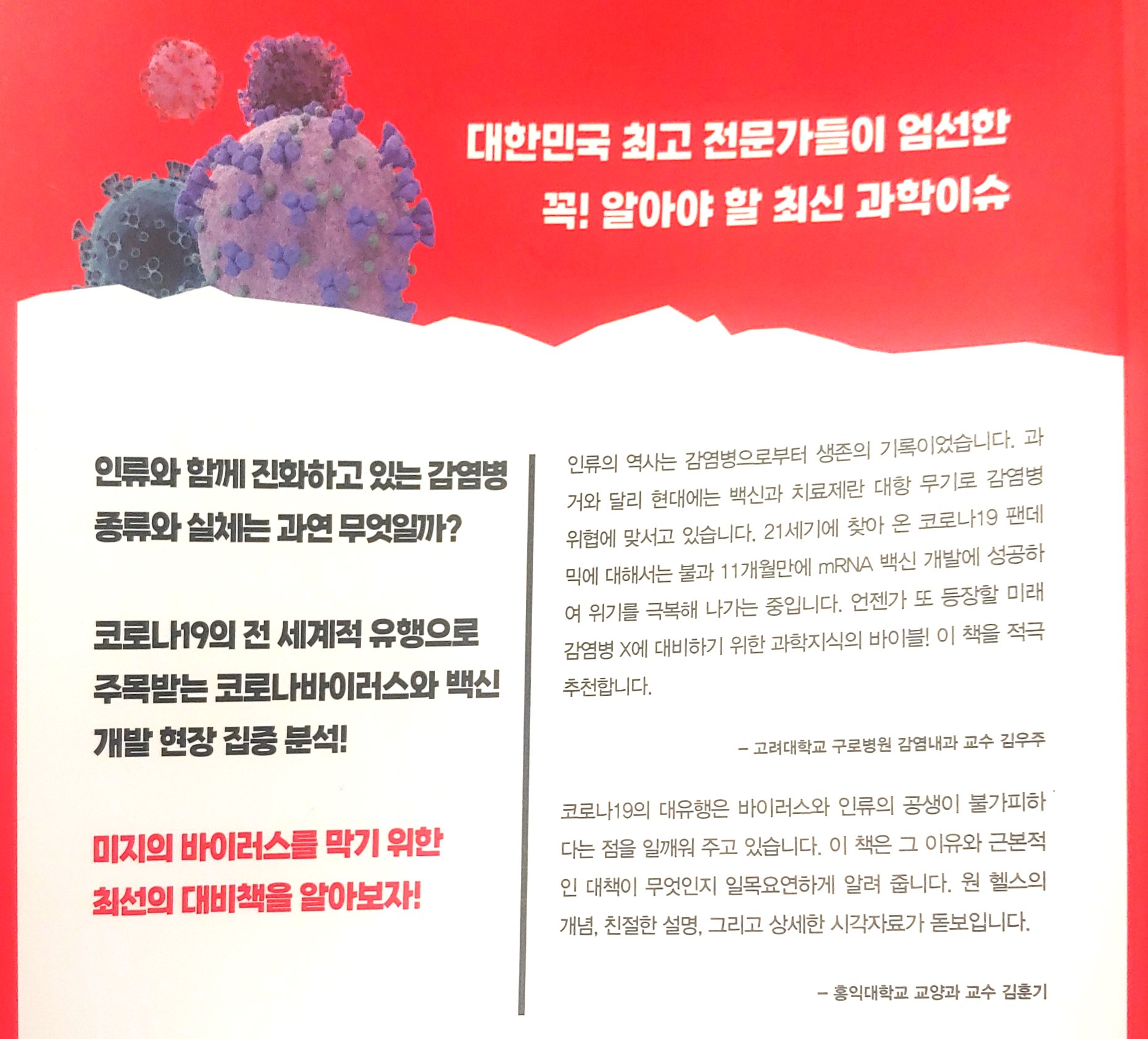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미지의 질병 X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함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해 백신과 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는 알 수 있다.
신종 질병의 75% 이상이 동물에 의해 종간 장벽을 넘어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이다.
종간 장벽을 넘어 다른 종으로 전이되는 바이러스인
'스필오버(Spillover)' 바이러스에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구 밀도와 변화, 위도, 강우량 및 야생 동물의 다양성, 토지 이용 변화등의 변수를 고려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일어나기 쉬운 핫스폿 지역을 찾았는데 방글라데시와 인도, 중국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도 밀도가 높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데
특히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산림이 많아 야생 동물이 많이 서식하는데
숲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과 인간이 만날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니 정말 걱정이 되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인간의 건강은 동물의 건강, 자연환경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이다.
공중보건, 동물의 건강 및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통합된 '하나의 건강' 방식을 통해서만
미래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 안전 및 식품 안보, 매개체 매개 질병,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대유행이 터지고 난 뒤에
수습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것임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열대 우림을 비롯한 산림을 보존하고,
동물의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야생 동물의 사냥 및 거래를 규제하는 등 인간이 동물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감염병 X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이언스> 2020년 7월 24에 발표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생태학 및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 벌채와 야생 동물 규제에 쓰이는 비용이 연간 22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드는 비용은 10~2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코로나19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과학자들의 의견은 결코 기우가 아니므로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