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독서.
오늘은 프리모 레비, <주기율표>의 니켈편을 읽었다.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기율표>에 나온 등장인물에 비하자면 바르바리쿠에 가까운 김영선씨는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3장까지 읽고 그 이후 3년동안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은 거짓일까? 분명 아닐 것이다. K씨와 같은 바르바리쿠에 가까운 사람, 자신만의 윤리를 토대로 세상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의사가 되었지만 온갖 종류의 의무와 일정과 마감을 싫어하고, 미국이 단지 시끄럽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여하간 K씨에 비할 바 아니지만 프리모 레비의 책은 나 역시도 하루에 많은 분량을 읽어내기 어렵다. 기껏해야 두 편 내지 세 편 정도가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양의 고작이다. 정말 재밌지만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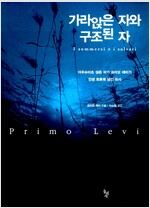
니켈편에서 프리모 레비는 대학 졸업 후 석면 광산에서 석면 채굴 후 버려진 암석덩이에서 니켈을 채굴하는 일을 했던 추억을 적고 있다. 암석에서 석면의 양은 고작 2%, 버려지는 양은 98%다. 2%를 위해서 98%는 그저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일까? 프리모 레비의 역할은 2%의 석면을 위한 일이 아니다. 버려진 98%의 돌에서 다시 쓸모 있는 것들을 골라내야 하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시 많은 돈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니켈은 98%의 버려진 돌에서 아주 아주 작은 양에 불과했다. 버려진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은 많지 않았지만 버려진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을 찾으려는 노력 중에 프리모 레비는 '승리였다'고 느꼈고, '나를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선언했던 자들에게 결코 저열하지 않게 복수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버려진 것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쉽게 버려질 만한 일이,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납과 수은 이야기가 버려지지 않고 이 책에 실리게 된 것 역시 누군가는 이토록 이질적인, 어쩌면 쓸모 없어보이는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며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코 순수하지 않은 화학 물질의 은유로서 이 책 역시 하나의 화학물로 존재하는 것이리라.

니켈편은 인간을 폐기하는 세상에서 겨우 벗어난 한 인간이 암석을 폐기하는 세상에서 폐기된 돌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98%의 암석을 버리기도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그것이 못내 아까워 여러 번 돌아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이기도 하다. 나의 친구, 바르바리쿠 K 씨와 다시 쓸모 없어 보이지만 같이 읽으면 꽤나 재밌는 책들을, 버려진 돌에서 니켈을 찾듯이 함께 찾아 읽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내가 당시 썼던 광물 이야기 두 편도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도 내 자신의 운명과 거의 흡사하게 파란 많은 운명을 겪었다. 폭격과 탈출을 겪어낸 것이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최근 수십 년동안 잊고 있었던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찾았다. 나는 그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주기율표, 12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