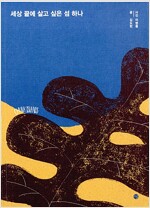

책이 읽고싶어지는 이유는 참 여러가지다. 나의 경우에는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표지가 예쁠 경우,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가지의 경우가 더 있다. 아끼는 출판사의 책이거나, 추천사가 마음에 드는 경우, 책 속의 삽화나 사진이 눈에 띄었을 때 등등. <세상 끝에 살고 싶은 섬 하나>는 위에 이야기한 이유 중 상당수를 차지했다.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장 눈에 띈 건, 책의 뒷커버에 적힌 김훈 선생님의 추천사였다.
"나는 3년 전에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추크섬을 여행하다가 거기서 김도헌을 만났다. 그는 오래전에 이 먼 섬으로 건너와 원주민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의 삶은 풍매하는 홑씨 한 개가 바람에 실려와 인연 없는 땅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 홑씨는 살아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감당하고 있었다."
미크로네시아가 어디더라. 추크섬은 또 어디지. 지도를 검색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책장을 넘겼는데 친절하게도 예쁜 지도가 담겨있었다. 괌의 동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그곳에 이 책을 쓴 작가가 살고 있다. 잠깐의 여행이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그곳에 몸을 맡기고 살고 있었다.

요즘 나오는 책에 비해서 글자가 많은 편이다. 빼곡히 줄을 맞추고 있는 글자들이 지겨울만도 한데, 책장은 술술 넘어간다. 작가가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분하게 써내려 간 까닭이다. 그의 이야기와 주변인의 이야기가 적절하게 섞여 소설책을 읽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책의 중간중간에는 이병률 작가의 사진이 담겨있다. 책장이 잘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다.
"땅 위에 사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깊디깊은 심연의 공간을 나는 바라본다. 원근감 없이 흔들리는 짙푸른 공간이 창공 같기도 하고 물속 같기도 하다. 몽환적이고 경외로운 풍경 앞에서 물살에 몸을 맡기고 기포만 뿜어 올린다. 앞서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유영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이다. 찾고 있던 해면을 발견했는지 그들은 테이블 산호와 브레인 산호가 섞여 자라는 군락 옆에 바짝 엎드려 사진을 찍은 다음 작업용 칼로 회색빛 해면을 잘라내 그물 망태기에 담는다. 나는 뒤편 흰모랫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앉아 그들이 하는 일을 구경한다. 멀리서 다가오던 잭피시떼가 방향을 틀어 우리는 비껴간다."
p113.

"행복이라는 것이 불행하지 않아 행복한 것이라면,
나는 불행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겠지."
p150
언젠가 아버지에게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두어살 어렸던 아버지는 '이민'이라는 용감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나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내가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할 때마다, 타향살이의 서러움과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도 들어서 외웠을만큼 절절한 사연때문인지 요즘은 아예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잠깐의 여행에도 이렇게 외로운데, 낯선 곳에 오랜시간 머무른다는 건 꽤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김도헌 작가는 그렇게 낯선 곳, 내가 막연하게 외로울 것이라고 추측했던 타지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 이제 그는 오히려 한국이 낯설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늘, 바다와 친해졌다. 열대어와 산호초는 그의 친구가 되어줬고, 때때로 섬 전체가 그에게 어깨를 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코럴을 만났다. 그러니 그에게 그곳은 전부이며, 삶이다.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고도 다를 수밖에 없는 낯선 땅에서 김도헌 작가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추크섬의 원주민과 같은 모습으로, 아마 내일은 뼈 마디마디 파고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그는 여전히 경계에 서 있지만, 그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