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보들의 결탁>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바보들의 결탁>을 읽고 리뷰를 남겨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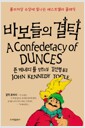
-
바보들의 결탁 - 퓰리처상 수상작
존 케네디 툴 지음, 김선형 옮김 / 도마뱀출판사 / 2010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바보들의 결탁』은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소설들 중에서, ‘퓰리처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을 비롯해, ‘미국 문학계의 코믹 걸작이다.’, ‘가장 웃기는 책들 중 하나… 당신을 배꼽 빠지고 눈물 나게 만들 것이다.’ 등의 찬사로 인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지금, ‘퓰리처상 수상작’이라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의 말들이, 그 말들 그대로 나에게 느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인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겨지는 작품이 되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배꼽이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 눈물이 나긴했으나 그것역시 웃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쓸데없이 수많은 격찬을 인식해서인지,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웃기면 떼굴떼굴 구를 준비까지 하면서 책을 펼쳤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부터 전해지는 작가의 안타까운 현실에 -나의 기대는 어떨지 몰라도- 웃음기는 사라져만 갔다. 작가, ‘존 케네디 툴’이 문학을 공부하다가 군에 징집되어 복무하게 되면서 쓰게 되었다는 『바보들의 결탁』.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그의 작품을 받아주지 않았고, 어머니와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끝내 서른둘이라는 젊은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처음 만나는 이 작품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사후에 이 작품이 책으로 출간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으며, 결국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도 전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초록색 사냥모자가 살덩어리 풍선 같은 머리통 윗부분을 쥐어짜듯 꾹덥고 있었다. 모자에 달린 초록색 귀마개는 커다란 귀와 텁수룩한 머리카락과 귓속에 자라난 빳빳한 솜털을 덮느라 양방향을 동시에 가리키는 방향지시등처럼……’이라는 글로 시작되는 『바보들의 결탁』. 그 시작은 한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한 ‘이그네이셔스 J. 라일리’이다. 그는 초록색 사냥모자를 쓰고, 검은 콧수염을 기른 채, 풍성한 트위드 바지에 체크무늬 플란넬 셔츠와 목도리의 누가 봐도 난감한 옷차림에 덩치 크고 뚱뚱하기 까지 한 남자이다. 하지만 그런 외모보다도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만의 벨탄샤웅(세계관)이다. 답답함과 짜증을 불러오는 그의 행동과 말투는 보통의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독자들의 무한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 놓는다. (물론 반대로 그의 행동과 말투 덕분에 그를 더 많이 사랑하는 독자들도 많겠지만…) 평소에 하는 짓이 얄미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제는 정을 좀 줘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다른 어떤 행동으로 인해 이내 그 마음마저도 돌아서게끔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이그네이셔스’가 딱 그런 캐릭터다.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실에서는 고학력의 만년 백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영향을 받아, 현실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보들의 결탁』이다.
대충이라도 이미 작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작가 ‘존 케네디 툴’과 ‘이그네이셔스 J. 라일리’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 음…)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인물. ‘존 케네디 툴’은 ‘이그네이셔스 J. 라일리’의 눈으로 그가 부딪혀가는 세상을 그 스스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60년대 초 뉴올리언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그네이셔스를 통해서 바보라고 불리는 많은 바보가, 어딘가 에서는 바보가 아닌, 그래서 바보가 아닌 자들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바보 같은 세상을 말이다. 현실이 아닌 이상에 사로잡힌… 하지만 그것이 이상이라는 생각조차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비추는 것이다. ‘존 케네디 툴’은 자신이지만 자신이 아니어야만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다고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작가 스스로와는 다르게 다소 뻔뻔한 모습의 ‘이그네이셔스 J. 라일리’를 탄생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은 새해가 시작할 때쯤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라고 한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지라 절대 공감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끔 하는 하나의 순간을 더 추가해야할 것 같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원래 작가가 의도한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 받고 싶어질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그렇다. 당연하게도(?!) 그 한 권이 책이 『바보들의 결탁』이다. (아, 그렇다고 이 책의 변역이 형편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겠다. 옮긴이도 언어의 차이로 분명히 아쉽다고 언급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이것은, 작가가 표현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받지 못했기에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는 핑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혹은 어떤 미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냥 책을 읽고 좋다거나 나쁘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나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운… 내가 찾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것마저도 ‘퓰리처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나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바꿔 말하면, (짧은 지식으로 인한 나의 문제이겠지만…) 난 아직 이 책의 제대로 된 가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다, 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이 나면 다시 이 책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찾지 못한 많은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 책의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봐야 겠다. 하지만 그 보다도 먼저, 이 책의 시작에 있어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마지막에서 정반대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웃음이란 것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웃음이란 것이 그 반대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니… 그러고 보면 세상에 무조건 이라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바보가 무조건적으로 바보가 아닌 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