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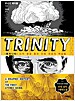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러 가겠다며 바깥양반이 책 꺼내 놓으라기에 전기 세 권, 핵무기 개발 네 권, 고등연구소 세 권 (사실은 한 종), 파인만 세 권 (역시나 한 종), 기타 등등을 줄줄이 꺼내 놓았더니만, 이번 영화의 원작이라는 두꺼운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아인슈타인과의 공동 전기에서 오펜하이머 장만 쏙 빼서 읽고, <트리니티>라는 만화책 한 권만 추가로 읽고 가서 영화를 본 모양이다. 물론 아무 것도 읽지 않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쯤 되면 나로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책으로 읽을 게 이렇게 많은데 뭐 하러 영화를 봐?"
영상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 영화는 극적 표현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아무래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전기나 논픽션 같은 쪽이 더 객관적이고, 설령 상충되는 시각이 있더라도 서로 대조해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비해 영상 매체는 강력하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깊은 인상을 새겨주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한 번 본 광경은 잊어버리고 새로 상상하기가 어렵다. 짐작컨대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먼저 보면 소설 속 장면을 달리 상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여하간 영화 덕분에 오펜하이머며 핵무기 관련서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 본 것은 반가운 일이었고, 이번 기회에 뒤적뒤적 하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또는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나저나 지금은 절판된 (아울러 알라딘에는 번역을 성토하는 글이 여럿 올라온) 제러미 번스타인의 오펜하이머 전기 표지를 보니 필립 할스먼의 저 유명한 "점프" 사진이 나와 있어서 새삼스레 그 화보집도 오랜만에 꺼내서 그 사진을 촬영하던 당시에 있었던 사진가와 과학자의 대화 부분을 읽어보기도 했다.(할스먼의 <점프!>도 이미 절판되었다. 요즘은 책의 수명이 정말 짧구나!)
필립 할스먼은 살바도르 달리와의 공동 작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진가인데, 언젠가 판에 박힌 초상 사진만 찍는 것에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모델에게 점프 포즈를 제안했고, 의외로 반응이 좋자 주요 레퍼토리로 삼았다. 할스먼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오펜하이머는 천장을 바라보며 팔을 뻗고 펄쩍 뛰어오른 다음 그에게 질문했다. "제가 점프하는 모습에서 무얼 읽으셨나요?" 할스만이 잠시 고민하다가 뭔가 새로운 방향이나 목표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오펜하이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뇨, 그냥 닿으려고 한 것 뿐이에요."(44쪽) [*]
<점프!>에서 다른 모델들은 대부분 팔을 내린 상태에서 뛰어오르고, 설령 팔을 치켜든 경우에도 오펜하이머만큼 길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양복 저고리에 단추를 채운 상태이다 보니, 위로 치솟는 동작에서 어깨 부분이 부풀면서 볼품없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시선을 하늘로 두고 풀어 헤친 양복 저고리를 휘날리며 뛰어오르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은 정말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경쾌하다. 사진가에게 던졌던 질문과 그 답변까지 덧붙여 보면, 어쩌면 앞으로도 한동안 오펜하이머에 대한 내 인상은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진으로 남을 것 같다.
[*] 참고로 이 일화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 역시 정보의 양에서는 두세 시간짜리 영화보다 책이 더 압도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제러미 번스타인은 역시나 물리학자로 일하면서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당대의 유명 물리학자를 직접 만나 보고 전기까지 썼는데, 놀랍게도 93세로 아직 살아 계시다! 예전에 전파과학사에서 나온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썼다고 기억하는데, 오펜하이머 전기에도 당사자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일화가 실려 있기도 하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일화는 번스타인이 오펜하이머를 처음 만나 인사를 했을 때의 일이다. 의외로 처음에는 오펜하이머가 냉랭하다 못해 무서운 얼굴을 짓더니만, 곧바로 자기가 조만간 고등연구소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표정이 누그러지며 한없이 자애롭게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프로메테우스"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천변만화하는 "프로테우스"의 기질까지 지닌 것은 아닌가 싶은 저 물리학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로 기억해 볼 만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