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람을 얻는 지혜 (국내 최초 스페인어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46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김유경 옮김 / 현대지성 / 2022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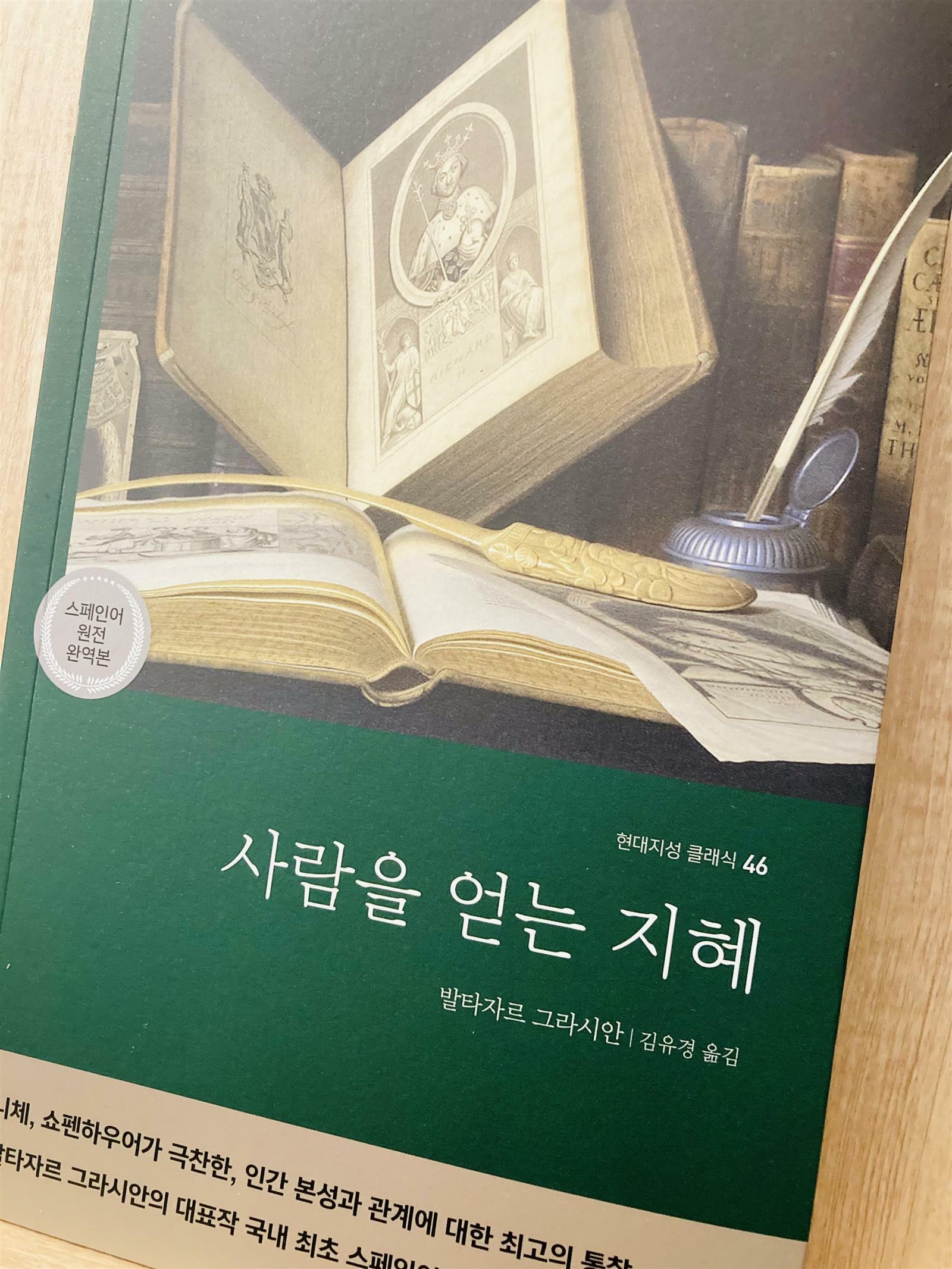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서 책을 미리 보기로 먼저 훑어보았는데 각 페이지마다 중앙에 크게 숫자가 쓰여있고 매 페이지에 실린 글들이 길지 않아 읽기 쉬운 격언집처럼 보였다. 그래서 잊고 있던 책 한 권이 생각났다.
할머니 댁에 아빠와 작은 아빠, 고모들이 젊어서 읽었던 책들이 고대로 남아있는 오래된 책장이 하나 있다.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쓴 통기타 가수가 표지를 장식한 기타 악보집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촌스럽다고 느꼈는데 세상에 이 안경도 다시 유행이 돌아올 줄이야!) 상고 교과서, 살림대백과사전, 표지가 누런 장판 색과 다르지 않았던 족보 등 책장이 누렇다 못해 바스러지는 책들 사이에서 내 눈을 끌던 책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탈무드’였다. 아마 그냥 탈무드는 아니고 부제가 있었을 텐데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하튼 인터넷이란 게 없던 시절에(심지어 시골집은 지금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놀 거리도 마땅찮았던 나는 읽을거리가 생기면 일단 온돌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책장을 펼치기 바빴는데 그 책도 특별히 뭘 알고 펼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심심함을 때우기 위한 요량으로 우연히 선택되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누가 읽다가 본가에 남겨준 책인지가 궁금한데.. 여하튼 그 책에서 봤던 구성과 유사했다는 한 줄을 쓰기 위해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다. 어린 나는 긴 글을 읽기엔 상상력도 집중력도 높지 않았기에 짧은 우화집 같은 책을 읽길 좋아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단 인상이 들었고 실제로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쉬이 읽힌다고 해서 내용도 가벼우리라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겠다. 목차만 봐도 유익하고 각 페이지의 내용을 음미하면 더더욱 오래 남는다. 300개라는 숫자도 적절해서 매일 필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오래된 문장의 힘을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모두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구닥다리 취급을 하기 일쑤였다. 고전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따분한 인상을 주기에 그런 책들은 모조리 마음 속 골방에 처박아두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책을 읽고는 고전에 대한 그간의 편협한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시대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후대까지 살아남아 전해지는 고전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시점에 이 책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옛날 옛적에나 맞는 소리였겠지 하며 넘길 수도 있었을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책은 총 8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의 주제를 나열하자면 미덕, 현실, 안목, 관계, 내면, 평정심, 온전함, 성숙이다. 인상적인 부분에 사진처럼 플래그를 붙여봤는데 세어보니 4장 관계에 많이 쏠려 있었다. 현재 가장 고민되는 부분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인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해서 읽을수록 다른 부분들도 새로이 다가올 날이 있을 것 같다.
이 책이 쓰인 시기의 역사적 배경도 상상해 봤다. 과연 어떤 문화에서 나온 통찰이었을까?
책의 뒷면에 ‘치열한 궁중 암투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게 해준’이라는 문구를 읽고는 미디어로 재현된 17세기 귀족 세계의 한 장면을 떠올려봤다. 온갖 고상한 기품을 뽐내는 인사들과 부풀려진 평판만큼 지저분한 가십들로 흘러넘치는 궁중 암투극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저자를 상상하며 독서를 시작하기 전 상상의 무대를 그려봤지만 굳이 나처럼 어렵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책의 뒷부분에 옮긴이의 해제가 친절하게 실려있어 저자와 시대 배경, 그리고 이 책에 영향을 준 사조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해가 한층 풍부해졌다. 언어유희가 많아 스페인어로 읽기에 가장 어려운 텍스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매끄러운 번역으로 읽는 나는 그런 어려움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한국어로도 나름 말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엿보였다.
읽는 페이지마다 자꾸 실수한 과거의 사건들이 연상되어 조금 괴로웠다. ‘아, 그 때의 어리석은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떠올랐다. 그런 한편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조카들에게도 방을 잘 오픈하는 편이 아니어서 내 방은 소위 던전으로 불린다. 접근이 금지된(?) 구역이니만큼 조카들에게 늘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아마도 책을 읽을 줄 알 무렵이 되면 시골집에서의 나처럼 책장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때 조카들이 우연히 집어 들어 만나게 되길, 내가 멋모르고 탈무드를 읽은 것처럼 심심풀이로 부담 없이 만나게 되길, 그래서 더 빨리 이 내용들을 접하길 바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