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잡동사니
에쿠니 가오리 지음, 신유희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3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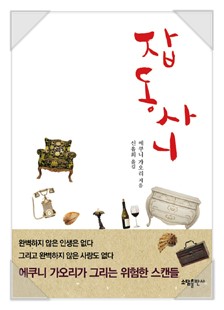
지은이 에쿠니 가오리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믿으며 아니, 바라며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상황과 관계, 현실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
작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리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마흔다섯의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슈코.
그녀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 하라,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언제나 활기 찬 엄마 기리코가 있고, 번역가라는 전문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엄마와의 푸켓 여행에서 미미라는 열다섯 소녀를 만난다. 어딘지 모르게 흥미를 자아내는, 눈을 뗄 수 없는 그 아이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낀다.
"바보 같으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는 샴페인을 물처럼 꿀꺽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다.
"질투잖아, 그거."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질투? 하지만 아직 어린애인걸, 말도 안돼."
"바로 그거야. 아이와 어른의 중간, 네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생명력이 저 아이에게는 있으니까." (p37)
미미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상태로 엄마와 살고 있다. 엄마는 남자친구와 잘 될때면 모든일에 활기를 띠고 생활을 하고, 잘 되지 않으면 집안일 이며 요리며, 모든 뒷전이다. 미미는 오히려 엄마가 활기 찰때가 더 좋다. 아빠, 네기시와는 새해여행을 같이 한다. 네기시는 어디서나 여자친구를 찾는다. 이번 푸켓 여행에서는 슈코와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하라는 아내 슈코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슈코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만나는 여자는 항상 주위에 넘친다. 그런 하라를 슈코는 이해할수 없고 마음 아파 했지만 결국 그를 인정하고, 자신도 그런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토쿄에 돌아와서도 서로 왕래를 하는 미미와 슈코.
언제나 혼자이며 외로울 수 밖에 없는 미미는 슈코를 통해 하라를 알게 되고, 학생으로도 성인으로도가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하라에게 점점 끌리게 된다. 전화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내 생각이긴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모두 눈앞에 있는 인간을 그저 눈앞에 있는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아닌, 그렇다고 슈코씨 같은 성인여자도 아닌, 네기시 미우미로만 나를 본다. 따라서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p269)
결국 미미는 하라와 깊은 만남을 갖는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소설이었다.
세상에는 여러종류의 부부가 있다. 별일 아닌 상황에도 흔들리는 관계, 언제나 확고한 믿음의 관계.
슈코와 하라는 너무나도 그 믿음이 확고하기에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도 원하기에 다른사람과의 만남에 관대하다. 즉 그 만남이 사랑이 전제된 만남이라기 보다는, 그렇다고 육체적 호기심만에 의한 만남도 아닌,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만남이다. 좋으니까 만나면 즐거우니까 시간을 같이 나누는...
그러나 정말로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세상사람들은 모두 똑같지 않고 다양하니까 뭐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미가 하라와 깊은 만남을 갖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미의 외로움과 어디에도 기댈대 없는 고독함이 자신을 자신 그대로 보아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원인이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다.^^
내가 너무 고리타분 한걸까?
다만, 대단한 사건없이 일상적인 하루하루와 관념적인 생각만으로 소설을 구성하고, 그속에 빨려 들게 하는 능력은 작가의 탁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한 묘사와 서술, 그 가운데 주인공의 심리 변화가 묻어나고 있다. 바람의 작은 흔들림, 사물이 놓인 위치, 손끝 발끝이 가리키는 미묘한 변화 등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과 주인공의 생각을 구성해 나가는 문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인지 정말 빠른 시간안에 읽어내려갈수 있었다. 그래서 에쿠니 가오리의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그녀의 문장력과 흡입력 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이해할수 없다.
에쿠니 가오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소설속 등장인물이 아무리 격한 사랑에 빠져도,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좋든 싫든 그 관계는 변하게 돼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죠. 그 심리를, 이번에는 비교적 직설적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나마 이 인터뷰를 읽고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책 제목인 "잡동사니"는 어디서 나왔을까?
"추억의 물건들이네요."
엄마가 한마디 거들자 사야카씨는 손에 든 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잔을 천천히 흔들어 백포도주를 회전시킨다. 그리고 말했다.
"잡동사니들뿐이에요." (p294)
남편과 사별한 사야카는 지금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지니고 반지를 끼고 있다.
추억의 물건이라고 말하는 미미의 엄마에게 잡동사니라고 말하는 사야카...
잡동사니의 의미가 무엇일까?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모여 사랑을 지탱해주는 끈이 되는 것일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랑의 추억도 결국엔 잡동사니라는 것일까?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나는 알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