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 - 돌봄부터 자립까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법
윤서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2월
평점 :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을 다룬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하미나, 동아시아),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신지수, 휴머니스트)이나, 여성학의 시선에서 바라본 장애(특히 신체장애)와 질병을 이야기한 『거부당한 몸』(수전 웬델, 그린비) 등 정말 다양한 책이 장애와 정신질환을 다룬다. 그리고 돌봄 노동을 다룬 책 『사랑의 노동』(매들린 번팅, 반비)에서는 돌봄의 비가시성과 긴축으로 빈곤해지는 돌봄 시스템 등을 사회학의 언어로 말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경험과 학문, 시선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다각도에서 장애당사자의 삶과 현재 제도의 문제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를 왜 읽어야 할까.
우선 이 책은 단편적인 경험이 아닌 돌봄 제공자의 시선에서 18년간 보호자이자 동반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다. 소아조현병 환자로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며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비관적이거나 절망하는 말투가 아닌 '버티는 사람의 감정'이 여실히 느껴진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 모든 아이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또한 이 책은 연구사례가 아닌 저자와 '나무 씨'의 삶이기에 의미 있다. '공공의 공간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현실에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한 사람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안 보인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구성원의 삶을 알고 이해하며 연대해야 한다.
그렇기에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자취를 해보는 아주 사소한 일상을 보내는 나무 씨의 이야기는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끔 사랑과 희생으로 돌봄을 제공한 저자의 생각 역시 중요하다. 틈틈이 삽입되어 있는 저자만의 인사이트와 의학 정보는 다년간의 노력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귀한 정보들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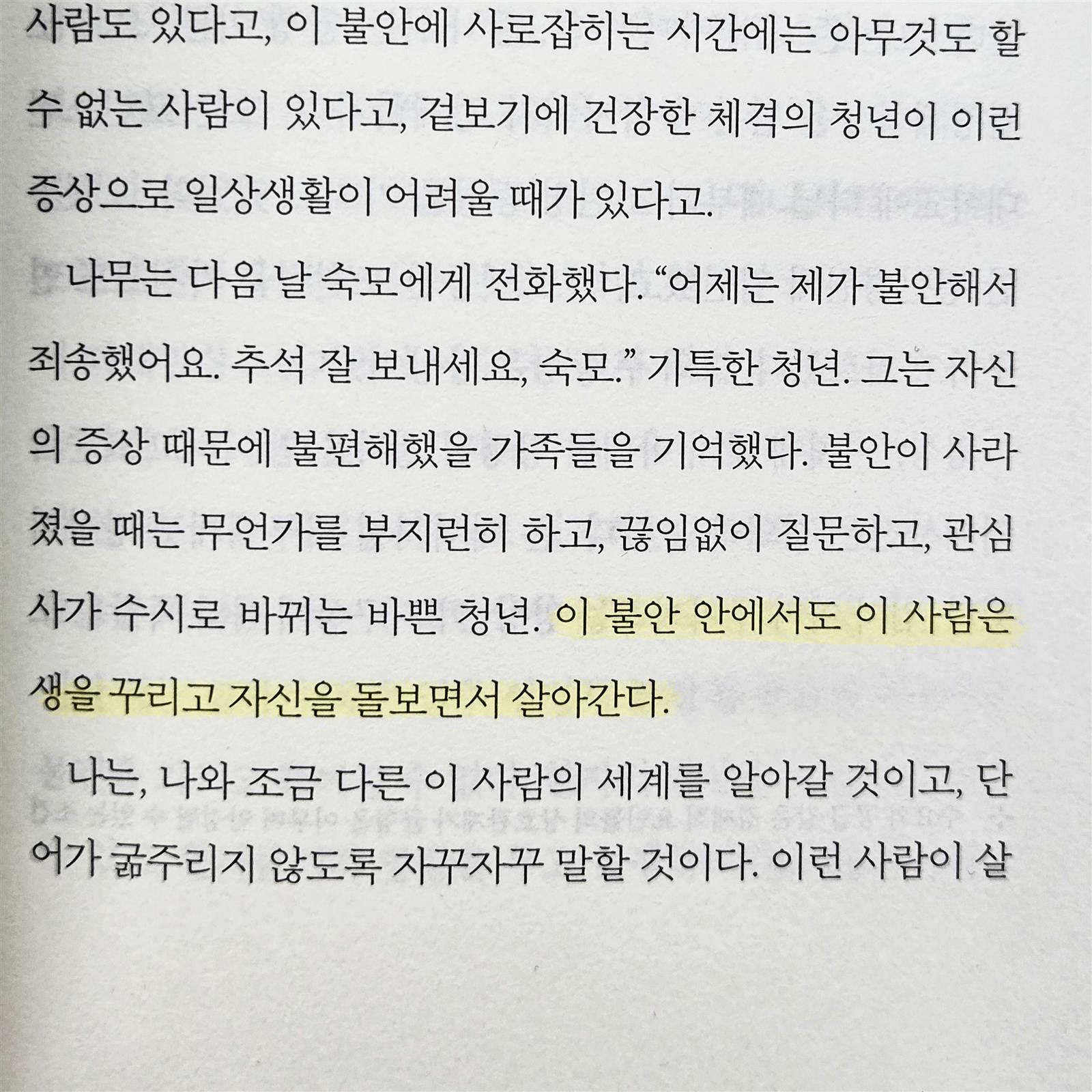
책을 읽은 후, 언급된 '씨리얼' 영상을 찾아보았다. (영상 보기) 글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심지가 보이는 듯했다. 영상의 여러 댓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글로 읽을 때 그 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온다. 술술 넘어가는 페이지에 어느새 이만큼 읽었나 놀라기도 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담담하지만 솔직하게 풀어낸 글 자체의 맛이 좋아 에세이로서의 완성도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돌봄과 함께 자라오고 돌봄과 함께 늙어가는, 타인의 도움을 떼어놓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그게 누구든 말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그 한 발자국을 내딛을 계기가 이 책이 되길 희망한다.
✨하니포터 10기로서 한겨레출판에서 책을 제공받아 솔직한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