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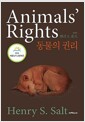
-
Animals’ Rights 동물의 권리
헨리 스티븐스 솔트 지음, 임경민 옮김 / 지에이소프트 / 2017년 8월
평점 :

절판

우선은 이 책이 1894년에 출간되었고 동물 보호론의 고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완고한 문체는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훨씬 전에 동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확고한 논리에 바탕을 둔 책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인류는 그보다 겨우 약 100여년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가 존재했으며 신대륙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몰살하지 않았던가. 얼마 전 읽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노아의 방주에서 노예선의 노잡이들로 노동하는 가축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인간에 의해 가축이 된 동물들이 종의 입장에서는 개체 수의 드라마틱한 증가를 가져왔으니 어찌 보면 진화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분과 감정을 지닌 개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반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랄지 '천부 인권론' 같은 건 아마도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을 짓밟기 위한 합리화 같은 거였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동물에게도 그와 유사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게 가축이든 야생 동물이든 마찬가지이다. 내용은 크게 네가지의 소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식용을 위한 도축과 스포츠로 간주되는 취미로 즐기는 도살행위, 그리고 인간의 사치를 위한 제조업과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실험실에서 자행되는 각종 잔학행위들로 이야기를 엮어낸다. 양심의 가책과 자기합리화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읽었던 부분은 당연히 '식용' 파트인데, 여전히 육식을 버리지 못한 나로서는 매우 난감한 주제이기도 했다. 인간의 몸은 채식을 하도록 되어있다라는 말을 여러번 듣기는 했으나 나는 아니다라며 발뺌한 적도 여러번일 것이다. 저자 역시 먹거리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책이 쓰인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육식은 존재하며 그와 관련된 논쟁 역시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채식주의자가 될 날이 오기나 할지 모르겠으나 과거 식인종들이 문명과 접촉하면서 식인의 습관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인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저자의 믿음은 근거있는 확신일까 순진한 소망일까.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에 있다. 본문이 다 끝났음에도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저자가 참고한 문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있으며 톨스토이가 쓴 하워트 윌리엄스의 <식이의 윤리>라는 책의 러시아 번역본 서문 중에서 '첫걸음'이라는 제목이 달린 부분을 옮긴이의 발췌로 볼 수 있다. 채식주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물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가 도축장에서 직접 본 도축의 끔찍한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으니 노약자와 임산부는 조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