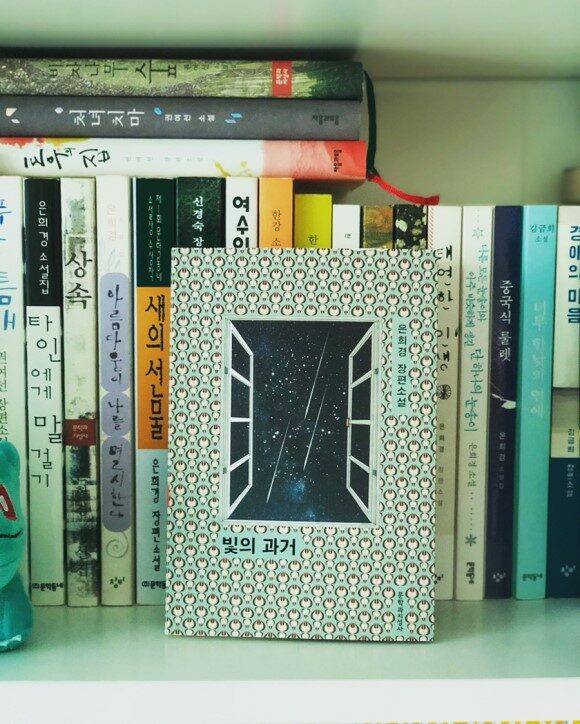
우리는 각자 독서의 역사, 문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만의 사적인 '소설의 역사'를 서술하자면 연대기의 시작에 자리한 이름이 은희경이다. 중2의 나는 국어선생님이 재미있는 소설이니 읽어보라며 추천해 주신 [새의 선물]에 푹 빠지고 말았다. 그 소설은 어린 나를 매료시켰던 해리 포터 시리즈와 결이 달랐다. 시작부터 '삶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삶에 성실하다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아이러니도 아니다.'(11쪽) 같은 문장이 튀어나왔다. 사춘기를 통과 중인 내게 은희경의 냉소는 삶이라는 미궁을 인도하는 아리아드네의 실과 같았다.
삶도 마찬가지다. 냉소적인 사람은 삶에 성실하다. 삶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삶에 불평을 품으며 불성실하다.
은희경 [새의 선물]
그녀의 냉소를 한 손에 쥐고 이후 출간되는 작품들을 성실하게 따라 읽었다. 감탄하고, 의아해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은희경이란 이름이 하나의 장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태연한 인생] 이후 새 장편소설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라딘 인터넷서점 '새로나올 책'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새로고침했다. 1970년대 여대 기숙사가 배경이라고 했다. 1960년대의 진희가 자라 여대에 가게 된다면? 소설 속 '나'인 김유경의 목소리를 빌려, 2017년의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약점을 숨기려는 것이 회피의 방편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태도가 되어 내 삶을 끌고 갔다. 내 삶은 냉소의 무력함과 자기 위안의 메커니즘 속에서 굴러갔다.은희경 [빛의 과거] 181쪽
이제 냉소는 삶의 성실성이 아닌 무력함의 표현이라고, 자신의 삶은 상처받기 싫어 끊임없이 회피하고 수긍하며 이를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조금씩 '인생의 포물선이 하강하는 것을'(325쪽) 지켜봐야 했음을 덤덤하게 고백한다.
그 고백의 계기가 된 건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가장 오래된 친구, 77년 같은 기숙사에서 만났고 우연이 겹쳐 관계가 이어지게 된 김희진과 김희진이 쓴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라는 소설 때문이었다.
여러 사람과 공유한 시간이므로 누구도 과거의 자신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편집하거나 유기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은희경 [빛의 과거] 18쪽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 나는 김희진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설 속 소설인 [지금은 없는 공주를 위하여]에 쓰인, 김유경을 포함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한 양애란, 곽주아, 최성옥, 이재숙 등의 인물들을 '공주'라 부르며 희화화하는 소설 전략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나'(김희진)를 통찰력 가진 성숙한 주인공으로 형상화하는 의도가 빤하지 않나.
소설을 한 번 더 반복해 읽으면서 이 [빛의 과거] 소설 자체가 '나'(김유경)의 또 다른 편집된 과거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별적인 다름이 필연적으로 섞이는(28쪽)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공유된 과거를 아예 폐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지우고 싶은 과거라도 인간은 오롯이 혼자서만 살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은 필연적으로 뒤섞인다. 김유경은 말더듬이라는 약점을 핑계로 삶과 대면하는 순간마다 도망치기 바빴고, 김희진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과거를 편집했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계속해서 다음 권이 출간되는 문제집 시리즈를 풀어가듯 주어진 생을 감당하며 살아왔을 뿐이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또 다른 생의 긴 알리바이를 보았던 것이다.'(13쪽)

서로가 서로의 문제집 답지이자, 상대방의 알리바이인 관같은 창문이라도 유리의 두께나 창문의 방향, 각도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듯이 같은 과거의 시간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적힌다.
김희진과 김유경이 되살려 내는 1977년도의 여자 기숙사생들, 여학생이란 '조강지처, 애인, 첩, 식모' 네 가지로만 평가되던(26쪽) 시대 어떤 카테고리로도 설명되지 않고 설명될 수 없었던 개별적인 여자들. 최성옥과 송선미, 양애란, 이재숙, 오현수, 곽주아, 이경혜의 이름들.
훈육과 세뇌가 기본인 가학적인 카드 섹션 연습으로 형상화된 개성의 말살이 당연시되던 군부 독재의 시대 각자의 방식으로 '다름'을 추구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내게 약간의 슬픔을 남겼다. 소설 막바지 김유경이 덤덤하게 토로하는 독백의 여운 때어차피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유성우의 밤은 같은 풍경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듯 과거의 진실이 현재를 움직일 수도 있다. 과거의 내가 나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현재의 나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유성우의 밤은 같은 풍경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듯 과거의 진실이 현재를 움직일 수도 있다. 과거의 내가 나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현재의 나도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진실이 현재를 움직인다. 불변하는 과거나 유동적인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소설은 회고록에 가깝고 2017년의 현재 역시 반쯤 굳은 콘크리트처럼 극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시간대라 이 독백이 슬프게 다가오면서도 이야기로 생생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유독 힘겹게 완성하셨다는 이번 소설의 다음이 있다면 이 문장을 예고편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편집되거나 유기된 과거가 현재를 덮치는 이야기, 또 한 번 기다림이 시작된다.
은희경 [빛의 과거]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