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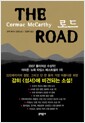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책을 펼치고, 한동안 지옥을 말하는가 했다. 이곳은 어디인가.
불이 휩쓸고 가기라도 한 듯, 재로 뒤덮인 세상.
천연색이라곤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잿빛 세계가 묘사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끝없이 남쪽을 향해 걷기만 한다.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과연 희망일까. 더 큰 고문은 아닐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희망이 적더라도 분명 존재할 때 이야기.
혼자라면 다른 선택을 할지도.
그러나, 희망이 없는 때란 언제인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인간의 오만일지도. 고로, 함께가 낫겠구나.
"제가 죽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응.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알았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정처없이 발길을 옮긴다.
사방엔 시체가 널려 있고, 시체들은 신발이 없다. 이미 사람들이 훔쳐 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곤 약탈자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절망을 묘사하는 매카시의 표현들은 아찔하다.
"보이지 않는 달의 어둠. 이제 밤은 약간 덜 검을 뿐이다. 낮이면 추방당한 태양은 등불을 들고 슬퍼하는 어머니처럼 지구 주위를 돈다."
"세상의 역사에는 죄보다 벌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는 거기에서 약간의 위로를 받았다."
살아남은 그들은, 스스로를 불을 운반하는 사람들로 명명한다. 절망 속의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건 '의미'가 아닐지.
기아에 허덕이는 바싹 말라버린 이 부자(父子)의 끝없는 이동은, 상상만으로도 기괴하고 절망적이다.
내 신경마저 날카로워지는데, 남자는.. 소년에게 번번이 사과한다.
그가 한 잘못과 그가 하지도 않은 잘못, 소년이 한 잘못에 대해서도.
이 소설을 다른 무엇보다 세대 교체, 혹은 세대 간의 소통으로 보게 하는 지점이다.
세상에 오직 서로뿐인 그들, 그러나 어쩌면 가장 먼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싸한 충격을 준다.
"어쩌면 남자는 그 자신이 소년에게는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한 것인지도 몰랐다. 이제는 사라진 행성 출신의 존재. 그 행성에 관한 이야기는 수상쩍었다."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정해지는 남자 앞에서, 소년은 번번이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을 버리지 못한다.
"네가 모든 일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마."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더러운 얼굴. 그렇다고요. 제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었다.
어찌 지옥에 연민이 있겠는가.
남자는 죽고, 아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에 합류한다.
"여자는 소년을 보자 두 팔로 끌어안았다. 아, 정말 반갑구나."
착한 사람들, 동지들을 찾는 것이 이토록 쉬운 것이었다면, 경계만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었다면, 남자의 노력은 무용했던 것일까.
아니,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들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삶은 계속된다.
소년은, 또 소년을 구할 것이다. 알 수 없는 충고들을 전하며.
어느 절망적인 상황도, 그곳이 끝내 지옥일 수 없게 만드는 희망, 사랑, 연민을 보았고,
무엇보다 내게는 세대의 책임과 사명으로 읽혔다. 물론, 어느 특정한 세대가 아닌, 영원히 돌고 도는 우리 모두.
인류 보편적인 가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엄숙함.
코맥 매카시에게 더욱 빠져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