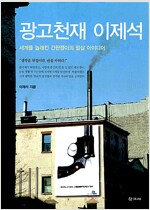서로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은 3권의 책을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세 권의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재미있다. 먼저 김찬호의 저서인 <사회를 보는 논리>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 나아갈 바를 독자와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쉬운 설명과 간결한 논지를 통해 이끌어 내는 이 책의 문제의식이 그 자체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건 당연한 노릇이다. <광고천재 이제석>에서 저자 이제석이 말하는 핵심도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는 책 속에서 "판을 바꾸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낸 그 실례를 천재적인 자신의 광고를 곁들여 털어 놓는다. 마지막으로 황규영의 무협소설 <개천>은 제목부터 '開天(하늘을 열다)'이다. 이 '개천'은 저자가 '후기'에서 말하듯 '파천(破天)'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주인공 강대수의 여정은ㅡ약간 과장되게 말해서ㅡ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투쟁에 다름없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렇듯 비슷한 핵심을 가진 듯한, 그러나 당연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펼쳐내는 이 세 권의 책의 차이가, 저마다 각기 속한 장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이건 한편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가장 온순하고 부드러운 세기를 가진 것은 물론 인문학 서적에 해당하는 <사회를 보는 논리>이다(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 사회의 제반현상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비판하지만, 대안의 모색은 모두의 과제로 남겨둔다. 예컨대 결혼식 문화에 대해 저자는 '체면유지'와 '차이에 대한 집착'과 '악순환' 등의 표현으로 거침없이 날을 세우지만, 그렇다고 "그딴 결혼식 따위는 당장 치워버려라."라고 일갈하지는 못한다. 또한, 일찍이 '애정남'에서 정한 것처럼 "결혼식 축의금은 성수기에 3만원이다."라는 식으로 무엇 하나 정해주지도 못한다. 다만, 책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결혼식에 대해 토론할 거리를 남겨줄 뿐이다. 그래서 당연히 약간 미적지근한 느낌이지만, 진짜 '애정남'처럼 정해주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좀 웃기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다. 어쨌거나 인문학이란 게 코미디는 아닐 테니까.
<광고천재 이제석>은 무엇보다도 책 표지에 한눈에 반해서 관심을 가졌고 결국 읽게 되었다. 초반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었다. 가히 천재적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책에 소개된 저자의 광고들은 감탄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치열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이 종종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천재란 기실 노력의 산물이라는, 그 평범한 클리셰를 되풀이하는 듯하던 이 책은 결정적으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진취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얻은 저자가 그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자는 '이제석 광고 연구소'를 차려 공익 광고를 제작해 시민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둘러싼 불리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판을 바꾸어" 성공을 이뤄냈던 저자가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판을 바꾸려"는 의미 있는 일보를 내딛은 셈이고, 에세이라는 장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펼쳐낸 이렇듯 치열한 '진실성'은 자못 감동적인 데가 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무엇이 아닌, 결국 자신과 자신의 주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진부한 교훈이 한 개인의 실제 삶과 만날 때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게 마련이니까.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떨치기 어렵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시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는 어떤 한계를 깨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장르다. <개천>은 다분히 저자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설정 하에서(조선시대를 모델로 한 가상의 세계)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무능한 위정자와 부정부패한 관료와 탐욕스러운 거대상인 등이 판치는 세상에서 주인공 강대수는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뒤집는 것(파천)' 외엔 없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하여 펼쳐지는 주인공의 활극 속에는 묘하게 현실 비판적인 메시지가 곳곳에서 느껴져서 나름의 재미와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다만 굳이 덧붙이자면, 그러한 현실 비판적 메시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무협소설 자체의 재미를 따진다면 솔직히 좀 약한 것 같기는 하다. '현실 비판적 메시지'란 게 진짜 이 작품 속에 있는지 어떤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독자보다도 오히려 저자 쪽에서 그것을 좀 더 어필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