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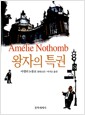
-
왕자의 특권
아멜리 노통브 지음, 허지은 옮김 / 문학세계사 / 2009년 9월
평점 :




올라프가 왜 갑자기 밥티스트의 집에서 죽었는지, 올라프의 직업은 뭔지, 올라프가 밥티스트에게 왜 차가 고장났다 거짓말을 했는지, 올라프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조르주 세르베는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 믿고 결말까지 달려갔는데 결말 역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밥티스트의 의심과 추정만을 남긴 채 의뭉스럽게 끝이 났다. 그 부분이 아쉽고 찝찝할 따름이지 읽는 내내 흡입력 있는 소설이었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왕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은 밥티스트가 올라프의 신원을 빼앗고 스스로의 무료한 신원에서 탈출하면서 올라프의 아내 지그리드와 함께 제2의 스웨덴 인생을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밥티스트는 이런 저런 미술작품들을 사들이며 올라프라는 이름으로 미술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 올라프의 그 많은 돈을 조절하며 쓰지 못 해 은행에 초기 예치금만큼의 빚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은행은 그들이 대단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면책 특권, 일종의 왕자의 특권을 주며 눈 감아준다. 그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알리며 소설은 덜컥하고 마무리 지어졌다. 하지만 왠지 모를 파멸의 기운이 느껴지는 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닐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느꼈다. '지그리드는 백색의 풍경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게 그 백색은 내가 막 끝낸 책의 첫 페이지였다.' 이 문장은 앞서 지그리드가 북극을 탐사하러 열기구에 탄 연구원 중 한 여자가 죽기 직전까지 카메라로 영상을 담았고, 그 영상들은 마치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백색 이미지들이었다며 말했던 미술관 관람 후기와 겹쳐 보인다. 즉, 그들이 거짓으로 쓰고 입은 올라프와 지그리드라는 신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 왕자의 특권도 얼마 가지는 못 한다는 거겠지.
"그런데 하루 종일 뭘 하죠?"
"우리가 하던 일을 하면 되죠."
"우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걸요."
"아무것도 안 하긴요. 술을 마셨잖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술잔을 채웠다.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자는 말씀이세요?"
"훌륭한 샴페인을 마시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몇 주나 그렇게 지낼 예정이세요?"
"영원히."
"우린 어떻게 될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