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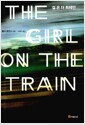
-
걸 온 더 트레인
폴라 호킨스 지음, 이영아 옮김 / 북폴리오 / 201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책 두께에 흠칫 놀랐다. 요근래에 보기 드물게 두꺼운 책이고 나 또한 이런 두께의 소설책을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쪼개서 두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을 나 또한 더 선호하는 편이다. 대하소설도 아닌데 무조건 권 수를 늘리는 요즘 세태에 비하면
이 책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스릴을 가미한 소설이고 후텁지근한 요즘 날씨를 이기기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나 할까. 부산 친정집을 내려왔으니 망정이지 아이들 방학으로
책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루 만에 후딱 읽어내는 호사를 누렸다. 이런 것이 소설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스토리가 끊어질까 어느 한 부분에서 그만
읽기가 쉽지 않다. 조금만조금만 하다가 후딱 읽어 버렸다.
이혼한 레이첼은 이혼의 상처를 달래며 술로 지새우게 되고 전 남편을 잊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인물들과 얽히며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소제목을 인물들 이름으로 대체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그 시간에 벌어지는 본인의 감정이나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중심인물은 이혼녀
레이첼, 그녀의 전남편과 결혼한 애나, 옆 집에 사는 메건부부. 처음 문제의 발단이 되는 인물은 레이첼이지만 그녀가 믿는 것이 모두 진실일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정상일까?
우리는 사회속에서 혹은 가족끼리도 알면서고 속고, 모르고 속는 일들이 허다하다. 알면서도 속는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상대를 제압할
구실을 만들 여지가 있다. 허나 작정하고 속이거나 모르고 당하는 속임은 속수무책이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어느순간 내 잘못이 되어 있고 내
의지로 이끌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보이스 피싱이나 자동차 보험 사기, 도박 등 인간의 지나친 괴욕과 재물욕에서 생기는 낭패도
있지만 남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고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문득 이런 의문이 생긴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 구속과 자유를 적절히 이용하고 의무와 책임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듯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유를 구속하는 숨어있는 검은 손은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와 어느순간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 의해 구속당하고 압박당하게 된다.
레이첼은 술에 의지가 꺾이면서 삶은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내가 보는 것이 나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현실. 어느 누가 믿어줄 수 있을까.
잊지 못한 전남편 주변을 배회하던 레이첼은 그 주변 인물들과 얽히고 설키게 된다. 각 개인이 들려주는 자신의 상황은 제 3자의 시선을
조금은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사건의 범인이 예측 가능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 옮겨가는 시점이
되면 책에 더 깊이 빠져 책을 덮기엔 너무 늦어 버린 시점이 된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레이첼의 일거수 일투족은 독자로 하여금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정점을 찍고 나면 결말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인물들이 흘려놓은 사건을 종합해 가며 하나의 정점으로 몰아간다.
이 소설도 같은 구조이고 범인이 윤곽이 서서히 들어난다.
호기심으로 잠깐만 볼 요량이었지만 손을 놓지 못하는 관계로 밤 12시가 넘어 끝장을 보고야 말았다. 추리의 대가인 애거사 크리스티나
셜록 시리즈처럼 아귀가 딱딱 맞는 시원한 스토리는 아니었으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이웃에게 일어남직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는 세상. 우리는 참으로 빠른 세상에 속전속결로 살고 있다. 이 책을 덮으며 느끼는 감정은 올바로 바른
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역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투명하고 바른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송글송글 땀맺히며 읽은 책이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