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ㅣ 을유사상고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홍성광 옮김 / 을유문화사 / 2019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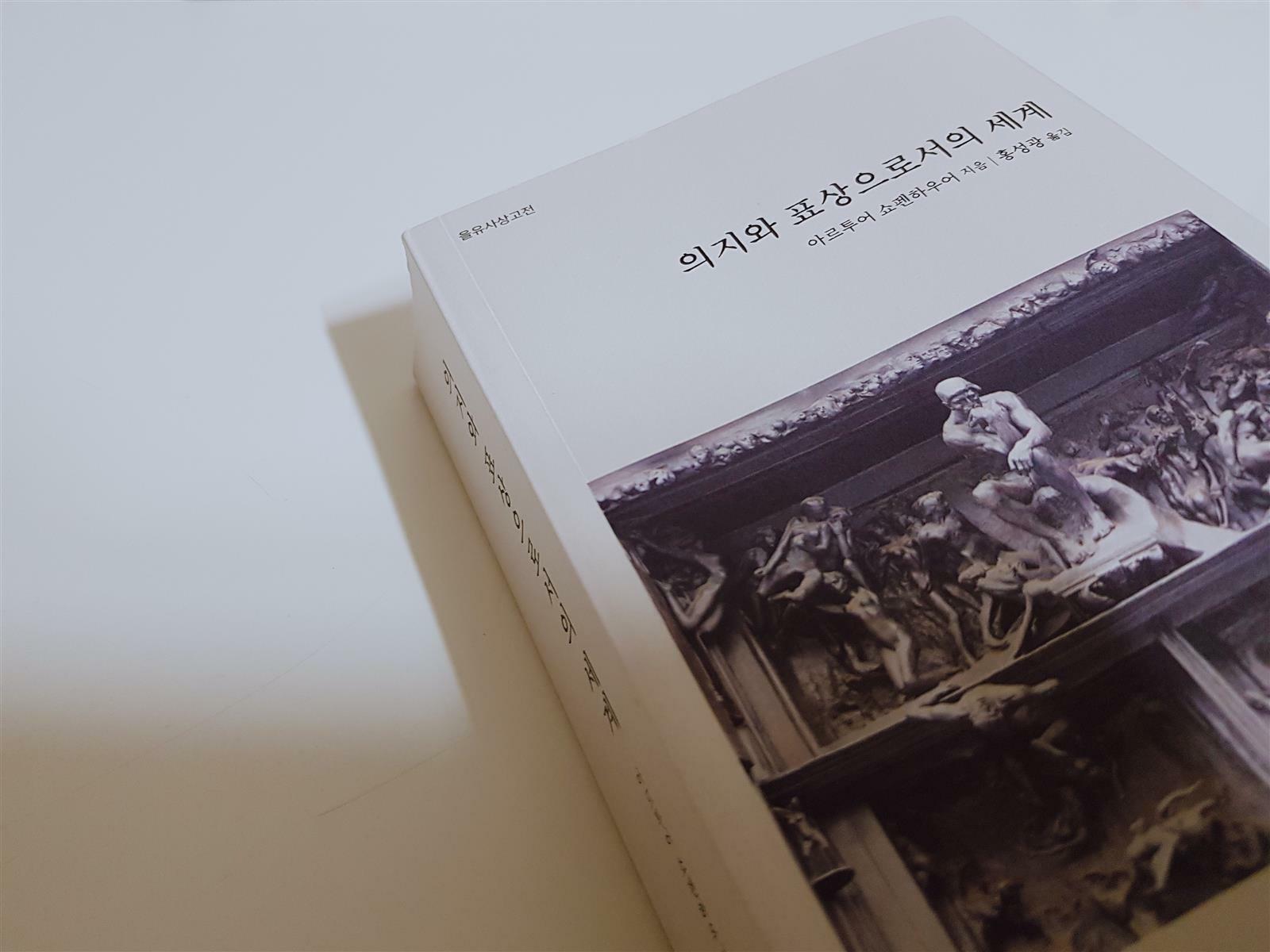
나는 철학 지식이 전무하다. 읽어본 건, 철학을 바탕으로 쓰인 인문서 몇 권과 니체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가볍게 넘기고 말았지 깊이 있게 통달하진 못했다.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도전이다. 서문을 겨우
읽어내려가 첫 주에 읽은 쪽수는 고작 79페이지. 읽다가 의지, 표상, 감각, 지각 등의 단어가 낯설어져 사전까지 찾아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건, 쇼펜하우어가 계속 '나'라는 주체의 힘에 대해 야기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항상 현존하는 것은 오직 주관에
대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말에서 어렴풋이 짐작해볼 뿐이지만.
과거와 미래는 - 그 내용의 연속은 차치하고서라도 - 마치 꿈처럼 공허한
것이지만, 현재는 이 둘 사이의 넓이도 없고 존속하지도 않는 경계일 뿐이다. 바로 그런 사실에서 우리는 근거율의 다른 모든 형태에서도 이와
똑같은 공허함을 다시 인식할 것이다. (p. 45)
인식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전체 세계는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객관에 지나지 않으며, 직관하는 자의 직관, 한마디로 말해 표상인 것이다. 물론 이 말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아주 먼 것과
가까운 것에도 적용 된다. (p. 40)
다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계속
의심한다. 지식을 의심하고 이성을 의심하고 직관을 의심한다. 현대에서 객관적이라 여기는 덕망 또는 소양을 '과연 그게 객관인가, 그게 좋은
건가'하고 묻는다. 읽고 있으면 감정에 기반한 활동들이 결코 나쁘지 않고 확인받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그러한 객관을 표상과 도저히 구별할 수 없으며, 모든 객관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의 주관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 때문에 변함없이 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객관과 표상 둘 다 똑같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 154)
호기롭게 시작했던 '한 달 읽기 프로젝트'는 철학은 절대 만만하게 봐서도, 실제
만만하지도 않다고 말해준 듯 싶다. 일반적인 고전과 다른 깊고 어려운 사유의 과정을 눈으로 좇았지만 완독에는 실패했다. 쇼펜하우어가 서문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이 생존 자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불과하며, 결국
그 투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힘겨운 투쟁을 견디는 것은 삶에 대해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 죽음은 배후에 버티고 있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때라도 다가올 수 있다. 삶 자체는 암초와 소용돌이로 가득 찬
바다이며, 인간은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를 피하려 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재주를 부려 뚫고 나가는데 성공한다 해도, 사실 그럼으로써 한
발짝씩 전면적이고 피할 수 없으며 재기 불가능한 최악의 난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간다. 아니 바로 난파를 향해,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죽음이야말로 힘겨운 항해의 최종 목표이며, 인간에게는 그가 피해 온 어떤 암초보다도 나쁜 것이다. (p.
427)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허무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 그런 면이 그의 철학을 돋보이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다. 위 문장처럼 죽음에 이르는 게 삶의 최종 목표이듯 그가 강조하는 의지와 표상 역시 붙잡고 있다가
놓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해에 가닿지 못해 할 수 없다. 다만, 내가 그의 사상을 이해하여
그에게서 위로를 얻은 수많은 학자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졌다. 언젠가 꼭 완독을 할 수 있기를!